저는 올해 서른일곱 살입니다. 햇살 같이 밝고, 귀여운 두 아들을 키우며 결혼해서 지금까지 꾸준히 직장여성으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해 8월, 회사에 사직서를 내고 전업주부가 됐습니다. 제게 위암이 발견돼서 지금 항암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 발견된 건 2006년 1월이었습니다. 직장 동료들과 점심을 먹다가, 갑자기 헛구역질이 나서 병원을 갔습니다. 의사선생님께서는 병명도 안 가르쳐주고, 무조건 서울 큰 병원에 가보라고 하셨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가방하나 덩그러니 들고, 남편과 둘이서 서울로 갔습니다. 제가 위암 2기라고 했습니다. 소화가 안 된 적도 없었고, 몸이 아팠던 적도 없었습니다. 아무런 자각증세가 없었는데. 그런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2006년 1월, 저는 싸늘한 수술대에 누워 위 전체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식도부터 장까지 제 소화기관은 일자가 돼 버렸습니다. 하지만 위가 없으면 다른 기관들이 소화 담당을 하기 때문에 일반식을 해도 전혀 지장은 없었습니다. 다만, 많이 먹으면 구토가 생기기 때문에 언제나 적은 양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 몸무게는 지금 31Kg 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그것 말고는 전혀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평소처럼 회사 다니고,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해 5월, 다시 암세포가 발견돼서 항암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지난 11월까지 총 다섯 번의 항암치료를 받았습니다. 예전 항암치료 때와 달리 이번엔 숭덩숭덩 머리카락이 빠졌습니다.
저는 괜찮은데 아직 어린 일곱 살, 다섯 살, 두 아들이 보면 충격을 받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이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몸이 아파서 수술도 받고, 약도 먹는 거 너희들 잘 알지? 그런데 엄마가 몸이 힘드니까 머리카락도 너무 무거운데 이거 다 밀어버려도 괜찮을까?”라고 하자 아이들이 그러라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했습니다. 저는 아이들 앞에서 스님처럼 머리를 모두 밀어 버렸습니다.
둘째는 머리카락 없는 엄마 모습이 우스운지 까슬까슬한 제 머리에 손을 갖다대며 느낌이 이상하다고 깔깔깔 웃었습니다.
차라리 그 모습이 아이답고 좋았습니다. 하지만 철이 너무 일찍 든 큰애는 저를 꼭 안아주며 “엄마! 우리는 괜찮아. 엄마 아파서 그런 거니까 상관없어. 하지만 엄마 친구들은 초대하지 마. 엄마 보면 뭐라 할지도 몰라” 하면서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참았던 제 눈에서 눈물이 또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우리 아들은 일곱 살답지 않게 너무 일찍 철이 들어버렸습니다. 설거지도 자기가 한다고 그러고, 엄마 아프니까 자기들이 속상하게 하면 안 된다고 동생한테 타이르기도 합니다.
동갑내기 제 남편도 예전엔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소리 높여 잘 싸웠는데 이제는 제가 뭐라 그러면 “알았어.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미안해” 이 말만 하고는 입을 닫아버립니다.
3년 사이 저희 집 두 남자는 부쩍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걸 보는 게 솔직히 더 마음 아픕니다.
저는 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수군거리든 말든, 목욕탕도 혼자 다니고, 유치원 참관수업도 잘 다닙니다. 지난번에도 유치원 다도발표회에 한복 입고 오라고 해서, 가발 쓰고, 예쁘게 한복입고 다녀왔습니다.
오는 3월 큰아이 초등학교 입학식 때도 저는 예쁘게 차려입고, 기념사진도 찍고, 우리 아들 마음껏 축하해주고 올 겁니다.
제 꿈은 그저 평범하게 사는 것입니다. 남편과 우리 아이들 뒷바라지하며 평범한 가정주부로 사는 게 꿈입니다. 힘들어하지 않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게 우리 가족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입니다. 저는 지금도 충분히 힘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가족들이 좀 더 힘을 내줬으면 하고 바랄 뿐입니다.
전북 진안 | 양정숙
행복한 아침, 왕영은 이상우입니다
Copyright © 스포츠동아.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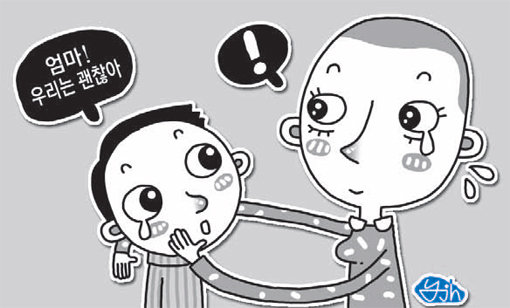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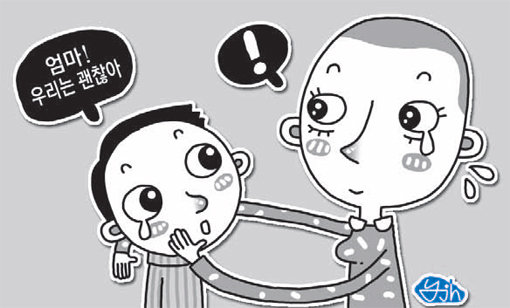
![심은하, 비행기 셀카 근황 화제…54세 여전한 미모[SD셀픽]](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3/05/133466998.1.jpeg) 심은하, 비행기 셀카 근황 화제…54세 여전한 미모[SD셀픽]
심은하, 비행기 셀카 근황 화제…54세 여전한 미모[SD셀픽]![‘안지현 열애설’ 성백현 “연애할 땐 솔직한 편…잘못하면 인정” [DA클립]](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3/04/133465498.1.jpg) ‘안지현 열애설’ 성백현 “연애할 땐 솔직한 편…잘못하면 인정” [DA클립]
‘안지현 열애설’ 성백현 “연애할 땐 솔직한 편…잘못하면 인정” [DA클립] ‘겨울연가’ 영화로 돌아온다…4K 리마스터·OST 재녹음
‘겨울연가’ 영화로 돌아온다…4K 리마스터·OST 재녹음 ‘대세’ 김혜윤·이종원, ‘살목지’로 그릴 극강의 공포…‘호러 아이콘’ 도전(종합)
‘대세’ 김혜윤·이종원, ‘살목지’로 그릴 극강의 공포…‘호러 아이콘’ 도전(종합) 방탄소년단 진, 흔들린 사진도 화보라니
방탄소년단 진, 흔들린 사진도 화보라니![데이식스 도운, 1억 디펜더 공개 “열심히 일한 보상, 애교로 봐주세요” [DA클립]](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3/04/133465466.1.jpg) 데이식스 도운, 1억 디펜더 공개 “열심히 일한 보상, 애교로 봐주세요” [DA클립]
데이식스 도운, 1억 디펜더 공개 “열심히 일한 보상, 애교로 봐주세요” [DA클립] 이준혁, ‘왕과 사는 남자’ 막동아재로 존재감 폭발
이준혁, ‘왕과 사는 남자’ 막동아재로 존재감 폭발![안성재, ‘두바이 딱딱 강정’ 논란 종결 “이젠 ‘안쫀쿠’” [DA클립]](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3/04/133465590.1.jpg) 안성재, ‘두바이 딱딱 강정’ 논란 종결 “이젠 ‘안쫀쿠’” [DA클립]
안성재, ‘두바이 딱딱 강정’ 논란 종결 “이젠 ‘안쫀쿠’” [DA클립] 김태리, ‘태리쌤’에 진심…소품 제작부터 OST 가창까지
김태리, ‘태리쌤’에 진심…소품 제작부터 OST 가창까지 임영웅 브랜드지수 폭등…광고주가 찾는 이유
임영웅 브랜드지수 폭등…광고주가 찾는 이유 이휘재 복귀설…캐나다 체류 중 한국서 활동 준비?
이휘재 복귀설…캐나다 체류 중 한국서 활동 준비?![‘브리저튼4’ 하예린 “이름에 담긴 내 정체성 자랑스러워…영어 이름 안써”[인터뷰]](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3/04/133461791.1.jpg) ‘브리저튼4’ 하예린 “이름에 담긴 내 정체성 자랑스러워…영어 이름 안써”[인터뷰]
‘브리저튼4’ 하예린 “이름에 담긴 내 정체성 자랑스러워…영어 이름 안써”[인터뷰]![장영란, 2년 숨긴 ‘비밀’ 최초 고백…알고보니 새 사업 [DA클립]](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3/04/133465569.1.jpg) 장영란, 2년 숨긴 ‘비밀’ 최초 고백…알고보니 새 사업 [DA클립]
장영란, 2년 숨긴 ‘비밀’ 최초 고백…알고보니 새 사업 [DA클립] 임영웅 빌보드 15곡 동시 진입…이 기록 뭐지
임영웅 빌보드 15곡 동시 진입…이 기록 뭐지 아이들, 美 ‘투데이쇼’서 북미 투어 깜짝 발표…10개 도시 대장정
아이들, 美 ‘투데이쇼’서 북미 투어 깜짝 발표…10개 도시 대장정![오정연, 43세 맞아? ‘군살 제로’ 아찔한 건강미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3/04/133465689.1.jpg) 오정연, 43세 맞아? ‘군살 제로’ 아찔한 건강미 [DA★]
오정연, 43세 맞아? ‘군살 제로’ 아찔한 건강미 [DA★] “여름까지 못 기다려”…봄 극장가 달굴 K호러 ‘살목지’ vs ‘삼악도’
“여름까지 못 기다려”…봄 극장가 달굴 K호러 ‘살목지’ vs ‘삼악도’![43세 한채아, 제니 어깨 도전…플라잉 요가→헬스 ‘자기관리 끝판왕’ [DA클립]](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3/04/133465428.1.jpg) 43세 한채아, 제니 어깨 도전…플라잉 요가→헬스 ‘자기관리 끝판왕’ [DA클립]
43세 한채아, 제니 어깨 도전…플라잉 요가→헬스 ‘자기관리 끝판왕’ [DA클립]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