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를 다룬 다큐영화 ‘나는 갈매기’ 한장면.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2009 프로야구는 580만 관중을 넘어섰다. 프로야구 경기장의 수준이나 우리나라의 경제력 등을 감안하면 경이적인 숫자가 아닐 수 없다. 당분간은 깨기 힘든 전대미문의 관중동원 기록일 수도 있다. 2009년은 야구계로서는 잊지 못할 한해로 기억되리라. 하나의 스포츠 종목이 르네상스를 구가하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현상 중에 하나가 파생상품인 ‘문화콘텐츠’의 양산이다. 소설, UCC, 블로거, 만화, 영화, TV드라마 등 다양한 영역에서 문화상품을 생산한다. 절찬리에 종영된 것은 아니지만 2009 외인구단이 TV를 통해 본격적으로 야구를 이야기 했다.
우리나라에서 야구영화가 처음 나온 것은, 1970년대였다. 고교야구의 인기를 등에 업고 1977년 ‘영광의 9회말’과 ‘자! 지금부터야’가 개봉되었다. 영화가 시대상을 반영한다고 볼 때, 당시 고교야구관련 영화의 개봉은 필연적이었으리라. 그 중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것이, 진유영 주연의 ‘자! 지금부터야’이다. 최관수 감독의 군산상고 전성기 시절을 재현한 이 영화는 어린 시절 필자가 영화관에서 직접 관람했다. 30년도 훨씬 지났지만 이 영화가 이렇게 기억에 남는 건, 집근처 동네 유랑극단이 틀어준 영화가 아니라 시내에서 처음 본 영화이기 때문이다. 야구 사랑의 시작이자 배우 진유영이 각인된 영화이기도 하다. 이렇듯 문화란 영역은 인간 개개인에게 지극히 주관적인 추억을 만들어 주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야구관련 영화라고 해봐야 고작 10편 미만이다. 미국의 170여 편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그것은 야구가 갖는 사회적 함의와 문화적 파워의 격차일 수도 있다. 물론 한국프로야구는 아직은 역사가 일천하기에 MLB와 단순비교는 어렵지만, 야구가 단순한 ‘공놀이’로 끝나느냐, 아니면 개인뿐만 아니라 그 사회의 시대상과 문화에 얼마만큼 유의미한 족적을 남기느냐에 따라 영향력은 달라진다. 대학시절, 미국 야구영화 사상 미국 성인남성이 가장 눈물을 많이 흘렸다는 케빈 코스트너 주연의 ‘꿈의 구장’을 보았지만,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별다른 감흥을 느끼지 못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번역상의 오류도 있었지만, 미국 야구문화를 온 몸으로 느끼기에는 필연적 한계가 있었다. 경험을 공유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 영화의 ‘미국의 역사는 칠판 속에서 쓰였다 다시 지워졌지만 야구는 불변계수였다’는 끝부분 대사는 미국야구의 문화적 힘을 함축적으로 보여주었다.
영화 해운대에서 설경구가 술에 취한 채 “부산사람으로 태어나서, 롯데 우승을 위해 이 한 몸 바쳐야지예”라고 한 것도 부산의 정체성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이런 와중에, 프로야구 롯데를 정면으로 다룬 영화 ‘나는 갈매기’가 개봉을 앞두고 있다. 극영화가 아니라 다큐멘터리를 극장에서 정식으로 상영한다는 것은 의미가 남다르다. 야구가 갖는 문화적 힘이 크면 클수록 다양한 분야에서 야구를 조명할 수밖에 없다. 다큐멘터리인 관계로 흥행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롯데팬들에게 이 영화는 축복이다. 이 영화 덕분에 한 명이라도 더 야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동명대학교 체육학과 교수
요기 베라의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 라는 경구를 좋아한다. 현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지만 로망과 스포츠의 '진정성'을 이야기 하고 싶다
Copyright © 스포츠동아.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하기






![임성근 셰프, 음주운전 3차례 직접 고백…“숨기고 싶지 않았다” [SD이슈]](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1/18/133180625.1.jpeg)


![사쿠라, 실크 드레스 입고 우아美 폭발…은근한 볼륨감까지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1/16/133169543.3.jpg)


![소유진, ‘방송복귀’ ♥백종원과 투샷 공개…여전한 부부 케미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1/15/133164240.3.jpg)

![한강 오늘(19일) 생일…트롯픽 이벤트 주인공 [DA:차트]](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1/16/133174120.1.jpg)


![제니, 입에 초 물고 후~30살 되더니 더 과감해졌네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1/16/133169711.3.jpg)


![소유, 10kg 감량후 물오른 비키니 자태…찍으면 다 화보 [DA★]](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6/01/16/133172519.1.jpg)




![25살 제니, 욕조→침대까지…파격 포즈 [DA★]](https://dimg.donga.com/a/140/140/95/1/wps/SPORTS/IMAGE/2026/01/18/133177600.1.jpg)

![소유, 10kg 감량후 물오른 비키니 자태…찍으면 다 화보 [DA★]](https://dimg.donga.com/a/140/140/95/1/wps/SPORTS/IMAGE/2026/01/16/133172519.1.jpg)



![지상렬♥신보람 핑크빛 일상 “애칭은 ‘자기야’” (살림남2)[TV종합]](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6/01/18/133177282.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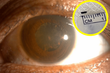




![“무선 고데기는 기내 반입 금지” 인천공항서 뺏긴 사연[알쓸톡]](https://dimg.donga.com/a/110/73/95/1/wps/NEWS/IMAGE/2026/01/16/133171330.2.jpg)




![장예원 주식 대박 터졌다, 수익률 무려 323.53% [DA★]](https://dimg.donga.com/a/110/73/95/1/wps/SPORTS/IMAGE/2023/12/01/122442320.1.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