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 김진곤.
KT 위즈는 지난해까지 만년 하위권이었다. 1군 진입 첫해인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맥을 못 춘 채 최하위에 머물렀다. 지난해에도 시즌 최종전에 가서야 9위를 확정했을 만큼 어려운 시즌을 보냈다.
올해는 달라졌다. KT는 4일 고척 키움 히어로즈전 승리로 5위에 올랐다. KT가 6월 이후 5위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까지 볼 수 없던 ‘뎁스’의 힘으로 이탈자들의 공백을 메꾸는 것이 원동력으로 꼽힌다. 반대로 얘기하면, 백업으로 분류된 선수들에게는 이를 뚫어내기가 쉽지 않다는 의미다.
김진곤(32)이 딱 그럴 것 같았다. 그는 SK 와이번스에서 2년 만에 방출된 뒤 독립구단 고양 원더스에서 재기의 꿈을 꿨다. 2015년 KT에 입단했지만 지난해까지 4년간 127경기 출장해 타율 0.216, 2홈런, 14타점에 그쳤다. 2군에서 아무리 맹타를 쳐도 1군 콜업은 거의 없었다. 가끔 콜업이 되더라도 대타·대수비 요원에 그쳤다. 타격감을 유지하기 어려웠다.
올해도 쉽지 않은 듯했다. 하지만 이강철 감독은 후반기 시작과 동시에 그를 불러들였고, 김민혁이 이탈한 뒤로 꾸준히 기회를 주고 있다. 김진곤은 후반기 5경기에서 타율 0.500, 3타점, 3득점으로 활약 중이다. 높아진 문턱을 오히려 뚫어내기 시작한 것이다.
김진곤은 “경쟁이 어려워진 건 사실이다. 하지만 마음은 오히려 가벼워졌다. 상상만 하던 그라운드가 현실이 된 느낌”이라며 “특히 지난해까지와 달리 상대가 우리를 쉽게 못 보는 게 느껴지니 더욱 재밌다. 개인으로는 경쟁이 어려워졌지만 우리가 강해졌다는 점에서 재밌다”고 밝혔다.
김민혁과 강백호가 복귀한다면 김진곤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전망이다. 하지만 그는 “지금은 주전 욕심을 낼 시기가 아니다. 내가 나갈 때 번트 하나, 뜬공 하나가 필요하다면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스타가 되고 싶은 마음은 없다. 사람 욕심에 끝은 없다지만 팀이 먼저라는 건 진심”이라고 설명했다.
올 시즌 KT에는 김진곤을 비롯해 정성곤, 오태곤 등 ‘곤’으로 끝나는 이름의 선수들이 활약 중이다. 특히 김진곤과 오태곤은 최근 테이블세터로 호흡을 맞추는 경우가 잦다. 김진곤은 “곤 테이블세터로 불린다. 내가 나가면 태곤이가 잘 불러준다. 이런 게 확실히 팀 케미스트리인 것 같다”며 웃었다.
고척 | 최익래 기자 ing17@donga.com
Copyright © 스포츠동아.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하기









![변요한, ♥티파니와 새해 맞이? 숟가락에 비친 ‘커플 실루엣’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1/02/133080789.3.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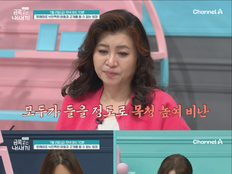



![‘두쫀쿠’는 좋겠다, 장원영이 이렇게 사랑해줘서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1/02/133080468.3.jpg)




![“깜짝이야” 효민, 상의 벗은 줄…착시 의상에 시선 집중 [DA★]](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5/12/30/133061528.3.jpg)
![몸집 키운 바이포엠, 김우빈♥신민아 소속사 인수 [공식]](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5/12/31/133070547.1.png)
![대체 왜 이래? SBS 연예대상, 지석진 향한 기만의 역사 (종합)[DA:이슈]](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5/12/31/133070320.3.jpg)




![이민정, 딸과 첫 해외여행서 응급 상황…“♥이병헌이 밤새 간호” [DA★]](https://dimg.donga.com/a/140/140/95/1/wps/SPORTS/IMAGE/2026/01/02/133081053.3.jpg)
![변요한, ♥티파니와 새해 맞이? 숟가락에 비친 ‘커플 실루엣’ [DA★]](https://dimg.donga.com/a/140/140/95/1/wps/SPORTS/IMAGE/2026/01/02/133080789.3.jpg)























![김남주 초호화 대저택 민낯 “쥐·바퀴벌레와 함께 살아” [종합]](https://dimg.donga.com/a/110/73/95/1/wps/SPORTS/IMAGE/2025/05/27/131690415.1.jpg)
![이정진 “사기 등 10억↑ 날려…건대 근처 전세 살아” (신랑수업)[TV종합]](https://dimg.donga.com/a/110/73/95/1/wps/SPORTS/IMAGE/2025/05/22/131661618.1.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