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 삼성 김병수 감독(왼쪽), 제주 남기일 감독. 사진제공 | 한국프로축구연맹
서늘한 가을비와 함께 K리그에 또 한번 ‘이별의 계절’이 찾아왔다.
수원 삼성과 제주 유나이티드가 나란히 사령탑과 헤어졌다.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25일 ‘감독 경질’ 카드를 꺼냈다. 올해 5월부터 수원을 이끈 김병수 감독, 3년 9개월간 제주와 동행한 남기일 감독이 동시에 떠났다.
상황이 좋지 않긴 하다. 31라운드까지 마친 ‘하나원큐 K리그1 2023’에서 수원은 5승7무19패(승점 22)로 최하위, 제주는 9승8무14패(승점 35)로 9위에 머물고 있다. 정규라운드 종료까지 남은 2경기, 파이널라운드 그룹B(7~12위)에서 치를 5경기에서 반등하지 못하면 11위 강원FC(승점 25)에 승점 3이 뒤진 수원은 K리그2로 다이렉트 강등이 불가피하고, 제주 역시 살얼음판 하위권 경쟁을 펼칠 판이다.
‘성적 부진’이라는 이유도, 구단이 ‘사임’으로 포장한 것까지 같았던 수원과 제주는 내부인사를 통한 해결을 시도했다. 각각 염기훈, 정조국 감독대행에 임시로 지휘봉을 맡겨 잔여시즌을 치르기로 했다.
그런데 온도차는 분명하다. 제주는 고심한 흔적이 묻어나고, ‘사퇴’라는 표현에 대해 남 감독도 딱히 문제 삼지 않는 모습이다. 반면 수원은 다르다. 우선 ‘사퇴’로 한 뒤 김 감독의 요구에 ‘경질’로 바꾸는 등 잡음이 일었다.
전례도 있다. 이병근 감독과 결별한 올해 초에도 수원은 ‘사퇴’로 발표했지만, 실상은 ‘경질’이었다. 자발적 퇴직과 해고의 의미를 구단 사무국이 모르진 않을 텐데, 여론을 호도한 꼴이다. 김병수 감독은 경질 통보를 받은 당일도 삭발을 하고 나타나 팀 훈련을 지휘했다. “말로만 내뱉는 위기가 아니라는 것을 (김 감독이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려고 했다”는 것이 주변의 전언이다. 끝까지 선수들을 챙긴 감독이 몇 시간 만에 마음을 바꿔 사퇴할 리 없다.
감독 교체가 버릇이 된 수원이 염 대행을 선택한 것도 의문이다. 올 시즌을 ‘플레잉코치’로 계약하긴 했으나, 지도자 경력 자체가 없다. 아시아축구연맹(AFC)이 회원국 협회에 할당한 P라이선스도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받았다. 꾸준한 코치 생활로 노하우를 쌓은 정 대행과 다르다. 가장 큰 사랑을 받은 레전드에게 ‘임시 지휘봉’을 맡긴 상황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K리그 팬들은 “반복된 감독 교체와 책임 회피로 인한 비난이 두려운 구단이 내린 최악의 선택”라며 날선 반응을 보이고 있다.
남장현 기자 yoshike3@donga.com
Copyright © 스포츠동아.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하기








![수호 사망 충격…연쇄살인범 아닌 희생양 (힙하게)[TV종합]](https://dimg.donga.com/a/158/89/95/1/wps/SPORTS/IMAGE/2023/09/25/121351745.1.jpg)





![장희진, 청순 미모에 그렇지 못한 몸매…애플힙까지 ‘완벽’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3/05/133474200.1.jpg)
![브리트니 스피어스, 개똥 저택→음주운전 체포…끝없는 추락 [DA할리우드]](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3/06/133476942.3.jpg)
![김연경 “이상형=일편단심 조인성♥, 몇 번 만나” 어머 세상에 [DA클립]](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3/05/133474072.1.jpg)

![‘환승연애4’ 박현지 민낯도 완벽한데 “얼굴 보고 ‘현타’” [DA클립]](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3/05/133474117.1.jpg)

![에스파 닝닝, 41kg 논란에 답했다…“몸무게 뭐가 중요해” [SD톡톡]](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3/06/133478297.1.jpg)

![이주연, 9년 전 안 믿겨…누드톤 각선미+무결점 바디라인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3/05/133473742.1.jpg)







![티아라 효민, 초밀착 바디라인 감탄만 ‘보정 필요 없어’ [DA★]](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6/03/04/133465936.1.jpg)
![‘54세’ 심은하 근황 깜짝…이렇게 변했다 [DA이슈]](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6/03/05/133467326.1.jpg)
![“미쳤나”…로버트 할리, 아내에 물 뿌렸다 ‘충격 고백’ [DA클립]](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6/03/05/133467406.1.jpg)
![트와이스 지효, ‘속옷 노출’ 파격 시스루…뒤태 더 아찔 [DA★]](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6/03/05/133471107.1.jpg)
![“애둘맘 맞아?” 홍영기, 아슬아슬 끈 비키니 입고 뽐낸 몸매 [DA★]](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6/03/05/133467346.1.jpg)
![로제, 명품 쇼 홀린 오프숄더 자태…비현실적 어깨라인 [DA★]](https://dimg.donga.com/a/140/140/95/1/wps/SPORTS/IMAGE/2026/03/06/133478230.1.jpg)
![차정원, ♥하정우가 반할 만하네…원피스 입고 청순미 폭발 [DA★]](https://dimg.donga.com/a/140/140/95/1/wps/SPORTS/IMAGE/2026/03/06/133476060.1.jpg)

![장희진, 청순 미모에 그렇지 못한 몸매…애플힙까지 ‘완벽’ [DA★]](https://dimg.donga.com/a/140/140/95/1/wps/SPORTS/IMAGE/2026/03/05/133474200.1.jpg)

![호주 전력 심상찮다, 체코에 5-1 승리로 2연승 질주…‘前 LG’ 코엔 윈 2이닝 무실점+‘울산 웨일즈’ 알렉스 홀 쐐기포 쾅! [WBC]](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6/03/06/133477905.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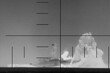




![장예원 주식 대박 터졌다, 수익률 무려 323.53% [DA★]](https://dimg.donga.com/a/110/73/95/1/wps/SPORTS/IMAGE/2023/12/01/122442320.1.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