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리그는 더 이상 월드컵 효과를 기대해선 안 된다. 선수 육성 등으로 자생력을 키워 러시아월드컵 최고 스타 조현우 같은 스타를 끊임없이 길러내야 한다. 대구 조현우가 8일 재개된 K리그 경기에 앞서 팬들과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프로축구연맹
한국축구에서 월드컵은 전가의 보도다. 어디든 갖다 붙이면 명분이 된다. 암행어사의 마패처럼 월드컵만 내세우면 웬만한 건 그냥 통과다. 월드컵 성공을 위해서라면 작은 희생 정도는 눈을 감는다. 영웅과 역적이 한순간에 바뀌는 살벌함 때문에 다들 모른 척하고 넘어간다.
그동안 불이익을 많이 당한 곳은 프로축구 K리그다. 선수차출도, 일정조정도 모두 월드컵에 맞췄다. K리그는 뒷전이었다. 그러니 구단들의 속앓이는 말해 무엇하랴. “프로축구는 없고 온통 대표팀 축구뿐이다”며 기형적인 한국축구를 꼬집는 외신보도도 자주 등장했다.
불만을 가진 K리그도 기대하는 게 있었다. 바로 월드컵 효과다. 대표팀이 좋은 성적을 내면 덩달아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었다. 축구의 브랜드 가치 상승과 TV 중계 확대, 관중 증가 등의 선순환이 이뤄지면 K리그도 보상 받을 수 있다고 믿었다.
실제 월드컵 효과는 있었다. 시초는 1998년이다. 당시 조별리그 탈락이었지만 신예들이 K리그를 살렸다. ‘라이언 킹’ 이동국, ‘앙팡 테리블’ 고종수, ‘테리우스’ 안정환의 트로이카 구도가 형성되면서 신바람을 냈다. 축구장에 오빠 부대의 함성이 몰아친 게 이때부터다.
2002년엔 4강의 기운이 K리그에 고스란히 전해지면서 광풍이 불었다. 관계자들의 즐거운 비명이 지금도 생생하다. 정규리그가 월드컵 이후에 시작된 가운데 7월 7일 주말 개막일에 12만3189명이 입장해 하루 최다관중 기록을 세웠다. 주중(10일)엔 K리그 출범 이후 첫 주중 10만 관중을 돌파했다. 장맛비 속에 진행된 주말 경기(13~14일)엔 13만8474명이 입장해 최다관중 기록을 일주일 만에 갈아 치웠다. 그 해 평균관중은 1만5839명으로 전년(1만1847명) 대비 133.7%나 상승했다.
돌이켜보면 그런 절호의 기회를 살리지 못한 게 뼈아프다. 당시 모두들 들뜬 탓인지 향후대책이라고 내놓는 게 팬 서비스 확충 정도의 원론적인 얘기들뿐이었다.
원정 첫 승(1승1무1패)이라는 성과가 있었지만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2006년까지는 그나마 월드컵 효과를 누렸다. 당시 ‘축구천재’라 불렸던 박주영이 K리그의 인기몰이를 주도했다. 월드컵 휴식기를 사이에 두고 평균 관중이 5958명에서 1만1468명으로 92.5%나 뛰었다.

월드컵 효과라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였다. 2002년 이후 선수들의 유럽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K리그에 스타 기근현상이 심각해졌다. 거품 빠지는 소리가 여기저기 들렸다. 이때라도 현실을 직시하고 중장기 발전방안을 고민했다면 하는 진한 아쉬움이 남는다.
2010년은 사상 첫 원정 16강이라는 엄청난 성과를 올린 해다. 하지만 K리그에는 파급효과가 없었다. 월드컵 휴식기 이후 치러진 주말 정규리그에서는 평균관중이 7873명으로 월드컵 직전보다 21.6%나 줄었다. 당시 월드컵에서 활약한 선수는 대부분 해외파들이었다. 이미 눈높이가 유럽 클럽에 맞춰진 팬들은 K리그를 외면했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도 행정은 제자리걸음이었고, 재미없는 수비축구는 계속됐다는 사실이다. K리그 부흥이 절실하다며 목소리를 높였지만 정작 행동으로 옮기진 못했다.
2014년엔 더 심각했다. 부진한 경기력 탓인지 월드컵 직전 9381명이었던 평균관중이 월드컵 직후 7247명으로 줄었다.
올해 월드컵은 조별리그에서 탈락했지만 3차전에서 최강 독일을 꺾으며 최악은 면했다. 또 골키퍼 조현우(대구FC)의 스타 탄생이 그나마 분위기를 살렸다. 주말 재개된 K리그에서 대구구장의 평균관중이 월드컵 이전보다 5배나 뛰었다. 스타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대목이다. 하지만 이것도 반짝 특수가 될 것이라는 걸 우린 오랜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이제 확실해진 게 있다. 대표팀도, K리그도 더 이상 매력적인 콘텐츠가 아니라는 점이다. 축구 말고도 즐길거리가 얼마든지 있다. 재미없는 경기에 팬들이 몰릴 이유가 없다. 월드컵이 끝나면 선수들은 K리그를 응원해달라고 부탁하지만 팬들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다.
더 이상 월드컵 효과를 기대하지 말자. 과거 기회를 살리지 못한 걸 후회하지도 말자. 대신 자생력을 키우는 데 총력을 쏟아야 한다. 이 엄중한 과제를 모르는 구단은 없다. 중요한 건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면 조현우 같은 스타는 더 많이 탄생할 수 있다. 이는 월드컵 효과가 아니라 K리그 효과다. K리그가 무너지면 우리 대표팀도 무너진다는 사명감으로 K리그 부흥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Copyright © 스포츠동아.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하기




![[속보] 추신수, 구단 역사상 처음으로…헉!](https://dimg.donga.com/a/158/89/95/1/wps/SPORTS/IMAGE/2018/07/09/90959320.2.jpg)







![‘하시4’ 김지영, 임신 맞아?…청순 웨딩드레스 자태에 ‘깜짝’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1/14/133152348.3.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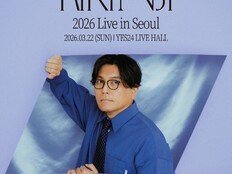
![에스파 카리나, 니트 드레스 한장으로 파격 올킬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1/13/133147678.1.jpg)


![50대 이영애 민낯 美쳤다, 노하우 전격 공개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1/13/133150497.1.jpg)

![‘백사장3’, 이름 바꾸고 2월 편성 확정…윤시윤도 합류 [공식]](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5/02/03/130958368.1.jpg)
![박지윤 ‘성인식’ 느낌…장원영, 초밀착 니트 원피스 ‘성숙미’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1/14/133152337.1.jpg)



![배우자들 앞에서 대놓고 불륜…“모텔비 굳었다” 경악 (영업비밀)[TV종합]](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6/01/13/133143756.1.jpg)
![에스파 카리나, 니트 드레스 한장으로 파격 올킬 [DA★]](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6/01/13/133147678.1.jpg)

![‘기부금’ 노리고 딸을 환자로 조작? ‘국민 엄마’ 충격 실체 (하나부터)[TV종합]](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6/01/13/133143680.1.jpg)
![블랙핑크 리사, 섹시 터졌다, 골든 글로브 파티 올킬 [DA★]](https://dimg.donga.com/a/140/140/95/1/wps/SPORTS/IMAGE/2026/01/14/133153761.1.jpg)

![“맛있는데 어쩌라고”…이재욱, 두쫀쿠 앞에서 이성 잃었다 [DA★]](https://dimg.donga.com/a/140/140/95/1/wps/SPORTS/IMAGE/2026/01/14/133152477.3.jpg)
![‘하시4’ 김지영, 임신 맞아?…청순 웨딩드레스 자태에 ‘깜짝’ [DA★]](https://dimg.donga.com/a/140/140/95/1/wps/SPORTS/IMAGE/2026/01/14/133152348.3.jpg)
![“커리어 첫 큰 부상, 감독님께 죄송했다”…‘투구 메커니즘 변화’ 부활 꿈꾸는 NC 선발 최고참 [SD 베이스볼 피플]](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6/01/14/133154246.1.jpg)















![장예원 주식 대박 터졌다, 수익률 무려 323.53% [DA★]](https://dimg.donga.com/a/110/73/95/1/wps/SPORTS/IMAGE/2023/12/01/122442320.1.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