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가어느때인데 17세기발상을하는가”…일부조사선찬성많아강행여부주목
미국여자골프협회(LPGA)가 언론에 흘린 ‘영어 의무화 정책’(LPGA PROPOSED ENGLISH POLICY ) 이 거센 반발에 부닥쳤다.
전날 “영어 구술평가에 통과하지 못할 경우 2년 동안 LPGA 투어에 출장하지 못한다”는 방침이 보도된 뒤 28일 스포츠 뉴스의 핫이슈는 LPGA의 영어 의무화 방침이었다. 전반적으로 미디어 종사자들은 “지금이 때가 어느 때인데 17세기 발상을 하느냐”는 반응이다.
당장 영어 의무화는 ‘차별대우’(Discrimination)에 걸려 법에 호소할 경우 LPGA가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이 이슈를 가장 크게 다루고 있는 골프채널도 법률 전문가를 초빙해 법의 저촉 여부를 검토하기도 했다. 방송에 출연한 법률 전문가는 1964년 미 연방법이 제정한 ‘시민적 권리에 관한 법률’(Civil Rights Act )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 법에는 인종 피부색, 종교, 출신 국에 따른 차별을 철폐한다고 돼 있다(a law prohibiting discrimination based on race, color, religion, sex, and national origin by federal and state governments as well as some public places.)
다만 이 법을 고용주와 피고용주 관계에서 법에 호소했는데, LPGA와 선수는 그 관계가 아니라는 점이다. LPGA의 리바 갤러웨이 부 커미셔너가 “절대 한국 선수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하는 이유도 이 법에서 명기한 출신국 때문이다.
사실 영어 의무화 정책이 45명이나 LPGA 투어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선수들을 겨냥한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이날 골프채널, ESPN의 자료화면은 모두 한국 선수가 우승 후 통역을 대동해서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왔다.
ESPN 방송에 출연한 기자들은 “글로벌 시대에 왜 영어를 의무적으로 배우고 구술 테스트를 봐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스페인어도 있고, 프랑스어도 있는데 왜 영어를 고집하느냐는 것이다. 한마디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LPGA에 노조가 없기 때문에 이런 발상을 할 수 있었다며 LPGA를 비난했다.
아울러 기자들은 스포츠에서 최고 기량으로 경쟁을 하면 될 일이지 언어로 경쟁을 하느냐며 LPGA의 이번 방침에 반발했다.
이날 도이치뱅크 챔피언십을 앞둔 PGA 선수들에게도 LPGA의 영어 의무화 방침에 질문을 던지자 찬반양론이 뚜렷했다.
비디오게임 홍보차 뉴욕에 머물고 있는 타이거 우즈는 CNBC와의 단독인터뷰에서 이슈 자체가 민감한 탓인지 “잘 모르겠다”며 답변을 피했다.
영어 의무화 보도 후 골프채널과 ESPN의 여론조사에는 LPGA 방침을 지지하는 쪽이었다. ESPN의 ‘LPGA 선수들에게 영어를 의무화하는 게 공정하냐’는 질문에 66%가 ‘YES’라고 답했다. 골프채널의 ‘영어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을 때 제재를 가하는 게 심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60%가 ‘괜찮다’고 답했다.
골프 팬들은 전반적으로 미국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으니 영어를 구사하는 게 당연하다는 반응이다.
이번 LPGA의 영어 의무화 조치가 그것도 시즌 도중에 나온 가장 큰 이유는 스폰서십 때문이다. 한국 선수들의 대거 출전과 올 25개 투어 가운데 20개 대회가 외국에서 태어난 선수의 우승으로 스폰서들이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보통 대회 전날 벌어지는 프로-암 대회에 한국 선수들은 수천달러를 주고 라운딩을 하는 스폰서들과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무뚝뚝한 표정을 지어 문제로 대두됐다.
과연 LPGA가 법에 어긋나는 영어 의무화 방침을 강행할지 궁금하다.
LA|문상열 통신원
Copyright © 스포츠동아.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하기

![제시, 논란 뒤 근황 포착…새해에도 애플힙 ‘눈길’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1/06/133102502.3.jpg)









![이특, 새해부터 통 크게 질렀다…1억 포르쉐 플렉스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1/06/133102929.3.jpg)

![‘40억 건물주’ 이해인 새해에도 파격미 여전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1/06/133102559.1.jpg)
![유스피어 데뷔 7개월 만에…“전속계약 종료” [전문]](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5/06/30/131909631.1.jpg)

![신지, ♥문원과 떠났나…휴양지서 더 어려진 미모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1/06/133101914.3.jpg)




![트와이스 모모, 티셔츠 터지겠어…건강미 넘치는 바디라인 [DA★]](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6/01/02/133084297.1.jpg)



![아이브 장원영, ‘인간 복숭아’ 아닐 리가…러블리+핑크빛 [DA★]](https://dimg.donga.com/a/140/140/95/1/wps/SPORTS/IMAGE/2026/01/06/133105567.1.jpg)
![김빈우, 역대급 비키니 몸매…43세 안 믿겨 ‘부럽다’ [DA★]](https://dimg.donga.com/a/140/140/95/1/wps/SPORTS/IMAGE/2026/01/06/133105504.1.jpg)
![이특, 새해부터 통 크게 질렀다…1억 포르쉐 플렉스 [DA★]](https://dimg.donga.com/a/140/140/95/1/wps/SPORTS/IMAGE/2026/01/06/133102929.3.jpg)
![신지, ♥문원과 떠났나…휴양지서 더 어려진 미모 [DA★]](https://dimg.donga.com/a/140/140/95/1/wps/SPORTS/IMAGE/2026/01/06/133101914.3.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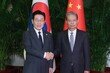













![김남주 초호화 대저택 민낯 “쥐·바퀴벌레와 함께 살아” [종합]](https://dimg.donga.com/a/110/73/95/1/wps/SPORTS/IMAGE/2025/05/27/131690415.1.jpg)
![이정진 “사기 등 10억↑ 날려…건대 근처 전세 살아” (신랑수업)[TV종합]](https://dimg.donga.com/a/110/73/95/1/wps/SPORTS/IMAGE/2025/05/22/131661618.1.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