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진 투수코치는 자신의 야구인생의 받쳐준 힘을 “오기”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지도자로서 김 코치는 오기가 아니라 친화의 힘을 믿는 쪽으로 변하고 있다. 스포츠동아DB
7. SK 김상진 코치
배팅볼 투수로 입단…연습 또 연습
95년엔 17승 OB 에이스 등극
난 SK의 ‘악역’ 코치
우리 투수들 역량 다 끄집어내겠다
언젠가부터 우리 사회에서 성공을 위해서는 실력이나 의지보다 인맥, 학연 같은 것들이 훨씬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이런 풍토에서 엘리트 코스와 거리가 멀고, 변변한 인맥조차 없는 이가 꿈을 이루기 위한 열쇠는 무엇일까? SK 김상진 투수코치(41)의 스토리는 시사하는 바가 작지 않을 것 같다.
● 만화 같은 야구인생
마산 소년 김상진이 야구에 입문한 것은 중학교 2학년 겨울이었다. 꽤나 늦은 나이에 시작한 셈이다. 원래 마산동중 입학 때부터 하고 싶어서 야구부원 모집 때 번쩍 손을 들었는데 “손 내리라”는 소리만 들었다. 160cm도 안됐던 작은 키가 결격사유였다. 그러나 소년 김상진은 고집이 셌다. 부모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야구로 고교를 가겠다”고 조건을 걸어 기어코 야구부에 들어갔다. 그렇게 시작한 야구, 현실은 첩첩산중이었다. 중3인데 기본기부터 배워야했다. 실전은 언감생심이었다.
김상진은 기적처럼 마산상고에 진학했다. 그런데 막상 입학하니 감독이 바뀌어 있었다. 연습 첫날 야구부장이 따로 불러냈다. “교실로 가라”고 했다. 한마디로 잘린 것이었다. 마흔이 된 지금 돌이켜봐도 그날 밤만큼 서럽게 울었던 적이 없었다.
그 다음날부터 김상진은 아예 등교를 하지 않았다. 집에는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다른 데 있다가 왔다. 귀가할 때는 일부러 옷을 적셔서 연습하고 온 것처럼 꾸몄다. 그렇게 흐른 1주일, 학교 대신 김상진은 경남대에 가 있었다. 마침 청강고 선수들이 그곳에서 훈련에 한창이었다. 무작정 달려가 “야구 하고 싶다”고 했더니 “아버지 모시고 오라”고 했다. 우여곡절 끝에 특기자로 전학이 허가됐다.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입학이 허가된 데에는 청강고 야구부가 창단된 지 2년밖에 안된 신생학교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다보니 전국에서 야구로 진학을 못한 아이들을 모아서 만들어졌고, 생활도 고달팠다. 그럼에도 버틴 힘의 근원은 “죽어도 야구로 성공해야겠다. 나를 자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다”는 ‘오기’였다.
● 맨발에서 벤츠까지
2학년 때 갑자기 허리가 아팠다. 6개월을 앓았는데 백약이 무효였다. 나중에 알고 보니 성장통이었다. 키가 18cm를 훌쩍 자랐다. 키가 커지자 원래 어깨가 좋은 김상진은 투수가 됐다. “잘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이뤄진 전향이었다. 고교 시절 성적은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다. 전국대회는 봉황기 1회 출전이 전부였는데 1회전 탈락이었다. 대학 문은 막혔다.
결국 갈 곳은 프로뿐이었는데 연고구단 롯데는 지명을 해주지 않았다. 그런데 OB가 관심을 보였다. 당시 규정은 연고 팀이 아니면 입단이 불허됐기에 훈련보조 형태로 취업을 했다. 배팅볼 투수로 출발한 사연이다. 그렇게 1년을 던지고, 1990년 정식 지명을 받아서 계약금, 연봉 각 600만원에 입단했다. 당시 시세로도 큰 돈은 아니었으나 프로야구 선수의 소원을 이룬 것이다. 첫해 미국 사라소타 교육리그에서 독학으로 투구폼을 만들었다. 팔 스윙과 밸런스가 잡히자 자신감이 붙었다.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왔다. 당시 약체팀 OB는 1991년 5월부터 2군에서 김상진을 승격시켰다. 그리고 꼴찌팀에서 일약 10승을 거뒀다.
92년 11승, 93년 11승, 94년 14승, 95년 17승까지 5년 연속 10승을 올렸다. 완투형 투수로 명성을 날렸다. 1995년 한국시리즈 우승은 야구 인생의 정점이었다. 다만 통념이 그랬지만 당시 몸 관리를 못한 것은 한으로 남는다. 그 아픔은 현재 지도자 김상진이 투수를 관리하는 데 큰 경험으로 작용하고 있다.
● 다혈질 투수가 카멜레온 투수코치로
1998시즌을 마치고 6억 5000만원에 삼성으로 현금 트레이드됐다. 그러나 이 시점부터 구위가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삼성 입단은 정상이 아닌데 정상에 올랐다는 착각을 불러 왔다. 결국 2002년 SK로 돌연 트레이드됐다. 2003년(2승8패)을 뛰고, 재계약 제의를 받지 못했다. 왕년의 에이스는 어디로부터도 콜을 받지 못했다. 타의에 의한 자동 은퇴가 됐다.
막상 은퇴하니 불러주는 곳이 없었다. 메이저리그 해설을 시작했다. 와신상담의 세월을 보내던 중 한양대에서 인스트럭터 제안이 들어왔고, 이후 SK에서 코치 제의를 받았다. 그것이 2005년이었다. 그리고 7년간, 코치 김상진은 SK에서 투수들의 성장을 쭉 지켜봤다. 김 코치는 7년의 거의 대부분을 1군 불펜코치로 일했다. 덕분에 SK 투수들을 눈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성격, 습관, 컨디션 그리고 발전 속도가 김 코치의 눈에 자동 입력됐다.
원래 김 코치는 천성이 다혈질이다. 할 말은 하는 성격이다. 그러나 가르치는 입장이 되면서 카멜레온이 됐다. 선수의 스타일에 따라 지도법을 바꾸게 됐고,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체득했다. 개성을 용인하되, 큰 틀에서 원칙을 어기는 선수에게는 가차 없다. 그래서 스스로를 “악역”이라 지칭한다. 선수들이 당장 몰라줘도 잘못된 부분을 얘기해주는 사람이 팀에 하나라도 있어야 된다는 신념이다.
지금의 SK 투수진에 김 코치의 손때가 많이 묻어있는 것은 훼손할 수 없는 사실이다. 특히 2011시즌은 투수코치 김상진의 능력이 세상에 검증된 시간이었다. 김코치는 “겪어보니 아무리 좋은 코치라도 C급 투수를 A급 투수로 만드는 것은 어렵다. 투수가 지니고 있는 역량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역량을 다 끄집어내 줄 수 있는 것이 투수코치의 평가기준이라 생각한다”고 말한다.
김영준 기자 gatzby@donga.com 트위터@matsri21
Copyright © 스포츠동아.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하기

![“두 번의 유산 겪어…” 이문정, 셋째 임신 발표 [전문]](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3/06/133481812.1.jpg)
![김연경 “이상형=일편단심 조인성♥, 몇 번 만나” 어머 세상에 [DA클립]](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3/05/133474072.1.jpg)





![[공식]‘왕과 사는 남자’ 개봉 31일 만에 1000만 돌파…역대 34번째 대기록](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3/06/133480382.1.jpeg)

![‘왕과 사는 남자’ 오늘(6일) 1000만 관객 돌파…개봉 31일만 [DA박스]](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3/06/133480544.1.jpg)



![장희진, 청순 미모에 그렇지 못한 몸매…애플힙까지 ‘완벽’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3/05/133474200.1.jpg)
![고현정, 과거 여권사진 셀프 디스 “젊은데 더 못생겨” [DA클립]](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3/06/133481444.1.jpg)
![‘환승연애4’ 박현지 민낯도 완벽한데 “얼굴 보고 ‘현타’” [DA클립]](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3/05/133474117.1.jpg)
![차정원, ♥하정우가 반할 만하네…원피스 입고 청순미 폭발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3/06/133476060.1.jpg)

![티아라 효민, 초밀착 바디라인 감탄만 ‘보정 필요 없어’ [DA★]](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6/03/04/133465936.1.jpg)
![‘54세’ 심은하 근황 깜짝…이렇게 변했다 [DA이슈]](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6/03/05/133467326.1.jpg)
![“미쳤나”…로버트 할리, 아내에 물 뿌렸다 ‘충격 고백’ [DA클립]](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6/03/05/133467406.1.jpg)
![트와이스 지효, ‘속옷 노출’ 파격 시스루…뒤태 더 아찔 [DA★]](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6/03/05/133471107.1.jpg)
![“애둘맘 맞아?” 홍영기, 아슬아슬 끈 비키니 입고 뽐낸 몸매 [DA★]](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6/03/05/133467346.1.jpg)
![‘천만 배우’된 박지훈, ‘왕사남’ 현장 사진 공개 [DA★]](https://dimg.donga.com/a/140/140/95/1/wps/SPORTS/IMAGE/2026/03/06/133481673.1.jpg)
![장성규도 피해자였다…“출연료 못 받아” [DA★]](https://dimg.donga.com/a/140/140/95/1/wps/SPORTS/IMAGE/2026/03/06/133479723.1.jpg)
![로제, 명품 쇼 홀린 오프숄더 자태…비현실적 어깨라인 [DA★]](https://dimg.donga.com/a/140/140/95/1/wps/SPORTS/IMAGE/2026/03/06/133478230.1.jpg)
![차정원, ♥하정우가 반할 만하네…원피스 입고 청순미 폭발 [DA★]](https://dimg.donga.com/a/140/140/95/1/wps/SPORTS/IMAGE/2026/03/06/133476060.1.jpg)

![‘오타니 만루포 포함 3안타 5타점+야마모토 2.2이닝 무실점’ 일본, 대만에 13-0 7회 콜드승 [WBC]](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6/03/06/133481692.1.jpg)

![오타니, 만루홈런으로 존재감 대폭발…일본의 대회 첫 안타, 타점, 홈런 모두 책임졌다 [WBC]](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6/03/06/133480663.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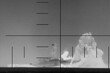



![장예원 주식 대박 터졌다, 수익률 무려 323.53% [DA★]](https://dimg.donga.com/a/110/73/95/1/wps/SPORTS/IMAGE/2023/12/01/122442320.1.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