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초. 두산 스카우트 이복근 차장은 잠실구장 대신 서울 장충고에 출근 도장을 찍었다.
몇 년 전부터 눈여겨봐둔 투수가 고 3이 된 해였다. 마침 장충고 유영준 감독은 이 차장의 학창시절 선배. 안부 인사를 빌미로 1주일에 일곱 번을 찾아갔다. 훈련 때 배팅볼 투수를 자청하기도 했다. 급기야 매일 밤 현관문을 두드리는 이 차장을 향해 유 감독은 지친 듯 말했다. “내가 두산 가라고 설득할 테니 이젠 제발 그만 와라.”
○프롤로그…일찌감치 점찍어둔 대형 신인투수
두산 이용찬(20)은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다. “경기 때는 물론이고, 전지훈련까지 따라오셨다. 허리가 아파서 아무 것도 안하고 빈둥거릴 때도 늘 곁에 계셨다.” 훈련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밥을 사먹였고, 가끔은 화곡동 집까지 데려다주기도 했단다.
이용찬의 아버지 이보선 씨에게 끊임없이 안부 전화를 건 것은 물론. 그렇게 공들일 만한 가치가 있는 선수라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사실 돈을 더 많이 주는 팀으로 가려고 했다”던 이용찬도 결국 두산이 내민 계약서에 사인하고 말았다. 계약금은 4억5000만원. 함께 입단한 동기 임태훈(21)보다 3000만원 많았다. 이용찬은 그 해 장충고의 전국대회 2관왕을 이끌며 기대를 더 높였다. 스스로 “그럴 줄 알았으면 5000만원 더 받는 건데…”라고 농담할 정도로.
○첫 번째 시련…팔꿈치 통증과 수술
하지만 예기치 못한 벽에 부딪쳤다. 2007년 첫 전지훈련을 떠나기도 전에 팔꿈치 통증이 찾아왔다. 고 1 때부터 벌어져있던 뼈가 문제였다. 김태룡 운영홍보이사가 직접 이용찬을 일본에 데리고 다니면서 치료 방법을 찾았다.
“공을 안 던지면 붙었다가 던지면 다시 떨어지기를 반복했다. 그러다 뼈가 석화됐다. 구단에서는 끝까지 기다려보자고 했지만 결국 골반뼈를 떼어내 팔꿈치에 나사로 이어붙이는 수술을 해야 했다.” 얼굴이 저절로 찌푸려진다.
그래도 마음의 고통이 더 심했다. 공을 던질 수 없으니 2군에서도 허송세월. 그 사이 임태훈은 신인왕을 향해 질주했다. “솔직히 답답하고 부럽고 짜증났다. 그래서 야구를 하나도 안 봤다. 특히 우리 팀 경기는 보기도 싫었다.” 그는 결국 이듬해 4월 말에야 1군 마운드에 섰다.
○두 번째 시련…어깨 통증과 재활
2008년 5월7일 목동구장. 4이닝을 던졌다. 처음이었다. 세 번째 이닝을 끝내고 나니 왠지 어깨가 찜찜했다. 그래도 못 던지겠다고 말하긴 싫어 한 번 더 올라갔다. 그 결과는 이랬다. “집에 가는데 어깨가 아파서 팔이 머리 위로 안 올라가더라. 14.2이닝만 던지고 다시 2군으로 가야 했다. 다시 올라온 건 결국 9월에 엔트리가 확대될 때였다.”
기대가 컸던 김경문 감독은 “참 아까운 놈이야”라며 안타까워했다. 이용찬도 시즌을 포기하려고 했다. “수술 후 정말 열심히 재활했다고 생각했는데 또 아프니까 너무 허탈했다. 두 번째는 의욕도 없었다.” 하지만 덕분에 “야구를 오래하려면 몸관리를 잘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 수확이라면 수확이다.
○첫 번째 도전…포스트시즌 마무리 시험대
정규시즌 최종전이 열리던 10월 광주구장. 이용찬은 휴게실에서 김 감독과 마주쳤다. “너 내년에 마무리 한 번 해볼래?” 얼떨결에 튀어나온 대답. “네. 시켜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플레이오프 하루 전. 윤석환 투수코치가 불렀다. “너 마무리 해야겠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 내일부터다.”
포스트시즌 마무리투수. 생각지도 못한 중책이었다. “위축될 것 없다”는 격려만 믿고 자신 있게 마운드에 올랐지만 결과도 좋지 않았다. 다들 이용찬의 트라우마를 우려했다. 그런데 정작 그는 “잘 던지면 좋지만 못 던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냥 다음 시즌에 더 잘 해야지 하고 잊었다”고 말했다. 천상 마무리 감이다. 김 감독이 왜 그를 점찍었는지 알고도 남겠다.
○두 번째 도전…정규시즌 마무리로 도약
그렇게 이용찬은 두산의 마무리 투수가 됐다. 12일 잠실 LG전. 4-3으로 한 점 앞선 9회말. 무사 1루 위기를 병살타로 넘겼고, 마지막 타자를 3구삼진으로 솎아냈다. 세 번째 세이브. 롯데 애킨스와 나란히 구원 공동 1위다. 10일 LG 페타지니에게 역전 끝내기 만루포를 얻어맞은 충격은 그 날로 털어버렸다. 이제는 “경기를 내 손으로 끝낼 수 있다는 게 마무리의 매력”이라며 당당하게 웃을 뿐이다.
거창한 목표도 없다. 그저 “하나씩 차근차근 내게 주어진 상황을 처리하다 보면 좋은 성적도 따라올 것 같다”고 했다. 패기와 의욕이 지나쳐서 문제였던 ‘다혈질’ 이용찬은 두 번의 시련을 거치면서 인내하고 절제하는 법을 배웠다. 이제 남은 건 건강한 자신감이다. “지금껏 한 번도 승부를 피해본 적이 없다. 아버지에게서 어릴 때부터 ‘남자라면 그래야 한다’고 배웠다. 칠 테면 쳐보라는 마음으로 던질 거다.”
○에필로그…이제 시작되는 이야기
두산은 이용찬의 입단을 기다리며 등번호 11번을 비워뒀다.
투수를 상징하는 1자가 나란히 붙어있는 11번. 팀의 에이스로 성장해주길 바라는 정성이자 기대였다. 하지만 이용찬은 “사실 11번보다 45번을 달고 싶었다”고 털어놨다. 45번이 박힌 유니폼을 입고 마운드에서 위용을 떨쳤던 고교 시절이 생각났기 때문이다.
올해 그는 그토록 바라던 45번의 주인이 됐다. 두산의 45번 마무리 투수 이용찬. 그가 써내려갈 성공 스토리가 이제야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다.
잠실|배영은 기자 yeb@donga.com
Copyright © 스포츠동아.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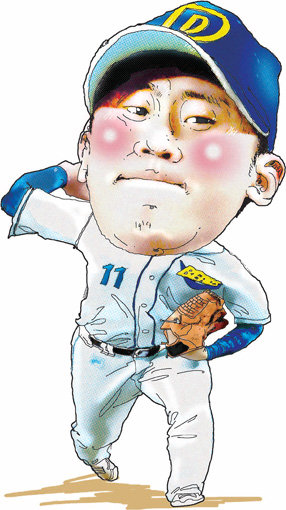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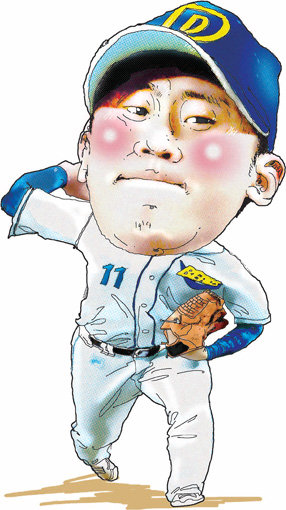
 김강우 첫승 “연기대상 신인상보다 10배 기뻐” (편스토랑)
김강우 첫승 “연기대상 신인상보다 10배 기뻐” (편스토랑) 이재룡 또 음주 사고로 경찰 조사…‘술 예능’ 짠한형 향한 시선도 싸늘
이재룡 또 음주 사고로 경찰 조사…‘술 예능’ 짠한형 향한 시선도 싸늘 FIVE O ONE, 오늘 신보 ‘Set It Off’ 발매
FIVE O ONE, 오늘 신보 ‘Set It Off’ 발매 ‘싱어게인4’ 이지민, 싸이월드 감성 러브송 발매
‘싱어게인4’ 이지민, 싸이월드 감성 러브송 발매  한가인X전지현, 키즈카페서 깜짝 만남…“둘째 아들, 엄마랑 똑 닮아”
한가인X전지현, 키즈카페서 깜짝 만남…“둘째 아들, 엄마랑 똑 닮아”![차정원, ♥하정우가 반할 만하네…원피스 입고 청순미 폭발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3/06/133476060.1.jpg) 차정원, ♥하정우가 반할 만하네…원피스 입고 청순미 폭발 [DA★]
차정원, ♥하정우가 반할 만하네…원피스 입고 청순미 폭발 [DA★]![‘환승연애4’ 박현지 민낯도 완벽한데 “얼굴 보고 ‘현타’” [DA클립]](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3/05/133474117.1.jpg) ‘환승연애4’ 박현지 민낯도 완벽한데 “얼굴 보고 ‘현타’” [DA클립]
‘환승연애4’ 박현지 민낯도 완벽한데 “얼굴 보고 ‘현타’” [DA클립] 양준혁 장인 눈물 “내가 60년생인데, 사위가 69년생” (사당귀)
양준혁 장인 눈물 “내가 60년생인데, 사위가 69년생” (사당귀) 표예진 예능 찰떡일세, 전현무·곽준빈 쥐락펴락 (전현무계획3)
표예진 예능 찰떡일세, 전현무·곽준빈 쥐락펴락 (전현무계획3) 아내 냄새 맡던 남편, 결국 살인…김선영 분노 “인간도 아냐” (용형사)
아내 냄새 맡던 남편, 결국 살인…김선영 분노 “인간도 아냐” (용형사) 비주얼 파티? 24기 순자 호들갑 “큰일나, 난 직진밖에 몰라” (나솔사계)
비주얼 파티? 24기 순자 호들갑 “큰일나, 난 직진밖에 몰라” (나솔사계) 이주승, 코르티스 주훈 들먹…“막방?” 기안84·코쿤 ‘나락 감지’ (나혼산)
이주승, 코르티스 주훈 들먹…“막방?” 기안84·코쿤 ‘나락 감지’ (나혼산) 한지민 극한 맞선…그냥 ‘나는 솔로’ 나가지 그랬어 (미혼남녀의 효율적 만남)
한지민 극한 맞선…그냥 ‘나는 솔로’ 나가지 그랬어 (미혼남녀의 효율적 만남)![로제, 명품 쇼 홀린 오프숄더 자태…비현실적 어깨라인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3/06/133478230.1.jpg) 로제, 명품 쇼 홀린 오프숄더 자태…비현실적 어깨라인 [DA★]
로제, 명품 쇼 홀린 오프숄더 자태…비현실적 어깨라인 [DA★]![장희진, 청순 미모에 그렇지 못한 몸매…애플힙까지 ‘완벽’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3/05/133474200.1.jpg) 장희진, 청순 미모에 그렇지 못한 몸매…애플힙까지 ‘완벽’ [DA★]
장희진, 청순 미모에 그렇지 못한 몸매…애플힙까지 ‘완벽’ [DA★] 이재룡, 삼성중앙역 인근 음주 사고 뒤 현장 이탈…경찰 조사 중
이재룡, 삼성중앙역 인근 음주 사고 뒤 현장 이탈…경찰 조사 중![김연경 “이상형=일편단심 조인성♥, 몇 번 만나” 어머 세상에 [DA클립]](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3/05/133474072.1.jpg) 김연경 “이상형=일편단심 조인성♥, 몇 번 만나” 어머 세상에 [DA클립]
김연경 “이상형=일편단심 조인성♥, 몇 번 만나” 어머 세상에 [DA클립]![‘무빙’ 제친 ‘운명전쟁49’…‘K-샤먼’ 글로벌 통했다 [OOTD]](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3/07/133481766.3.jpg) ‘무빙’ 제친 ‘운명전쟁49’…‘K-샤먼’ 글로벌 통했다 [OOTD]
‘무빙’ 제친 ‘운명전쟁49’…‘K-샤먼’ 글로벌 통했다 [OOTD]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