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저리그의 투수가 되려면 불같은 강속구를 지녀야 한다. 스카우트들도 시속 150km 이상의 빠른 볼에 관심을 갖는다. 타자 역시 빠른 볼을 치지 못하면 메이저리그에 올라갈 수가 없다. 변화구는 두 번째 요소다.
PGA 투어에 입문하려면 드라이버 샷 비거리가 300야드 이상은 기본이어야 한다. 국내에서는 드라이버를 300야드 이상 때리는 게 뉴스가 되지만 PGA에서는 당연하다. 메이저리그 투수가 빠른 볼이 기본인 것과 같다.
드라이버 샷을 기본적으로 300야드 이상 날리지 못하면 언더파 스코어를 낼 수 없는 곳이 PGA 무대다. 드라이버의 거리가 길다고 할 수 없는 케빈 나(한국명 나상욱)는 LA에 사는 지인을 만날 때마다 “아저씨, PGA 그린은 장난 아니에요. 시멘트 바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라며 PGA의 험난함을 곧잘 그린에 비교한다. 케빈 나는 아이언 샷이 탁월하다.
PGA 투어는 갈수록 전장이 길어진다.
마스터스를 비롯해 메이저대회는 해마다 전장을 늘린다. 양용은이 우승한 올 PGA 챔피언십도 역대 대회 가운데 가장 전장(7678야드)이 길었다. 전장이 이처럼 길어지는 이유는 타이거 우즈 때문이라는 게 정설이다.
하지만 꼭 우즈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다. 장비와 공도 한몫하고 있다. 장비가 갈수록 현대화되면서 때리기 쉽고 멀리 나가는 클럽이 날마다 개발되고 있다. 공 역시 첨단 과학화로 더 멀리 나가고 있다.
드라이버 샷의 거리가 길지 않을 경우 아이언 샷으로 그린에 의도한대로 볼을 세울 수 없다. 볼을 세우려면 미들 아이언 이하의 클럽이어야만 가능하다. 롱 아이언으로는 어렵다.
프로들의 샷은 매우 정교하다. 경기 전 연습 라운드를 통해 캐디와 함께 그린을 파악한다. 실전에 들어가면 핀을 중심으로 그린을 4등분해서 공략한다. 프로들은 거리도 1야드씩으로 자른다.
아이언 샷으로 볼을 세우지 못할 경우 버디 퍼트가 어려워진다.
메이저대회라면 모를까 이븐파로는 우승이 불가능하다.
아마추어들의 꿈이 드라이버 샷 비거리 평균 240야드라면 프로들은 300야드 이상을 정확하게 페어웨이에 떨어뜨려야 한다. 예전 ‘스포츠에서 가장 어려운 시도’는 시속 150km 이상의 강속구를 때리는 것과 골프공을 똑바로 날리는 것이라는 조사도 있었다.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는 의미다.
사실 PGA 선수들은 전력을 다해서 드라이버를 날리지는 않는다. 페어웨이 적중률이 떨어져서다. 올해 50살이 된 프레드 커플스는 지금도 드라이버로 340야드 정도를 너끈히 때린다. 그것도 부드럽게 친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때리는 선수가 우즈다. 힘이 잔뜩 들어가는 가격은 페어웨이 적중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흥미로운 점은 드라이버의 거리가 짧은 선수는 쇼트게임이 매우 능하다는 점이다. 요즘 PGA 시니어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프레드 펑크는 LG 스킨스게임 때 드라이버의 거리가 안니카 소렌스탐 보다 짧아 치마를 입고 갤러리를 웃긴 적이 있다. 펑크의 쇼트게임은 환상적이다.
야구에서 보통 빠른 볼 투수가 제구력이 좋지 않다. 피네스 피처들은 제구력이 절묘하다. 신은 인간에게 완벽함을 주지 않았다. 예외가 바로 타이거 우즈다. 드라이버의 비거리는 타고 나지만 쇼트게임은 노력으로 극복이 가능하다.
LA | 문상열 통신원
PGA 투어에 입문하려면 드라이버 샷 비거리가 300야드 이상은 기본이어야 한다. 국내에서는 드라이버를 300야드 이상 때리는 게 뉴스가 되지만 PGA에서는 당연하다. 메이저리그 투수가 빠른 볼이 기본인 것과 같다.
드라이버 샷을 기본적으로 300야드 이상 날리지 못하면 언더파 스코어를 낼 수 없는 곳이 PGA 무대다. 드라이버의 거리가 길다고 할 수 없는 케빈 나(한국명 나상욱)는 LA에 사는 지인을 만날 때마다 “아저씨, PGA 그린은 장난 아니에요. 시멘트 바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라며 PGA의 험난함을 곧잘 그린에 비교한다. 케빈 나는 아이언 샷이 탁월하다.
PGA 투어는 갈수록 전장이 길어진다.
마스터스를 비롯해 메이저대회는 해마다 전장을 늘린다. 양용은이 우승한 올 PGA 챔피언십도 역대 대회 가운데 가장 전장(7678야드)이 길었다. 전장이 이처럼 길어지는 이유는 타이거 우즈 때문이라는 게 정설이다.
하지만 꼭 우즈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다. 장비와 공도 한몫하고 있다. 장비가 갈수록 현대화되면서 때리기 쉽고 멀리 나가는 클럽이 날마다 개발되고 있다. 공 역시 첨단 과학화로 더 멀리 나가고 있다.
드라이버 샷의 거리가 길지 않을 경우 아이언 샷으로 그린에 의도한대로 볼을 세울 수 없다. 볼을 세우려면 미들 아이언 이하의 클럽이어야만 가능하다. 롱 아이언으로는 어렵다.
프로들의 샷은 매우 정교하다. 경기 전 연습 라운드를 통해 캐디와 함께 그린을 파악한다. 실전에 들어가면 핀을 중심으로 그린을 4등분해서 공략한다. 프로들은 거리도 1야드씩으로 자른다.
아이언 샷으로 볼을 세우지 못할 경우 버디 퍼트가 어려워진다.
메이저대회라면 모를까 이븐파로는 우승이 불가능하다.
아마추어들의 꿈이 드라이버 샷 비거리 평균 240야드라면 프로들은 300야드 이상을 정확하게 페어웨이에 떨어뜨려야 한다. 예전 ‘스포츠에서 가장 어려운 시도’는 시속 150km 이상의 강속구를 때리는 것과 골프공을 똑바로 날리는 것이라는 조사도 있었다.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는 의미다.
사실 PGA 선수들은 전력을 다해서 드라이버를 날리지는 않는다. 페어웨이 적중률이 떨어져서다. 올해 50살이 된 프레드 커플스는 지금도 드라이버로 340야드 정도를 너끈히 때린다. 그것도 부드럽게 친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때리는 선수가 우즈다. 힘이 잔뜩 들어가는 가격은 페어웨이 적중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흥미로운 점은 드라이버의 거리가 짧은 선수는 쇼트게임이 매우 능하다는 점이다. 요즘 PGA 시니어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프레드 펑크는 LG 스킨스게임 때 드라이버의 거리가 안니카 소렌스탐 보다 짧아 치마를 입고 갤러리를 웃긴 적이 있다. 펑크의 쇼트게임은 환상적이다.
야구에서 보통 빠른 볼 투수가 제구력이 좋지 않다. 피네스 피처들은 제구력이 절묘하다. 신은 인간에게 완벽함을 주지 않았다. 예외가 바로 타이거 우즈다. 드라이버의 비거리는 타고 나지만 쇼트게임은 노력으로 극복이 가능하다.
LA | 문상열 통신원
Copyright © 스포츠동아.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하기



![소유, 20kg 감량 후 성형 논란…주사 맞다 사투 벌이기도 [DA클립]](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2/28/133440658.1.jpg)







![남지현, 무보정 뱃살 공개…남다른 몸매에 감탄만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2/28/133440694.1.jpg)

![“속옷만 바꿔도…” 진재영, 곧 쉰 안 믿기는 바디라인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2/28/133440853.1.jpg)

![이채영, 화끈한 노브라 패션+키스마크…언니 옷 여며요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2/28/133440678.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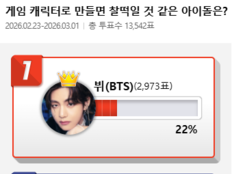

![키오프 나띠·쥴리, 뇌쇄적 눈빛+탄력 바디…‘핫걸’ 아우라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2/28/133440719.1.jpg)

![이채영, 화끈한 노브라 패션+키스마크…언니 옷 여며요 [DA★]](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6/02/28/133440678.1.jpg)
![‘전신 성형설’ 데미 무어, 63세 맞아? 나이 잊게 하는 몸매 [DA★]](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6/03/01/133442401.1.jpg)
![남지현, 무보정 뱃살 공개…남다른 몸매에 감탄만 [DA★]](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6/02/28/133440694.1.jpg)
![‘44kg’ 감량했던 김신영 “돌아왔다” 입 터진 근황 [DA클립]](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6/03/01/133442467.1.jpg)
![‘태리쌤’ 김태리 노출 파격, But 참지 못한 개그캐 본능 [D★]](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6/02/27/133436175.1.jpg)
![‘전신 성형설’ 데미 무어, 63세 맞아? 나이 잊게 하는 몸매 [DA★]](https://dimg.donga.com/a/140/140/95/1/wps/SPORTS/IMAGE/2026/03/01/133442401.1.jpg)
![정태우, 원조 단종의 위엄 “‘왕사남’ 잘 보고 왔다” [DA★]](https://dimg.donga.com/a/140/140/95/1/wps/SPORTS/IMAGE/2026/03/01/133442130.1.jpg)
![‘환승연애4’ 홍지연, ‘X’ 김우진과 결별 “연예인병 감당 불가”→재결합 [DA클립]](https://dimg.donga.com/a/140/140/95/1/wps/SPORTS/IMAGE/2026/02/28/133440926.1.jpg)
![“속옷만 바꿔도…” 진재영, 곧 쉰 안 믿기는 바디라인 [DA★]](https://dimg.donga.com/a/140/140/95/1/wps/SPORTS/IMAGE/2026/02/28/133440853.1.jpg)
















![장예원 주식 대박 터졌다, 수익률 무려 323.53% [DA★]](https://dimg.donga.com/a/110/73/95/1/wps/SPORTS/IMAGE/2023/12/01/122442320.1.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