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롯데 자이언츠
#요코야마 히데오의 경찰소설 ‘64’의 이야기입니다. 임신부의 차가 할아버지를 치는 교통사고가 일어납니다. 경찰은 가해자인 임신부의 건강을 염려해 익명으로 수사 상황을 전합니다. 출입기자단은 실명을 밝히라고 강하게 요청합니다. 보도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임신부의 인권을 염려하기는 기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실명이 필요한 이유는 ‘정말 임신부가 할아버지를 친 것이 맞는가?’, 더 나아가 ‘임신부는 실존인물인가?’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경찰도, 기자들도 그들을 지탱하고 있는 세상의 원칙을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에는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입이 찢어져도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12일 사직구장에서 한화 투수 이동걸이 롯데 타자 황재균에게 ‘빈볼’을 던졌습니다. 세상은 이동걸에게 빈볼을 지시한 ‘배후’를 캐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한화는 “김성근 감독님이 ‘내가 안 했다’고 하지 않느냐”라고 말할 뿐입니다. 이것을 비겁한 은폐로 볼 수도 있겠죠. 김 감독의 묵인 내지 방조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시각이죠. 그러나 한화에는 한화의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커져버렸는데, 누군가를 지목해 ‘총알받이’로 내놓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곧 팀의 와해일 테니까요.
#사실 빈볼의 지시자를 찾으라는 이야기는 난센스입니다. 팀 전체에 그런 공감대가 있었으니까 던질 수 있는 것이죠. “(타자 몸에 안 맞는) 위협구는 전술이고, (타자 몸에 맞는) 빈볼은 범죄”라는 말도 있듯 넓게 보면 빈볼도 야구의 일부입니다.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 메이저리그의 전설적 투수 봅 깁슨은 “홈플레이트에 지나치게 붙어서면 나의 어머니라도 맞히겠다”고 말했을 정도입니다. 빈볼과 그에 따른 보복에서 선악은 없습니다.
#결국 ‘한화가 잘못했냐? 롯데가 잘못했냐?’는 시시비비가 아니라 ‘왜 이렇게 일이 커졌느냐?’가 포인트입니다. 여기에는 감독 김성근에 대한 호불호가 투영되고 있습니다. 삼성을 둘러싼 1대9 구도가 아니라 한화를 둘러싼 1대9 구도입니다. 꼴찌 팀이 공적이 된 것은 야구 역사상 유례없는 일일 터입니다. 좋든, 싫든 김 감독의 존재감이 그만큼 큽니다.
#스포츠동아 2008년 4월 21일자를 보면 당시 두산 사령탑이던 김경문 감독(현 NC 감독)은 “받은 만큼 되돌려주겠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7년 후 롯데 이종운 감독이 겪었던 것과 흡사한 갈등 속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틀 후 김 감독은 삭발을 하고 야구장에 나타났습니다. “모두가 내 탓이고 내 불찰이라 생각하면서 머리를 깎았다. 이제는 야구 감독이 야구 외적인 일에 신경을 쓰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 반성의 토대 위에서 김 감독은 4개월 후 베이징올림픽 금메달이라는 업적을 이뤘습니다. ‘편 가르기가 아니라 오직 실적으로 말하겠다’는 결심이 선 2008년 4월의 그 순간, 어쩌면 ‘영광의 베이징이 시작된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와서 듭니다.
김영준 기자 gatzby@donga.com
Copyright © 스포츠동아.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하기


![김건모, 복귀 앞두고 초췌한 근황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1/30/133266509.3.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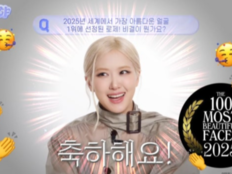


![르세라핌 시그니처…‘양적 팽창→질적 성장’[현장]](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2/01/133272880.1.jpg)
![나나, 창문에 비친 속옷 실루엣…과감한 노출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1/30/133266036.1.jpg)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손으로 겨우 가린 파격 노출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1/30/133264572.3.jpg)



![보아 ‘25년 동행’ SM 떠난 근황…“잘 지내고 있어요”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1/30/133265326.1.jpg)
![몬스타엑스 체조 찢었다…근본의 셋리로 새 월투 시작 ft.아이엠 삭발 (종합)[DA:리뷰]](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2/01/133275581.1.jpg)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손으로 겨우 가린 파격 노출 [DA★]](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6/01/30/133264572.3.jpg)
![나나, 창문에 비친 속옷 실루엣…과감한 노출 [DA★]](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6/01/30/133266036.1.jpg)

![트와이스 지효, 역대급 여신 비주얼 속옷 화보 [화보]](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6/01/30/133263239.1.jpg)


![‘하시4’ 김지민, 김지영 신부 입장에 끝내 오열…“너무 예쁘고 기뻐서” [SD셀픽]](https://dimg.donga.com/a/140/140/95/1/wps/SPORTS/IMAGE/2026/02/01/133276390.1.png)

![김건모, 복귀 앞두고 초췌한 근황 [DA★]](https://dimg.donga.com/a/140/140/95/1/wps/SPORTS/IMAGE/2026/01/30/133266509.3.jpg)



![“스스로 만족할 때까지” 펑고 한 번 더 받는 KT 허경민, 자신 향한 엄격한 잣대 [SD 질롱 인터뷰]](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6/02/01/133272808.1.jpg)












![장예원 주식 대박 터졌다, 수익률 무려 323.53% [DA★]](https://dimg.donga.com/a/110/73/95/1/wps/SPORTS/IMAGE/2023/12/01/122442320.1.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