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줄거리 - 와인을 잘 몰라 스트레스를 받던 정유진은 소믈리에로 일하는 고교 동창 김은정에게 연락해 매주 한 차례 과외를 받기로 한다. 정유진은 돔 페리뇽 수사가 코르크 마개를 발명해 지금처럼 샴페인을 마시고, 백년전쟁의 원인 속에 와인이 있고, 샤블리는 토양이 중생대 바다여서 굴과 잘 어울린다는 사실을 차례로 배운다.
열두 번째 와인 과외날. 여느 때처럼 김은정이 먼저 자리 잡고 있다. 오늘은 김은정 앞에 놓인 와인병이 특이하다. 검정색 병에 흰색 라벨, 그리고 라벨에 적힌 검은 글씨. 뭔가 아방가르드한 느낌이다. ‘이스까이(ISCAY)’라고 큼지막하게 적힌 글씨 아래로 작은 글씨가 빼곡하다. 웬 라벨에 글이 이렇게 많지?
“어서 와. 이건 아르헨티나에 사는 친구가 선물로 보내 준 와인인데, 너랑 마시고 싶어서 아껴둔 거야. 일단 맛을 먼저 볼래.”
바이올렛 톤의 짙은 적색 액체가 잔을 채운다. 잔을 몇 차례 돌리니 향이 근사하다. 이건 뭐지. 맞아, 초콜릿 향이다. 또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기억해내기 쉽지 않다. 맛을 본다. 떫은맛과 부드러움의 조화가 절묘하다. 와인을 마시다 보니 좋은 와인이란 감이 온다.
“어때? 난 이걸 마시면 항상 기분이 좋아지는데. 짙은 송로향의 흙내와 초콜릿 향이 머리를 먼저 자극한 뒤 이어지는 벨벳처럼 부드럽게 입안을 감싸는 느낌이 정말 압도적이야. 네가 떫은맛이라고 한 건 탄닌이라는 건데, 탄닌과 부드러움이 애인처럼 포옹하고 있지.”
“야∼표현 죽인다. 탄닌과 부드러움이 포옹하고 있다고? 역시 소믈리에가 다르긴 다르구나. 그런데 이건 병이 참 특이한데? 라벨에 사인이 두 개나 들어가 있고.”
“그치? 이걸 만든 사람이 두 명이라서 그래. 근데 그 두 사람이 범상한 인물이 아니거든. ‘플라잉 와인메이커’로 불리는 세계적인 와인 메이커 미셸 롤랑과 다니엘 피, 두 사람으로 각각 와인에 대한 테이스팅 노트와 서명을 라벨에 담았어. ‘이스까이’라는 이름도 ‘둘’이란 뜻의 잉카어에서 유래했는데, 바로 두 명의 와인메이커가 공동으로 만든 것을 의미하지. 밑에 메를로와 말벡이라고 적힌 것도 두 가지 품종을 반반 섞어 만든 것을 표시하고.”
“이거 숫자 ‘2’로 이해할 수 있는 와인인데?”
“그렇게 볼 수도 있지. 2가 출발한 이유도 재미있어. 이 와인은 ‘트라피체’라는 아르헨티나 회사에서 나오는데, 이 회사는 프랑스에 버금가는 와인을 만들려고 포도나무를 직접 프랑스에서 들여오고, 정통 프랑스 양조 기법을 사용하다가, 급기야 프랑스 출신 미셸 롤랑까지 불러 들여 이스까이를 만든거지. 프랑스와 아르헨티나가 만난 와인이라고 할까.”
“그런데 여기 사인은 미셸 롤랑이 아닌 것 같은데?”
“그건 2005년 빈티지부터 미셸 롤랑이 빠지고, 아르헨티나 사람인 마르셀로 벨몬테가 들어와서 그래. 아르헨티나 본연의 떼루아를 더욱 잘 반영하기 위한 일종의 변신이라고 보면 되겠지.”
이길상 기자 juna109@donga.com
한국국제소믈리에협회 KISA 정회원
Copyright © 스포츠동아.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육상계 카리나’ 김민지, 성형설 입 열었다 “저도 이렇게 예뻐질 줄…” [DA클립]](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3/03/133454063.1.jpg)

![샤라포바, 이탈리아서 뽐낸 수영복 자태…몸매 여전해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3/03/133452477.1.jpg)








![‘솔로지옥5’ 우성민, 본격 활동 나선다…빅프렌즈와 전속계약 [공식]](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3/04/133460742.1.jpg)

![랄랄 또 성형…심각하게 부은 얼굴에 ‘딸도 기겁’ [DA클립]](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3/03/133457659.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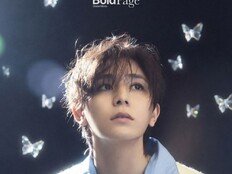
![에스파 윈터, 슬립 차림 고혹적 분위기…색다른 느낌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3/03/133456570.1.jpg)
![문가영, 어깨라인 드러낸 오프숄더…청초 비주얼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3/03/133452786.1.jpg)


![샤라포바, 이탈리아서 뽐낸 수영복 자태…몸매 여전해 [DA★]](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6/03/03/133452477.1.jpg)
![문가영, 어깨라인 드러낸 오프숄더…청초 비주얼 [DA★]](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6/03/03/133452786.1.jpg)

![이채영, 화끈한 노브라 패션+키스마크…언니 옷 여며요 [DA★]](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6/02/28/133440678.1.jpg)
![‘44kg’ 감량했던 김신영 “돌아왔다” 입 터진 근황 [DA클립]](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6/03/01/133442467.1.jpg)
![남지현 촬영장 현실 폭로…“감독님이 ‘못생긴 X’ 이라 불러” [DA클립]](https://dimg.donga.com/a/140/140/95/1/wps/SPORTS/IMAGE/2026/03/04/133460337.1.png)
![씨스타 다솜, 복근 말도 안 돼…청순미 벗어던지고 과감 [DA★]](https://dimg.donga.com/a/140/140/95/1/wps/SPORTS/IMAGE/2026/03/03/133458373.1.jpg)
![고아성, 해외 이동 중 폭설에 위급상황 “차 미끄러져 패닉” [DA클립]](https://dimg.donga.com/a/140/140/95/1/wps/SPORTS/IMAGE/2026/03/03/133458063.1.jpg)
![‘환승연애4’ 백현, 전 여친 박현지 X룸 생수의 진실 [DA클립]](https://dimg.donga.com/a/140/140/95/1/wps/SPORTS/IMAGE/2026/03/03/133457729.1.jpg)
![캐나다 行 ‘이휘재♥’ 문정원, 4년 만 근황…“어느새 3월” [DA이슈]](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6/03/04/133459538.1.jpg)

![에스파 윈터, 슬립 차림 고혹적 분위기…색다른 느낌 [DA★]](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6/03/03/133456570.1.jpg)














![장예원 주식 대박 터졌다, 수익률 무려 323.53% [DA★]](https://dimg.donga.com/a/110/73/95/1/wps/SPORTS/IMAGE/2023/12/01/122442320.1.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