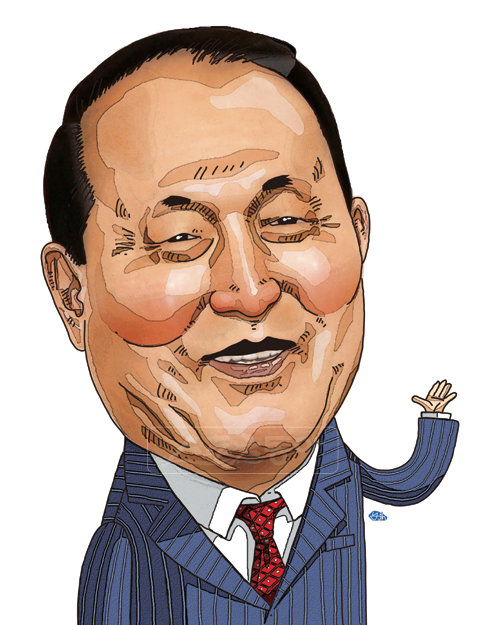
한국스포츠 리더십 대해부] ‘김인식 리더십’ 믿어라 기다려라!
김인식의 ‘신뢰 리더십’그에게 물었다. ‘도대체 김인식 리더십이란 무엇이냐’고.
헛웃음과 함께 특유의 느릿느릿한 말투로 답이 돌아왔다. “내가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냥 운이 좋았고, 옆에서 보기 좋게 만들어준 것 뿐이지.” 재차 물었다. 한번 시원하게 얘기해 보자고. 이제껏 그의 리더십을 다룬 책도 여러권 나왔고, 각종 언론에서 숱한 찬사를 받은 그의 리더십을 ‘김인식의 목소리’로 확인하고 싶어서였다. “내 입으로 무슨 말을 해, 낯 뜨겁게 말이야”라며 한사코 손사래를 치던 그는 거듭된 부탁에 꼬박 만 이틀이 지나서야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럼 리더십이라 거창하게 부르지 말고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얘기해 보자고. 그런데 이거 영 쑥스럽고 머리 아파.”
김인식(63) 한국야구위원회(KBO) 기술위원장 겸 한화 이글스 고문. 그는 한국 스포츠를 대표하는 명지도자이자, 한국에서 스포츠 지도자의 리더십이 사회적으로 각광받게 한 주인공이기도 하다. 그가 고심 끝에 진솔하게 털어놓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을 재구성 한다. 그의 얘기가 끝났을 때, ‘평범함 속에 진리가 있다’는 말이 떠오르면서 이게 바로 ‘김인식 리더십’이란 생각이 들었다.
소질있는 선수 알아보는 눈·꾸준한 소통
그렇게 믿음 생기면 이젠 기다리는거지
노장과 막내 조화 이루면 팀워크는 자동
김인식이 믿는 것? ‘진리는 평범함 속에’
○ 믿음
특별히 일부러 염두에 두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선수들과 많은 시간 함께 보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 것이 바로 믿음, 서로간의 신뢰다. 누구나 다 느끼고 공감하는 얘기일 것이다.
어느 순간 이 선수에겐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을 때가 있고, 그걸 선수들이 잘 받아주고 이해해주면 고마울 뿐이다. 어떨 땐 자연스레 눈빛만 보고도 이 친구가 내 뜻을 알아주는구나 할 때가 있다. 이런 것이 바로 믿음일 것이다. 서로 믿고 신뢰하기 위해선 대화와 소통이 밑바탕이 돼야 한다.
○ 공감
월드베이스볼클래식(2006년 세계 4강·2009년 준우승)을 앞두고 선수들이 처음 모였을 때. 두 번 모두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우리 처지가 그러니까 잘 해보자”고 한 게 다인 것 같다. 굳이 나라를 위해 희생하자고, 어떻게 하자고 내 의견을 내세우지도 않았다. 선수들이 나 못지 않게 다 느끼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 게 아마 선수들 스스로 뭉치게 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다.
○ 날카로운 눈과 기다림
쌍방울 감독 시절 얘기다. 김원형이나 김기태, 박경완 등은 입단 당시 그렇게 큰 선수들이 아니었다. 그러나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OB 감독 시절에 만난 심정수나 정수근, 박명환 등도 꾸준히 기용하다보니까 실력이 늘었다. 훗날 일본에서 홈런왕까지 오른 용병 우즈도 마찬가지였다. 처음엔 정말 별 볼일 없는 선수였다.
하지만 가능성이 보였기에 기다렸다. 기회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 분야는 다를지라도, 조직의 지도자는 남과 다른 눈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 중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사람을 보는 눈이다. 그리고 신뢰를 바탕으로 기다릴 줄 아는 것이 중요하다.
○ 공부
OB 감독으로 부임하기 전인 1993년 쯤 일이다. 일주일에 한번씩 난생처음으로 칼럼을 기고하게 됐는데, 처음 몇 주간은 소화가 안 될 정도로 쓰기가 정말 어려웠다. 하지만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요령이 생겼다. 실력이 아닌 요령 말이다. 마찬가지다. 고민하고 공부하면 모든 건 달라진다. (그는 현역 감독 시절에도 구단 통역에 번역을 부탁, 외국의 최신 월간야구잡지를 탐독하기도 했다. 누구보다 최신 이론이나 흐름을 놓치지 않으려고 공부했다. 이를 끄집어내자 ‘그냥 심심해서 한 거지’라고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 조화와 팀워크
조직이란 노장도, 중간도, 밑도 필요하다. 노장만 있어서도, 젊은층만 있어서도 안 된다. 일종의 대중소가 조화를 이뤄야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돌아간다.
끊임없이 새 피가 공급돼야 함은 물론이고, 노장에겐 노장 나름대로의 역할을 주고 힘을 줄 필요도 있다고 본다. 이런 과정을 통해 조직의 조화를 꾀할 수 있다. 조직이 조화롭게 구성돼야 자연스럽게 팀워크가 생긴다.
정리|김도헌 기자 dohoney@donga.com
Copyright © 스포츠동아.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하기







![이채영, 화끈한 노브라 패션+키스마크…언니 옷 여며요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2/28/133440678.1.jpg)



![남지현, 무보정 뱃살 공개…남다른 몸매에 감탄만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2/28/133440694.1.jpg)



![카리나, 도넛 산처럼 쌓아두고 먹었는데…끈나시 핏 실화?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2/27/133439893.1.jpg)
![손나은, 주근깨 찍고 서클렌즈까지…청순 벗고 파격 변신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2/27/133439764.1.jpg)
![소유, 20kg 감량 후 성형 논란…주사 맞다 사투 벌이기도 [DA클립]](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2/28/133440658.1.jpg)


![전소미, 팬티만 입은 줄…과감한 숏팬츠 ‘각선미 대박’ [DA★]](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6/02/26/133430024.1.jpg)
![‘태리쌤’ 김태리 노출 파격, But 참지 못한 개그캐 본능 [D★]](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6/02/27/133436175.1.jpg)



![“속옷만 바꿔도…” 진재영, 곧 쉰 안 믿기는 바디라인 [DA★]](https://dimg.donga.com/a/140/140/95/1/wps/SPORTS/IMAGE/2026/02/28/133440853.1.jpg)
![키오프 나띠·쥴리, 뇌쇄적 눈빛+탄력 바디…‘핫걸’ 아우라 [DA★]](https://dimg.donga.com/a/140/140/95/1/wps/SPORTS/IMAGE/2026/02/28/133440719.1.jpg)
![남지현, 무보정 뱃살 공개…남다른 몸매에 감탄만 [DA★]](https://dimg.donga.com/a/140/140/95/1/wps/SPORTS/IMAGE/2026/02/28/133440694.1.jpg)
![이채영, 화끈한 노브라 패션+키스마크…언니 옷 여며요 [DA★]](https://dimg.donga.com/a/140/140/95/1/wps/SPORTS/IMAGE/2026/02/28/133440678.1.jpg)



![[SD 인천 라이브] 황당한 주심 교체! ‘시즌 1호 교체’ 기록한 K-심판…‘시즌 1호 퇴장’에도 ‘경인더비’서 웃은 서울](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6/02/28/133440986.1.jpg)














![장예원 주식 대박 터졌다, 수익률 무려 323.53% [DA★]](https://dimg.donga.com/a/110/73/95/1/wps/SPORTS/IMAGE/2023/12/01/122442320.1.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