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구항은 대게의 고장 답게 게요리 식당들의 간판이 거대한 대게 모형이다. 한창 제철이어서 수족관마다 대게가 풍성하게 넘쳐났다. 해가 저문 뒤 허선장의 지인들이 보내온 삶은 대게들이 도착해 파티가 벌어졌다. 막 삶아 뜨
거운 대게는 별미 중의 별미였다.
3월 5일, 10차 항해를 위해 다시 찾은 경북 포항시 장기면 양포항은 더 없이 평화로웠다. 항구 주변의 매화가 꽃망울을 틔웠고 봄볕이 내리는 바다는 강물처럼 부드럽게 일렁였다.
하지만 봄은 계절의 과도기인 탓에 날씨 변화가 극심한 시기다. 이즈음 바다는 하루에도 몇 번 씩 얼굴을 바꾼다. 이렇게 얌전한 바다가 10차 항해를 나흘 앞둔 1일에는 집단가출호에 작은 시련을 안겨줬다.
그날 밤 양포항에 갑자기 6m의 파고를 기록한 강풍이 불었다. 파도는 방파제를 넘을 정도였고 커다란 너울을 일으켜 부잔교에 묶인 주인 없는 배(집단가출호)를 마구잡이로 뒤흔들었던 모양이다.

허영만 항해일지
양포항은 서울에서 가장 먼 도시인 포항에서도 다시 꼬불꼬불 지방도로로 한 시간 가까이 더 가야하는 거리여서 속수무책이었다. 결국 양포 출장소의 해경들과 현지 요티(요트타는 사람) 김상진씨(인하대 요트부 OB·어류양식장 운영)가 비바람 속에서 배를 보살피느라 무진 애를 썼다.
그랬던 바다가 5일 집단가출호 대원들이 양포에 도착하자 언제 그랬냐는 듯 얼굴을 바꿔 새색시처럼 다소곳해진 것이다. 물론 언제 다시 본색을 드러낼지 모르지만…. 해경에 감사 인사를 전하고 양포를 떠나 강구항을 향하는 뱃길은 콧노래가 나올 만큼 순조로웠다.
〈두둥실 두리둥실 배 떠나간다/ 물 맑은 봄바다에 배 떠나간다/ 이 배는 달 맞으러 강릉 가는 배…〉
이번 항해의 최종 목적지는 강릉이다. 노랫말과 항해 분위기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진다. 어제까지 위세를 떨치던 풍랑의 후유증으로 파도는 비교적 높았으나 바람결은 유순했고 봄날 햇살에 몸이 노곤해질 정도다. 모처럼 편안한 항해에 여유가 생긴 덕분에 스케치 노트를 꺼내들고 그림을 그리던 허영만 선장도 단잠에 빠져들었고 오후의 바다는 너무도 고요했다.
지도에 토끼 꼬리 모양으로 튀어나온 호미곶을 지나 북으로 북으로 달린 끝에 오후 4시 30분 영덕 내륙에서 흘러나오는 오십천의 하구 강구항으로 뱃머리를 들이밀었다.
강구는 동해의 겨울철 해산물 중 단연 으뜸인 대게의 고장이다. 어시장 가는 길은 음식점마다 초대형 대게 모형을 간판으로 내걸었고, 길 이름도 ‘대게거리’다. 경북요트면허시험장의 계류장에 비박캠프를 설치하고 배를 손 보고 있는 사이 이 지역에 사는 허영만 선장의 지인들이 뜨끈하게 삶은 대게를 보온 상자에 담아 잇달아 보내왔다.
대게의 특징은 맛도 맛이려니와 먹는데 별다른 도구가 필요 없다는 점이다. 맛있기로 국제적으로 소문난 일본 홋카이도 털게는 가위와 함께 살을 긁어내는 전용 도구가 있어야만 먹을 수 있으나 우리나라 대게는 껍질과 살이 잘 분리돼 가위 하나만 있으면 된다.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른다’는 말은 아마 대게를 두고 이르는 얘기일 듯하다. 별도의 간을 하지 않고 단지 떡을 찌듯 증기에 쪄냈을 뿐인데 어떻게 이런 황홀한 맛이 나는지….
밤 10시가 넘어 뒤늦게 합류한 정상욱 부선장이 대게를 보더니 배낭을 뒤져 위스키 한 병을 꺼낸다. 원래 항해를 앞두고 술을 마지지 않는 것이 집단가출호의 철칙이다. 그러나 겨울 바다의 진미 대게를 앞에 두고 이 철칙은 의미를 잃었다. 그래봤자 10명이 넘는 대원들에게 돌아간 위스키는 각자 1.5잔에 불과했지만 말이다.
밤늦게 마지막으로 일기예보를 확인하니 내일 새벽부터 20노트 이상의 비교적 센 바람이 불 것이며 내일 밤 쯤 풍랑예비특보가 발효될 예정이라고 한다.
잠자리에 들었을 때 부슬비가 내리며 바람이 스산하게 불기 시작했다. 지금 생각하면 그 부슬비가 다음날 닥칠 강력한 풍랑을 예고하는 일종의 전조였다.
이튿날 새벽 5시. 바람이 제법 강하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선실에서 무선 인터넷을 접속해 다시 한번 기상 예보를 확인했으나 바람이 좀 불 뿐 주의보나 경보는 없었다.
전날 만반의 출항 준비를 마쳤기에 집단가출호는 망설임 없이 암흑의 새벽 바다로 나아갔다. 강풍에 쫓긴 어선들이 속속 항으로 들어오고 있었으나 우리는 그들이 도망쳐온 바다를 향해 돛을 펼친 것이다. 강구항 방파제를 벗어나자마자 바람이 마치 따귀를 때리는 듯 호되게 몰아쳤다. 하지만 심각할 정도는 아니었다. 단, 동해 지역은 해안선으로부터 1.5마일까지 정치망이 촘촘히 깔려있어 그물에 걸리지 않도록 뱃머리에 2명의 전방감시조를 투입하는 등 신경을 곤두세웠다.
일기예보를 보고 이날 항해에서는 선실에서 요리를 할 상황이 못 될 것에 대비해 전날 미리 고구마와 계란을 삶아뒀을 만큼 날씨에 대한 대비는 나름대로 한 셈이었다.
그러나 집단가출호는 이날 강구항을 떠난 뒤 한반도 일주항해가 시작된 이래 지난 10개월간 겪었던 모든 시련을 합친 것보다 더한 상황에 처하고 만다.허영만 화백 항해 스케치

그러나 가장 흔히 조우하는 것은 역시 어선들이다. 바다가 생활의 터전이자 삶의 전쟁터인 어부들의 입장에서 요트를 타고 전국을 일주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비쳐질까?
집단가출호의 특이(?)한 외관과 신문, 월간지에 바람만으로 독도를 향해 가고 있는 항해 스토리가 연재되고 있는 덕분에 이젠 우리를 알아보는 어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해상에서 마주친 어선에서 어부들은 우릴 알아보고 손을 흔들어주거나 파이팅을 외치거나 때로는 감사하게도 잡은 생선을 선물로 주기도 한다.
답례로 전할만한 것이 별로 없는 우리들은 과일이나 간식거리로 감사의 마음을 표하곤 했는데 때로 배를 붙일 수 있을 경우 허영만 선장님이 사인을 해주기도 했다.
양포에서 강구로 가는 길에 낚싯배 한 척을 만났다. 겨울이라 낚시가 안되는 탓에 항해 중 회를 먹어본게 벌써 몇달 전. 장난기가 발동해 한껏 불쌍한 목소리로 <구걸>을 시도해봤다. 결과는 뻘쭘하게도 뜨악한 시선뿐이었다.
송철웅 아웃도어 칼럼니스트 cafe.naver.com/grouprunway
사진=이정식 스포츠 포토그래퍼
Copyright © 스포츠동아.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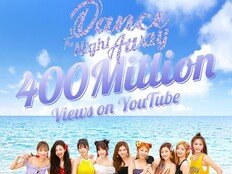


![송혜교, 파격 숏컷도 청순하게…독보적 미모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2/21/133393690.1.jpg)






![서효림, 은은한 속옷 시스루…두바이 여신 등장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2/20/133390128.1.jpg)
![헬스하는 장원영, 하의가 반전…사랑스러워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2/20/133390001.1.jpg)



![김장훈, 200억 기부→잔고 200만원…풀빌라서 “저는 부자” [SD셀픽]](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2/21/133394257.1.jpg)
![유소영, 샤워타월 흘러내릴라…아찔한 호텔 셀카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2/20/133389454.1.jpg)
![한효주, 군인 출신 父 반전 실력…“엄마만 잘하는 줄” [SD셀픽]](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2/20/133389362.1.jpg)





![전지현, 복근+레깅스 美쳤다…40대 중반 안 믿겨 [화보]](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6/02/20/133391974.1.jpg)

![유소영, 샤워타월 흘러내릴라…아찔한 호텔 셀카 [DA★]](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6/02/20/133389454.1.jpg)
![BTS 뷔, 사적 대화 털렸다…민희진 맞장구쳤다가 당황 [종합]](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6/02/20/133388567.1.jpg)

![채정안, 48세 안 믿겨…하와이 해변 홀린 탄탄 각선미 [DA★]](https://dimg.donga.com/a/140/140/95/1/wps/SPORTS/IMAGE/2026/02/21/133393738.1.jpg)
![송혜교, 파격 숏컷도 청순하게…독보적 미모 [DA★]](https://dimg.donga.com/a/140/140/95/1/wps/SPORTS/IMAGE/2026/02/21/133393690.1.jpg)

![김장훈, 200억 기부→잔고 200만원…풀빌라서 “저는 부자” [SD셀픽]](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6/02/21/133394257.1.jpg)











![장예원 주식 대박 터졌다, 수익률 무려 323.53% [DA★]](https://dimg.donga.com/a/110/73/95/1/wps/SPORTS/IMAGE/2023/12/01/122442320.1.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