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창동 감독의 영화 ‘시’.
영화 관계자들이 17일 오후 조희문 영화진흥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로 한 가운데 이창동 감독의 ‘시’를 둘러싸고 제작사와 영화진흥위원회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영화 관계자들은 기존 영진위 정책에 대한 불신과 함께 조 위원장의 독립영화 제작지원 심사 ‘외압’ 및 ‘시’에 대한 마스터영화 제작지원 심사 ‘0점’ 등 최근 벌어진 논란을 그 직접적 배경으로 밝혔다.
이에 따라 ‘시’를 둘러싼 제작사 파인하우스필름과 영진위 사이 논란의 쟁점이 또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시’를 둘러싼 양측 사이의 논란의 쟁점은 ‘시’의 ‘시나리오’가 심사 제출 요건에 맞았는지 여부, 2차 심사 과정의 적절성 여부 등이다.
● “시나리오가 아니다” VS “맞다”
‘시’의 영진위 마스터영화 제작지원 심사 탈락을 둘러싼 논란은 지난해 7월 지원 신청 접수작이었던 ‘시’에 대해 한 심사위원이 ‘0점’을 줬다는 데서 시작됐다.
더욱이 ‘시’가 칸 국제영화제에서 각본상을 수상한 만큼 영진위 심사 결과에 대한 논란은 가열됐다.
영진위의 마스터영화 제작지원 사업은 다른 지원 사업처럼 신청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 가운데 시나리오도 포함되어야 한다.
이번 논란은 영진위가 심사 당시 ‘시’ 제작진이 제출한 것은 “시나리오가 아닌 ‘트리트먼트(시나리오의 줄거리)’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제작사는 “대사까지 완벽히 만들어진 완성된 형태의 시나리오를 제출했다”면서 (‘시’의 작품적 색깔을 고려해)“이창동 감독이 문학적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장면 번호만 붙이지 않았을 뿐이다”고 밝혔다.
지원 신청 접수 이전에 이에 관한 사전 ‘양해’ 여부도 이와 관련한 또 다른 쟁점이다.
영진위는 “시나리오 형식이 아닌 경우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사전에 설명했다”면서 “제작사가 무리하게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작사는 “영진위가 인정하는(?) 관습적인 시나리오로 고치는 데 불과 한 두 시간이면 충분한 작업”을 마다한 것 역시 “완성된 형태의 시나리오”였음을 강조했다.
● “이미 제작 중이었다” VS “사전제작 지원작으로 접수”
영진위는 1차 심사에서 ‘고득점 순으로 2편을 선정’하기로 했지만 ‘시’는 2위를 차지하고도 제작지원작으로 꼽히지 못했다.
영진위는 “심사운영세칙에 해당 작품이 없을 경우 축소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면서 “2차 사업 심사 때 ‘시’는 이미 촬영 중이어서 ‘제작예정’의 조건을 갖춘 심사 대상작이 아니었지만 이를 심사에서 제외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파인하우스필름은 “제작예정이란 요건은 심사일 기준이 아니라 지난해 8월17~21일까지 진행된 접수일 기준이라는 건 상식이다”고 반박했다.
또 영진위가 “접수 시작 후 4개¤이 지나서야 심사를 한 것도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투자조합 통해 간접지원” VS “명확한 투자”
마스터영화 제작지원 심사에서 탈락한 ‘시’에 대해 영진위는 “이창동 감독의 영화 세계와 연출 역량, ‘시’의 작품성과 예술성 등을 고려해 별도의 지원 방법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영진위 지원사업 범주의 다양성영화 투자조합과 중형영상전문투자조합을 통해 간접지원했다”고 말했다.
파인하우스필름은 이에 대해 “다양성펀드는 ‘시’의 투자사 유니코리아에 3억원 등을 투자한 것”이라며 “마스터영화 제작지원처럼 조건 없는 지원이 아니라 엄연한 투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영진위 논리대로라면 펀드나 조합이 투자한 영화는 모두 영진위가 지원하는 것”이라며 “펀드나 투자 조합의 투자는 영진위 지시가 아니라 독립적인 자체 심사위를 통해 결정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영진위와 ‘시’의 제작사 파인하우스필름 사이에 일고 있는 논란은 첨예하다.
하지만 이번 논란을 바라보는 영화계의 시선은 개운치 않아 보인다.
많은 영화 관계자들은 그동안 영상미디어센터와 독립영화전용관 운영 주체 공모, 독립영화 제작지원 사업 심사에 대한 영진위 위원장의 ‘외압’ 논란 등 현 조희문 위원장 취임 이후 벌어진 숱한 갈등의 연장선상에 ‘시’를 둘러싼 논란도 자리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시’ 논란의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특정 작품을 배제하기 위해 심사위원 중에 한 분이 총대를 매고 0점을 주어 아예 선정이 안 되게 한 것이 아니냐”는 시선까지 드러내고 있다.
17일 ’영화진흥위원회 정상화를 촉구하는 영화인 일동‘의 이름으로 조희문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리는 것도 이 같은 시선과 논란이 촉발한 것임엔 틀림없어 보인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Copyright © 스포츠동아.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하기




![변요한, ♥티파니와 새해 맞이? 숟가락에 비친 ‘커플 실루엣’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1/02/133080789.3.jpg)
![‘두쫀쿠’는 좋겠다, 장원영이 이렇게 사랑해줘서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1/02/133080468.3.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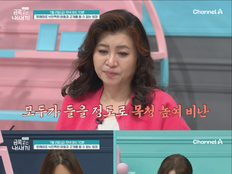


![“깜짝이야” 효민, 상의 벗은 줄…착시 의상에 시선 집중 [DA★]](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5/12/30/133061528.3.jpg)
![몸집 키운 바이포엠, 김우빈♥신민아 소속사 인수 [공식]](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5/12/31/133070547.1.png)
![대체 왜 이래? SBS 연예대상, 지석진 향한 기만의 역사 (종합)[DA:이슈]](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5/12/31/133070320.3.jpg)




![이민정, 딸과 첫 해외여행서 응급 상황…“♥이병헌이 밤새 간호” [DA★]](https://dimg.donga.com/a/140/140/95/1/wps/SPORTS/IMAGE/2026/01/02/133081053.3.jpg)
![변요한, ♥티파니와 새해 맞이? 숟가락에 비친 ‘커플 실루엣’ [DA★]](https://dimg.donga.com/a/140/140/95/1/wps/SPORTS/IMAGE/2026/01/02/133080789.3.jpg)























![김남주 초호화 대저택 민낯 “쥐·바퀴벌레와 함께 살아” [종합]](https://dimg.donga.com/a/110/73/95/1/wps/SPORTS/IMAGE/2025/05/27/131690415.1.jpg)
![이정진 “사기 등 10억↑ 날려…건대 근처 전세 살아” (신랑수업)[TV종합]](https://dimg.donga.com/a/110/73/95/1/wps/SPORTS/IMAGE/2025/05/22/131661618.1.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