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한국프로야구의 대미를 장식할 포스트시즌이 29일 두산과 롯데의 준플레이오프를 시작으로 개막된다. 야구팬들이라면 놓칠 수 없는 포스트시즌이다. 물론 경기력 측면에서 보자면 정규리그 성적이 그 팀의 전력이고 당해의 결과물이다. 포스트시즌은 보너스에 가까울지 모른다. 그럼에도 포스트시즌이 기다려지는 건 강렬하고 뇌리에 사라지지 않는 명승부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경기의 질적인 측면보다는 배수진을 친 채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승부를 보여주기에 포스트시즌은 진검승부의 느낌이 강하다. 한경기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 극도의 긴장감을 팬들에게 안겨준다.
오늘날 한국 프로야구가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진화할 수 있었던 기저에는 ‘한국형 포스트시즌’이 기여한 바가 적지 않다. 원칙적인 측면에서는 정규리그 우승팀이 최고의 팀이라는 사실이 당연하지만 양대리그가 구축되지 못한 상황에서는 현재의 시스템이 그나마 대안이고, 이미 정착되었다. 지난 29년 동안의 프로야구에서 대부분의 명승부도 포스트시즌에서 나왔다. 2009년 한국시리즈 7차전만 하더라도 야구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 극적인 상황을 연출하지 않았던가. KIA팬이라면 영원히 간직하고픈 포스트시즌 경기였으리라. 필자의 개인적 입장에서는 1984년 한국시리즈 7차전을 잊을 수 없다. 유두열의 홈런 한방으로 무너진 삼성. 당시 고교생이었던 필자에겐 야구가 줄 수 있는 ‘최대의 절망’이었다. 물론 지금은 그 모든 것이 소중한 추억이고 야구가 선사한 아름다운 기억들이지만 당시에 겪은 트라우마를 극복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했다. 야구란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공놀이’에 지나지 않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삶의 희로애락’이 될 수도 있다.
두산과 롯데의 팬이 아니라도 준플레이오프가 기다려지는 건 두 팀이 가진 ‘색깔’ 때문이다. 두 팀은 기본적으로 ‘선이 굵은 야구’를 한다. 비록 두산이 공격, 수비, 투수, 기동력에서 조화를 이루고는 있지만 팀타율 2위가 말해주듯이 ‘창’이 주무기다. 롯데는 실책 1위, 팀타율 1위가 모든 것을 말해준다. 극강의 공격력으로 승부한다. 큰 경기에서는 선발 원투 펀치와 매조지할 수 있는 마무리면 충분한 것이 야구라 하지만, 창과 창의 대결도 흥미로운 대결이 아닐 수 없다. 싱겁게 끝날 수도 있는 것이 창과 창의 대결이기도 하지만 반전의 반전이 가능한 것도 공격적인 팀끼리 맞붙을 때다. 두 팀의 대결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힘과 힘의 승부이자 두려움 없는 야구다. 전술이나 지략보다는 마주보고 달리는 열차처럼 물러서지 않고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야구계에서 김경문 감독의 별명은 ‘남자’이고, 로이스터 감독은 ‘No Fear’로 정의된다. 이 둘이 첫판부터 맞붙는 ‘가을의 전설’을 야구팬이라면 놓쳐서는 안 된다. 설사 결과가 한쪽 팬에게는 ‘최대의 절망’이 될지라도.
동명대학교 체육학과 교수
요기 베라의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 라는 경구를 좋아한다. 스포츠에 대한 로망을
간직하고 있다.현실과 로망은 다르다는 것을 알지만 로망과 스포츠의 ‘진정성’을이야기 하고 싶다.
오늘날 한국 프로야구가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진화할 수 있었던 기저에는 ‘한국형 포스트시즌’이 기여한 바가 적지 않다. 원칙적인 측면에서는 정규리그 우승팀이 최고의 팀이라는 사실이 당연하지만 양대리그가 구축되지 못한 상황에서는 현재의 시스템이 그나마 대안이고, 이미 정착되었다. 지난 29년 동안의 프로야구에서 대부분의 명승부도 포스트시즌에서 나왔다. 2009년 한국시리즈 7차전만 하더라도 야구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 극적인 상황을 연출하지 않았던가. KIA팬이라면 영원히 간직하고픈 포스트시즌 경기였으리라. 필자의 개인적 입장에서는 1984년 한국시리즈 7차전을 잊을 수 없다. 유두열의 홈런 한방으로 무너진 삼성. 당시 고교생이었던 필자에겐 야구가 줄 수 있는 ‘최대의 절망’이었다. 물론 지금은 그 모든 것이 소중한 추억이고 야구가 선사한 아름다운 기억들이지만 당시에 겪은 트라우마를 극복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했다. 야구란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공놀이’에 지나지 않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삶의 희로애락’이 될 수도 있다.
두산과 롯데의 팬이 아니라도 준플레이오프가 기다려지는 건 두 팀이 가진 ‘색깔’ 때문이다. 두 팀은 기본적으로 ‘선이 굵은 야구’를 한다. 비록 두산이 공격, 수비, 투수, 기동력에서 조화를 이루고는 있지만 팀타율 2위가 말해주듯이 ‘창’이 주무기다. 롯데는 실책 1위, 팀타율 1위가 모든 것을 말해준다. 극강의 공격력으로 승부한다. 큰 경기에서는 선발 원투 펀치와 매조지할 수 있는 마무리면 충분한 것이 야구라 하지만, 창과 창의 대결도 흥미로운 대결이 아닐 수 없다. 싱겁게 끝날 수도 있는 것이 창과 창의 대결이기도 하지만 반전의 반전이 가능한 것도 공격적인 팀끼리 맞붙을 때다. 두 팀의 대결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힘과 힘의 승부이자 두려움 없는 야구다. 전술이나 지략보다는 마주보고 달리는 열차처럼 물러서지 않고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야구계에서 김경문 감독의 별명은 ‘남자’이고, 로이스터 감독은 ‘No Fear’로 정의된다. 이 둘이 첫판부터 맞붙는 ‘가을의 전설’을 야구팬이라면 놓쳐서는 안 된다. 설사 결과가 한쪽 팬에게는 ‘최대의 절망’이 될지라도.
동명대학교 체육학과 교수
요기 베라의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 라는 경구를 좋아한다. 스포츠에 대한 로망을
간직하고 있다.현실과 로망은 다르다는 것을 알지만 로망과 스포츠의 ‘진정성’을이야기 하고 싶다.
Copyright © 스포츠동아.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하기



![한효주, 군인 출신 父 반전 실력…“엄마만 잘하는 줄” [SD셀픽]](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2/20/133389362.1.jpg)


![서효림, 은은한 속옷 시스루…두바이 여신 등장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2/20/133390128.1.jpg)



![송혜교, 파격 숏컷도 청순하게…독보적 미모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2/21/133393690.1.jpg)


![김장훈, 200억 기부→잔고 200만원…풀빌라서 “저는 부자” [SD셀픽]](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2/21/133394257.1.jpg)
![헬스하는 장원영, 하의가 반전…사랑스러워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2/20/133390001.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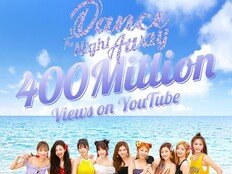

![유소영, 샤워타월 흘러내릴라…아찔한 호텔 셀카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2/20/133389454.1.jpg)


![전지현, 복근+레깅스 美쳤다…40대 중반 안 믿겨 [화보]](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6/02/20/133391974.1.jpg)

![유소영, 샤워타월 흘러내릴라…아찔한 호텔 셀카 [DA★]](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6/02/20/133389454.1.jpg)
![BTS 뷔, 사적 대화 털렸다…민희진 맞장구쳤다가 당황 [종합]](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6/02/20/133388567.1.jpg)

![채정안, 48세 안 믿겨…하와이 해변 홀린 탄탄 각선미 [DA★]](https://dimg.donga.com/a/140/140/95/1/wps/SPORTS/IMAGE/2026/02/21/133393738.1.jpg)
![송혜교, 파격 숏컷도 청순하게…독보적 미모 [DA★]](https://dimg.donga.com/a/140/140/95/1/wps/SPORTS/IMAGE/2026/02/21/133393690.1.jpg)





![‘쇼트 아쉬움 만회’ 신지아, 안정된 프리 ‘개인 최고점 경신’ [올림픽]](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6/02/20/133385765.1.jpg)











![장예원 주식 대박 터졌다, 수익률 무려 323.53% [DA★]](https://dimg.donga.com/a/110/73/95/1/wps/SPORTS/IMAGE/2023/12/01/122442320.1.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