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기자 장혁은 열정 하나로 20년 넘는 연기 활동을 이어올 수 있었다. 30년이 흘러도 가슴의 뜨거움을 잃지 않길 바라는 그는 “아무리 힘들어도 좋은 현장이 있다면 언제나 달려 나가고 싶다”고 했다. 사진제공|싸이더스HQ
■ ‘에너자이저’ 장혁이 말하는 데뷔 20년
같은 사람이 연기…대중 잣대 틀 필요 없어
20년간 아침엔 운동, 저녁엔 맥주 한 캔
쉬긴 쉬는데 조금만 쉬니 계속 일하는 줄
연기자 장혁(42)은 극과 극의 표정 변화로 자신을 드러냈다. 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면 집중력과 진지함이 굉장했고, 일상생활을 소개할 때는 온화하고 순수한 미소를 지었다. 언뜻 ‘연기자 장혁’과 ‘자연인 장혁’으로서 삶의 경계를 확실히 두는 것도 같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다음’을 만들어내기 위한 자신과의 약속이다. 그는 언제나 하루를 “아침 운동으로 시작하고 저녁 맥주 한 캔”으로 마무리한다. 데뷔 때부터 몸에 밴 습관이자 삶의 일부분이다.
장혁은 이렇게 살아온 지 20년이 훌쩍 넘었다. 연기자를 꿈꾸진 않았지만 서울예대 연극영화과에 진학하고 “자연스럽게 흘러” 1996년 SBS 드라마 ‘모델’을 통해 처음 연기를 경험했다. 데뷔작을 만나기까지 숱하게 오디션을 봐왔던 그는 첫 대본 리딩의 순간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한다.
“SBS가 여의도에 있을 때였다. 아침 6시에 대본 연습이 정해졌는데 저는 막내여서 10분 전에 도착했다. 가을이었는데도 새벽공기가 굉장히 차가웠다. 바깥의 기온과 풍경, 건물에 들어선 뒤의 느낌 등이 마치 어제 있었던 일인 것처럼 생생하다.”
당시 심장이 터질 만큼의 “설레고 떨리고 긴장”되는 감정은 20년이 흘러도 변함없다. 그때보다 가슴이 뜨거웠으면 뜨거웠지 전혀 식지 않고 있다. 그렇기에 최근 종영한 MBC ‘돈꽃’부터 지난해 KBS 2TV 예능프로그램 ‘용띠클럽 - 철부지 브로망스’, OCN 드라마 ‘보이스’ 등 쉬지 않고 현장에 몸을 내던질 수 있었다. ‘에너자이너’ 같은 그의 행보는 비단 지난해뿐이 아니다. 장혁은 “쉬긴 쉬는데 다른 분보다 덜 쉬니깐 안 쉬는 것 같을 것”이라며 웃는다.
“우리는 연기를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감사하게도 불러주니깐 현장에 나갈 수 있다. 전적이 화려한 운동선수가 경기 운영을 잘한다고 하지 않나. 이론으로 아무리 공부하더라도 현장에서 고민하고, 동료·제작진과 이야기 나누며 소통하면서 해결점을 찾게 된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도 현장에서는 변수가 많기에 직접 부딪히고 싶다.”

MBC 드라마 ‘돈꽃’에서의 장혁. 사진제공|온누리 미디어
특히 장혁은 ‘돈꽃’의 성공을 이끈 주역으로 2010년 KBS 2TV ‘추노’ 이후 ‘인생작’을 다시 썼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추노’ 때부터 연기가 비슷하다는 일부 시청자의 반응을 바꿔놓는 성과도 얻었다. 그러나 그는 좋아하는 기색 없이 “언젠가는 ‘돈꽃’하고 똑같다고 할 것”이라고 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장르 속 다양성은 있어도 같은 사람이 연기해오지 않았나. 하하! 톤이나 웃음, 표정 등은 같다. 대중의 반응이나 매체의 잣대를 굳이 거부하려 하지 않는다. 20년 넘게 해왔기에 흔들리지 않을 만큼, 신경 쓰지 않는 여유가 생겼다.”
정작 장혁이 꼽는 성과는 다른 데에 있었다. 이순재, 이미숙, 선우재덕 등과 함께 할 수 있어 더없이 기뻤다는 것이다. 이들이 지금까지도 뜨거운 열정과 카리스마로 화면을 장악하는 모습에 ‘다음’이란 단어에 대한 무서움은 더욱 절실해졌다.
“충분히 준비해놓지 않으면 저에게 ‘다음’은 없다. 모두가 생각하는 나름의 이상을 해내야 다음 작품에서 절 불러준다. 이면에는 피고름이 있을 만큼 견디는 과정이 거칠었다.”

연기자 장혁. 사진제공|싸이더스HQ
장혁은 “지금 나이가 좋다”고 했다. 인생의 절반 이상을 연기자로 살아오면서 누구보다 뜨거운 청춘을 즐겼고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경험도 쌓았다. 이를 통해 얻은 것은 연기의 “감칠맛과 육중한 분위기”를 낼 수 있는 자신감이다. 그 시기가 지금이라고 믿는다.
“매력적인 캐릭터에 대한 욕심이 더 커졌다. 이 나이에는 눈으로도 연기를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하! 앞으로의 30년을 위해, 좋은 20년을 보냈다. 가슴 속 뜨거움은 잃고 싶지 않다. 앞으로도 있어야 할 것이고,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현장을 즐길 수 있다.”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Copyright © 스포츠동아.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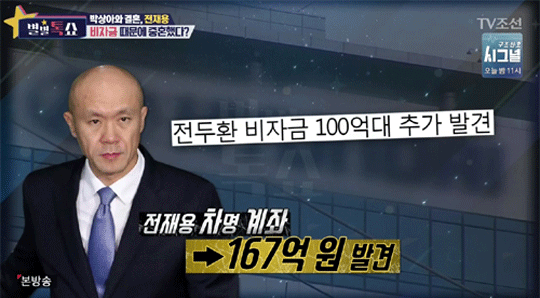



![변요한, ♥티파니와 새해 맞이? 숟가락에 비친 ‘커플 실루엣’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1/02/133080789.3.jpg)
![‘두쫀쿠’는 좋겠다, 장원영이 이렇게 사랑해줘서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1/02/133080468.3.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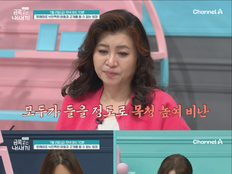



![“깜짝이야” 효민, 상의 벗은 줄…착시 의상에 시선 집중 [DA★]](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5/12/30/133061528.3.jpg)
![몸집 키운 바이포엠, 김우빈♥신민아 소속사 인수 [공식]](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5/12/31/133070547.1.png)
![대체 왜 이래? SBS 연예대상, 지석진 향한 기만의 역사 (종합)[DA:이슈]](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5/12/31/133070320.3.jpg)




![이민정, 딸과 첫 해외여행서 응급 상황…“♥이병헌이 밤새 간호” [DA★]](https://dimg.donga.com/a/140/140/95/1/wps/SPORTS/IMAGE/2026/01/02/133081053.3.jpg)
![변요한, ♥티파니와 새해 맞이? 숟가락에 비친 ‘커플 실루엣’ [DA★]](https://dimg.donga.com/a/140/140/95/1/wps/SPORTS/IMAGE/2026/01/02/133080789.3.jpg)



![‘정다은♥’ 조우종 새 출발, 9년 인연 끝냈다 [공식]](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0/02/05/99554979.1.jpg)



















![김남주 초호화 대저택 민낯 “쥐·바퀴벌레와 함께 살아” [종합]](https://dimg.donga.com/a/110/73/95/1/wps/SPORTS/IMAGE/2025/05/27/131690415.1.jpg)
![이정진 “사기 등 10억↑ 날려…건대 근처 전세 살아” (신랑수업)[TV종합]](https://dimg.donga.com/a/110/73/95/1/wps/SPORTS/IMAGE/2025/05/22/131661618.1.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