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동아DB
일본 J리그가 최근 흥미로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춘추제(봄~가을) 형식으로 진행해온 리그 시스템을 추춘제(가을~봄)로 전환하려는 것이다. 갑작스러운 흐름이 아니다. 이미 꾸준히 조짐을 보였다.
올해 초 다시마 고조 일본축구협회(JFA) 회장이 직접 “세계적 추세를 따라야 할 필요가 있다. 많은 어려움이 있겠으나 본격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한 가운데 얼마 전 J리그 사무국 차원에서 심도 깊은 대화가 이뤄졌다. 그리고 리그 시스템 변화에 대한 현장 반응은 상당히 긍정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일본 매체들은 “단순 아이디어 차원의 미팅이 아닌 진지한 자리였다. 대부분의 J리그 구성원들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전했다.
추춘제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가깝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국제축구계의 주류인 유럽국가들 대부분이 자국리그를 추춘제로 진행하고 있고, 아시아 역시 피할 수 없는 흐름이 됐다. 아시아축구연맹(AFC)의 주류로 자리 잡은 중동과 서아시아국가들도 대부분 추춘제로 리그를 운영하고 있다. 여름과 겨울, 연 2회씩인 이적시장은 물론이고 클럽들이 참여하는 주요 국제대회가 추춘제를 기준으로 운영된다. 춘추제로 진행되던 AFC 챔피언스리그(ACL)도 2023~2024시즌을 기점으로 추춘제로 전환된다.
K리그도 이런 분위기를 잘 알고 있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역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많은 K리그 구단들 또한 추춘제에 기본적으로는 동조하는 등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물론 현실적 어려움이 적지 않다. 사계절의 우리나라는 겨울이 유독 길다. 추춘제 리그를 운영하려면 선수단 개편과 전지훈련 등을 위한 최소 2개월의 넉넉한 프리시즌뿐 아니라 선수보호를 위한 12월 중순부터 이듬해 2월 초까지 겨울 휴식기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K리그1은 팀당 38경기씩 치르는 구조인 데다 FA컵과 승강 플레이오프, ACL 등을 두루 고려하면 시즌 중간(2개월)을 포함한 4개월 이상의 휴식기를 보낼 여유가 없다. 전체 경기수를 줄이는 등 운영방식을 일대 수정해야 추춘제 전환이 가능하다.
여기에 경기장 관리도 걸림돌이다. 유럽은 그라운드 바닥에 열선을 깔고, 홈경기 직후에는 각 클럽이 보유한 인공 채광기로 잔디 생육을 돕는다. 막대한 자금력을 지닌 중동에선 필요할 때마다 그라운드 전체를 갈아엎는 ‘손쉬운’ 선택을 한다. 채광기를 사용하는 팀도 극히 일부인데다 수억 원을 들여 한 번 잔디를 깔면 최소 10년은 써야 하는 K리그로선 선뜻 추춘제가 와 닿지 않는다.
남장현 기자 yoshike3@donga.com
Copyright © 스포츠동아.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하기











![고아성, 해외 이동 중 폭설에 위급상황 “차 미끄러져 패닉” [DA클립]](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3/03/133458063.1.jpg)

![‘탈세 논란’ 번지는 연예계…침착맨은 ‘모범납세자’ [SD이슈]](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3/04/133463157.1.jpg)
![씨스타 다솜, 복근 말도 안 돼…청순미 벗어던지고 과감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3/03/133458373.1.jpg)

![씨스타 소유, 차량 사고에도 “액땜 제대로”…쿨한 근황 [SD셀픽]](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3/04/133462220.1.png)
![“뭐가 살쪄!!!” 이시영, 복근 대박…둘째 출산 4개월만인데?!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3/04/133462243.1.jpg)
![‘환승연애4’ 백현, 전 여친 박현지 X룸 생수의 진실 [DA클립]](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3/03/133457729.1.jpg)


![남지현 촬영장 현실 폭로…“감독님이 ‘못생긴 X’ 이라 불러” [DA클립]](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3/04/133460337.1.png)



![‘손숙 외손녀’ 하예린 “‘외조모’ 손숙, ‘브리저튼4’ 보고 ‘자랑스럽다. 사랑해’ 문자” (종합)[DA현장]](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3/04/133462814.1.jpg)
![이영은, ‘왕사남’ 앓이 중 뜻밖의 논란…영화관 매너 도마 [SD톡톡]](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3/04/133462623.1.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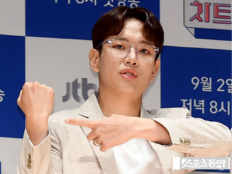

![샤라포바, 이탈리아서 뽐낸 수영복 자태…몸매 여전해 [DA★]](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6/03/03/133452477.1.jpg)
![문가영, 어깨라인 드러낸 오프숄더…청초 비주얼 [DA★]](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6/03/03/133452786.1.jpg)

![이채영, 화끈한 노브라 패션+키스마크…언니 옷 여며요 [DA★]](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6/02/28/133440678.1.jpg)
![‘44kg’ 감량했던 김신영 “돌아왔다” 입 터진 근황 [DA클립]](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6/03/01/133442467.1.jpg)
![‘마약 누명’ 디아크, 이번엔 소속사 저격…“가둬놓고 폭언” [DA이슈]](https://dimg.donga.com/a/140/140/95/1/wps/SPORTS/IMAGE/2026/03/04/133463007.1.jpg)
![블랙핑크 지수, 블랙 드레스 속 가녀린 어깨라인…독보적 우아함 [DA★]](https://dimg.donga.com/a/140/140/95/1/wps/SPORTS/IMAGE/2026/03/04/133462638.1.jpg)
![“뭐가 살쪄!!!” 이시영, 복근 대박…둘째 출산 4개월만인데?! [DA★]](https://dimg.donga.com/a/140/140/95/1/wps/SPORTS/IMAGE/2026/03/04/133462243.1.jpg)



















![장예원 주식 대박 터졌다, 수익률 무려 323.53% [DA★]](https://dimg.donga.com/a/110/73/95/1/wps/SPORTS/IMAGE/2023/12/01/122442320.1.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