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은중 U-20 축구대표팀 감독. 스포츠동아DB
꿈같은 시간이었다. 한국축구는 최근 아르헨티나에서 막을 내린 2023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 4강에 올랐다. 아쉽게 최종 4위로 마쳤으나, 예상을 깨고 4년 전 폴란드 대회(준우승)에 이은 2회 연속 4강 진출로 모두를 놀라게 했다.
당초 U-20 대표팀을 향한 시선은 냉랭했다. 많은 이들이 ‘골짜기 세대’, ‘스타 없는 역대 최약체’라고 우려했다. 그러나 김은중 감독(44)은 달랐다. 선수들을 믿었고, 선전을 확신했다. 조별리그만 통과한다면 8강까지는 갈 수 있다고 봤다. 4강은 한 걸음 더 내디딘 성과다.
스포츠동아와 만난 김 감독은 “무명의 반란이란 표현에 동의는 한다. 확실한 것은 선수들 스스로 만든 결과라는 점이다. 이들은 자신도 모르던 잠재력을 끄집어내 경쟁력을 갖췄고, 상대와 거센 경쟁을 이겨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귀국 후 그는 제대로 쉬지 못했다. 인터뷰 요청이 쏟아지고, 다양한 행사가 잡혔다.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다. 빡빡한 일정에도 어떻게든 시간을 쪼개 언론과 만난다. 김 감독은 “물론 리프레시가 필요하다. 연령별 지도자로 활동한지 6년 반이다. 주변에선 가족여행도 하고 머리도 식히라는데, 인터뷰에는 꼭 참석한다. 한 번이라도 더 우리 팀을 노출시키고 싶어서다”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랬다. U-20 월드컵을 계기로 이름값이 조금 올라갔지만, 대회 직전만 해도 그들을 알아주는 이는 드물었다. 김 감독의 바람은 하나다. 제자들이 성과에 도취되지 않고, 아시안게임과 올림픽, 더 나아가 국가대표로까지 성장하길 원한다. 그는 “이전엔 연령별 대표팀에서 성공하면 다음 단계로 조금 쉽게 진입했는데, 지금은 다르다. 마지막 미팅에서 더 중요한 시작이 기다리고 있고, 새 출발선에 있음을 이야기해줬다. 다시 강조하자면 진짜 경쟁은 이제부터다”고 힘주어 말했다.

사진제공 | 대한축구협회
김 감독의 지도력을 빼놓을 수 없다. ‘언더독의 반란’에는 출중한 지도자가 있는 법이다. 그는 A부터 Z까지 플랜을 준비했다. 전술적으로, 또 분위기로 자신감을 극대화했다. 프랑스와 조별리그 1차전을 앞두고 핵심 자원인 배준호(대전하나시티즌)가 뛸 수 없다는 사실을 보고받고도 그는 담담했다. 대신 달리 생각했다. ‘에이스를 아끼고도 이기면 훨씬 긍정적이지 않을까?’
심지어 개최지가 인도네시아에서 전혀 다른 환경의 아르헨티나로 바뀌었을 때도 김 감독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김학범 감독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다. 전술 및 선수단 멘탈 관리, 브라질 전지훈련과 대회 준비 등 모든 면에서 조언을 주셨다. 진심어린 모니터링과 따듯한 피드백이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대회기간 눈길을 끈 것 중 하나는 김 감독의 포커페이스다. 선수 시절 유독 세리머니 동작이 컸던 그이기에 화제가 됐다. 치명적 오심에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의도된 행동이었다. 그는 “(오심에) 왜 화가 나지 않았겠나? (득점에) 왜 좋아하고 싶지 않았겠나. 나도 물병을 던지고 분노도 하고 싶다. 그런데 어린 선수들은 벤치 모션에 큰 영향을 받는다. 차분하게 대응해야 아이들도 차분해진다”고 털어놓았다.
그렇다면 김 감독에게 U-20 월드컵은 어떻게 기억될까. 스스로도 ‘성공했다’고 여길까. 역시 담백했다. 그는 “난 아이디어만 제공했을 뿐, 실행한 것은 스태프와 선수들이다. 난 초보 감독일 뿐이다. 성과를 냈을 뿐, 성공하지 못했다. 아직 준비할 것도, 채워야 할 것도 참 많다”고 말했다.
남장현 기자 yoshike3@donga.com
Copyright © 스포츠동아.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하기











![트와이스 지효, ‘속옷 노출’ 파격 시스루…뒤태 더 아찔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3/05/133471107.1.jpg)

![기안84, ‘기안장2’ 스태프 150명 사비 선물…미담 터졌다 [SD톡톡]](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3/05/133471769.1.png)

![[단독] 히말라야 편성 갈등? jtbc “우리와 무관한 행사”](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3/05/133472616.1.jpg)
![장원영, 블랙 민소매 입고 ‘심쿵’ 셀카…인형이 따로 없네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3/05/133469980.1.jpg)

![이지혜, SNS 규정 위반 경고 받았다…39만 팔로워 어쩌나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2/11/133344737.1.png)

![이주승 역시나 탈탈 털렸다…카니에 휘둘리다 ‘텅 빈 동공’ [DA클립]](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3/04/133466151.1.jpg)

![4년 조용하던 이휘재…갑자기 다시 뜬 이유 [굳이 왜?]](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3/05/133471330.1.jpg)
![“애둘맘 맞아?” 홍영기, 아슬아슬 끈 비키니 입고 뽐낸 몸매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3/05/133467346.1.jpg)
![산다라박 “마약 안 했다”…박봄 글 파장 [굳이 왜?]](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3/05/133471444.1.jpg)


![이영애, 인파 뚫고 손미나 응원 갔다…“의리의 여왕” [SD셀픽]](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3/05/133471339.1.png)



![캐나다 行 ‘이휘재♥’ 문정원, 4년 만 근황…“어느새 3월” [DA이슈]](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6/03/04/133459538.1.jpg)
![문가영, 어깨라인 드러낸 오프숄더…청초 비주얼 [DA★]](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6/03/03/133452786.1.jpg)

![샤라포바, 이탈리아서 뽐낸 수영복 자태…몸매 여전해 [DA★]](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6/03/03/133452477.1.jpg)
![“콧구멍 변해” 백지영, 성형 10억설 고백…정석원 ‘연골 약속♥’ [DA클립]](https://dimg.donga.com/a/140/140/95/1/wps/SPORTS/IMAGE/2026/03/05/133472619.1.jpg)
![이시안 수위 조절 실패…코 성형 구축설+김고은 겹지인 고백 [DA클립]](https://dimg.donga.com/a/140/140/95/1/wps/SPORTS/IMAGE/2026/03/05/133471521.1.jpg)
![‘구독자 100만 임박’ 김선태, 영향력 어디까지…사칭 계정 등장 [DA이슈]](https://dimg.donga.com/a/140/140/95/1/wps/SPORTS/IMAGE/2026/03/05/133471314.3.jpg)
![‘1세대 톱모델’ 홍진경·이소라, 파리서 ‘본업 모먼트’ 포착 [DA★]](https://dimg.donga.com/a/140/140/95/1/wps/SPORTS/IMAGE/2026/03/05/133471351.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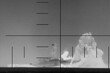







![장예원 주식 대박 터졌다, 수익률 무려 323.53% [DA★]](https://dimg.donga.com/a/110/73/95/1/wps/SPORTS/IMAGE/2023/12/01/122442320.1.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