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일단 야구는 들 野에 공 球다!
내 이름은 김민정. 개나 소나 할 만큼 흔한 이름에 서른일곱 노처녀. 게다가 시어머니 자리가 선 자리에서 대놓고 까는 직업 가운데 하나인 글쟁이, 그도 모자라 시인. 시로 버는 돈이 1년에 채 100만 원이 될까 말까 하여 주업 삼은 일이 에디터, 그렇게 14년 가까이 책이나 만들어온 내가, 야구 경험은 고사하고 프로야구 경기장 한 번 가보지 않은 내가, 겁도 없이 이 지면에 지명타자로 들어선 데는 나름 이유가 있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그만 야구에서 사람을 보아버린 것이다. 그리하여 어느 날 그만 야구에서 인생을 배워버린 것이다.
이르게 찾아온 여름에 비해 더디게 다가왔던 지난봄의 어느 날, 나는 파주 헤이리에 있는 한 야구연습장에서 목이 터져라 욕이 대수이랴 필사적으로 한 팀을 응원하고 있었다. 소박하다 못해 절박하기 짝이 없는 실력의 문인야구단 구인회가 천하무적 야구단 출신의 선수들이 속해 있는 한 사회인 야구단 팀과 시합 중이라니, 연예인도 좋지만 가난이 자랑인 문인들에게로 난들 팔이 안으로 굽지 않았겠는가.
장비는 비교해서 무엇하고 유니폼은 대조해서 무엇하며 실력은 가늠해서 무엇하랴. 매일같이 책상에 앉아 펜대나 굴리다 토요일 하루 반짝 국민체조로 몸이나 푸는 글쟁이들과 체계적이며 전문적인 훈련을 받는다는 상대팀과는 역시나 현저한 게임 스코어를 보여주었다. 어차피 이기고 질 경기에 왜들 저리 난리람.
그러나 승부와는 상관없이 타석에 들어서면 헬멧이 벗겨지도록 방망이를 휘두르고 글러브를 끼면 모자가 날아가도록 공을 향해 전력 질주하는 선수들의 열정, 그 본능의 순정함에 나는 얼마 안 가 매료되고 말았다. 떨어지는 공에 나는 공이 그리는 포물선의 다양함도 물론이거니와 공을 치고 공을 잡을 때마다 찰나적으로 변모하는 몸의 시위, 그 오므림과 펼쳐짐의 순간마다 이입되는 근육의 아름다움에 대해서도 말이다.
연재를 시작한다고 하니 누군가 공 하나를 선물로 건넸다. 2010년 4월 30일 박경완 300홈런 기념구다. 이 공? 이게 뭐라고, 라면 더는 할 말 없겠다만 이 공? 이게 야구다, 라면 꽤나 할 말 생기지 않을까 싶다. 왜? 야구야말로 사람의 일이니까.

시인 김민정. 스포츠동아DB
1976년 인천에서 태어났다. 1999년 <문예중앙> 신인문학상을 통해 등단했다. 시집으로 <날으는 고슴도치 아가씨>, <그녀가 처음, 느끼기 시작했다>가 있다.
[스포츠동아]
Copyright © 스포츠동아.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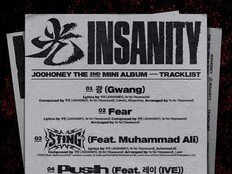

![수지, 예쁜 얼굴에 무슨 짓? 마구 구겨도 비주얼이 작품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5/12/24/133032726.1.jpg)






![블랙핑크 제니, 깊이 파인 가슴라인…아찔한 포즈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5/12/24/133033379.1.jpg)
![송혜교 맞아? 못 알아볼 뻔…역시 천천히 강렬하다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5/12/25/133034684.1.jpg)
![원진서 파격 터졌다, 아찔 비키니…♥윤정수도 상의탈의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5/12/25/133034522.1.jpg)





![원진서 파격 터졌다, 아찔 비키니…♥윤정수도 상의탈의 [DA★]](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5/12/25/133034522.1.jpg)

![송혜교 맞아? 못 알아볼 뻔…역시 천천히 강렬하다 [DA★]](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5/12/25/133034684.1.jpg)
![장모♥사위 불륜, CCTV에 딱 걸려 “상의 탈의까지” (하나부터 열까지)[TV종합]](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5/12/23/133019873.1.jpg)
![자산 1500억 ‘강남역 큰손’, 심은하 집주인…대박 과거 (이웃집 백만장자)[TV종합]](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5/12/25/133035263.1.jpg)
![김희정, 운동복 자태도 남달라…건강미 넘치는 바디 [DA★]](https://dimg.donga.com/a/140/140/95/1/wps/SPORTS/IMAGE/2025/12/26/133045716.1.jpg)


























![김남주 초호화 대저택 민낯 “쥐·바퀴벌레와 함께 살아” [종합]](https://dimg.donga.com/a/110/73/95/1/wps/SPORTS/IMAGE/2025/05/27/131690415.1.jpg)
![이정진 “사기 등 10억↑ 날려…건대 근처 전세 살아” (신랑수업)[TV종합]](https://dimg.donga.com/a/110/73/95/1/wps/SPORTS/IMAGE/2025/05/22/131661618.1.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