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쇼트트랙 김아랑·곽윤기. 스포츠동아DB
쇼트트랙은 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선수단의 메달밭으로 불린다. 동계올림픽에 처음 채택된 1992년 알베르빌대회부터 2018년 평창대회까지 한국은 꾸준히 1개 이상의 금메달을 수확했다. 그러다 보니 다른 나라들로부터 엄청난 집중견제를 받곤 한다.
특히 중국은 한국의 대표적 라이벌로 꼽힌다. 여자부 양양, 왕춘루, 왕멍, 저우양, 판커신, 남자부 리자준, 런즈웨이, 우다징 등은 국내 팬들에게도 익숙한 선수들이다. 그만큼 한국과 중국의 라이벌 구도가 부각됐다는 의미다. 특히 판커신을 앞세운 중국 특유의 반칙성 플레이에 이골이 난 국내 팬들은 올림픽 때마다 ‘타도 중국’을 외친다.
4일 개막하는 2022베이징동계올림픽에서도 양국의 라이벌 구도는 지속될 전망이다. 2018년 평창대회에선 한국이 금메달 3개를 거머쥔 반면 중국은 금메달 1개에 그쳤다. 이에 중국은 이번 베이징대회에서 설욕 의지를 감추지 않고 있다. 평창대회 때 한국대표팀 사령탑이었던 김선태 감독과 ‘쇼트트랙 황제’ 빅토르 안(한국명 안현수) 코치를 영입한 것도 베이징대회에 임하는 중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쇼트트랙 대표팀. 스포츠동아DB
그러다 보니 기대만큼 부담도 큰 듯하다. 김 감독과 안 코치를 비롯한 중국 선수단은 베이징 캐피털실내빙상장에서 진행되는 공식훈련 때마다 인터뷰를 고사하고 있다. 2일 오전 훈련 직후에는 한국 취재진이 믹스트존에서 판커신을 불러 세웠으나, 별다른 답변 없이 자리를 떴다. 1일 만난 런즈웨이와 우다징도 경기력에 대해선 극도로 말을 아꼈다. 혹시라도 전략이 노출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모습이었다. 현장에서 만난 한 중국 기자마저 “우리도 쇼트트랙대표팀과 인터뷰를 못한 지 엄청 오래됐다. 인터뷰를 고사하는 이유도 모르겠다”며 답답해했다.
중국의 이 같은 전략은 한국 선수들에게도 신경이 쓰일 만한 요소다. 게다가 심판의 판정 하나가 메달 색깔을 바꿀 수 있는 종목의 특성상 실격의 여지를 완전히 없애야 한다는 부담도 크다.
그러나 한국 선수들은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이다. ‘젊은 피’ 황대헌(강원도청)과 이유빈(연세대)의 목소리에는 패기가 넘쳤다. 황대헌은 “연습 때 밖의 상황을 보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럴 시간에 연습을 더 하는 게 낫다”고 말했고, 이유빈은 “월드컵시리즈 때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다른 국가의 훈련 장면을 촬영하기에 신경 쓰지 않는다”고 밝혔다. 3번째 올림픽에 나서는 베테랑 김아랑(고양시청)은 “한국 지도자들이 중국으로 간 것도 2년이 넘었다. 그 때부터 우리의 전략이 공유되면 늘 새로운 것을 찾으며 발전했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베이징 |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Copyright © 스포츠동아.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하기













![이영애, 인파 뚫고 손미나 응원 갔다…“의리의 여왕” [SD셀픽]](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3/05/133471339.1.png)
![장원영, 블랙 민소매 입고 ‘심쿵’ 셀카…인형이 따로 없네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3/05/133469980.1.jpg)

![산다라박 “마약 안 했다”…박봄 글 파장 [굳이 왜?]](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3/05/133471444.1.jpg)
![트와이스 지효, ‘속옷 노출’ 파격 시스루…뒤태 더 아찔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3/05/133471107.1.jpg)


![기안84, ‘기안장2’ 스태프 150명 사비 선물…미담 터졌다 [SD톡톡]](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3/05/133471769.1.png)
![이지혜, SNS 규정 위반 경고 받았다…39만 팔로워 어쩌나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2/11/133344737.1.png)
![[단독] 히말라야 편성 갈등? jtbc “우리와 무관한 행사”](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3/05/133472616.1.jpg)

![‘1세대 톱모델’ 홍진경·이소라, 파리서 ‘본업 모먼트’ 포착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3/05/133471351.1.jpg)

![“애둘맘 맞아?” 홍영기, 아슬아슬 끈 비키니 입고 뽐낸 몸매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3/05/133467346.1.jpg)




![캐나다 行 ‘이휘재♥’ 문정원, 4년 만 근황…“어느새 3월” [DA이슈]](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6/03/04/133459538.1.jpg)
![문가영, 어깨라인 드러낸 오프숄더…청초 비주얼 [DA★]](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6/03/03/133452786.1.jpg)

![샤라포바, 이탈리아서 뽐낸 수영복 자태…몸매 여전해 [DA★]](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6/03/03/133452477.1.jpg)

![“콧구멍 변해” 백지영, 성형 10억설 고백…정석원 ‘연골 약속♥’ [DA클립]](https://dimg.donga.com/a/140/140/95/1/wps/SPORTS/IMAGE/2026/03/05/133472619.1.jpg)
![이시안 수위 조절 실패…코 성형 구축설+김고은 겹지인 고백 [DA클립]](https://dimg.donga.com/a/140/140/95/1/wps/SPORTS/IMAGE/2026/03/05/133471521.1.jpg)
![‘구독자 100만 임박’ 김선태, 영향력 어디까지…사칭 계정 등장 [DA이슈]](https://dimg.donga.com/a/140/140/95/1/wps/SPORTS/IMAGE/2026/03/05/133471314.3.jpg)

![‘숀롱 37점+허훈 29점+최준용 복귀’ KCC, DB 골밑 폭격하며 104-84 완승 [현장리뷰]](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6/03/05/133474187.1.jpg)


![김주성 DB 감독 “흥분한 상태로 뛰면 좋은 경기를 할 수가 없다” [SD 원주 패장]](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6/03/05/133474521.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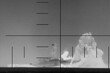






![장예원 주식 대박 터졌다, 수익률 무려 323.53% [DA★]](https://dimg.donga.com/a/110/73/95/1/wps/SPORTS/IMAGE/2023/12/01/122442320.1.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