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농구계에는 대학 졸업 전 프로에 진출하는 ‘얼리 엔트리’ 바람이 불고 있다. 송교창(앞)은 고교생 신분으로 2015 KBL 신인드래프트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사진제공|KBL
삼일상고 3학년 송교창 신인드래프트 참가
정효근 “프로세계 선경험…더 일찍 올 걸”
허웅 “대학생활 누리는 동생이 부럽기도”
농구에서 ‘얼리 엔트리(Early Entry)’는 선수가 대학교를 졸업하지 않고 프로에 진출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프로농구(NBA)에선 1976년 얼리 엔트리를 허용했고, 이제는 대학을 졸업한 선수를 보기 힘들 정도다. 현재 NBA 슈퍼스타들 가운데 대학 졸업 후 프로에 데뷔한 선수로는 팀 던컨(샌안토니오) 정도를 꼽을 수 있다. 코비 브라이언트(LA 레이커스), 르브론 제임스(클리블랜드) 등은 아예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채 고교 졸업 후 곧장 프로세계로 뛰어들었다.
● KBL도 얼리 엔트리 바람?
아직까지 국내에선 얼리 엔트리가 낯설다. 2004년 연세대 3학년이던 이정석(SK)이 신인드래프트에 참가해 성공사례로 남는 등 그 후로도 몇 차례 얼리 엔트리가 있었다. 그러나 이는 개인의 의지보다는 대학에서 선수 자원이 많을 경우 순환 차원에서 신인드래프트에 내보낸 것이었을 뿐, 아직까지는 4학년 때 프로에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대학 3학년 때인 지난해 신인드래프트에 나선 정효근(한양대→전자랜드)과 허웅(연세대→동부)이 ‘2015∼2016 KCC 프로농구’에서 각 팀의 주축선수로 당당하게 자리 잡으면서 국내 농구계에서도 얼리 엔트리에 대한 시각이 바뀌고 있다. ‘조금이라도 빨리 프로에 진출하는 것이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삼일상고 3학년 송교창이 2015 KBL 신인드래프트 참가를 결정하면서 다시 한 번 얼리 엔트리가 주목받고 있다.
● 정효근-허웅이 생각하는 얼리 엔트리의 이점
1년 빨리 프로가 됐다고 기량이 급성장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성장 폭의 차이는 분명하다. 정효근과 허웅은 동기들이 대학무대에서 ‘에이스 놀이’를 하고 있을 때, 프로 선배들과 경쟁하고 외국인선수들과 부딪치면서 프로의 생리를 체험했다. 정효근은 “대학 때는 팀이 나에게 맞추는 농구를 했다. 그래서 자만하기도 했다. 프로에선 내가 팀에 맞추는 농구를 배우고 있다. 큰 동기부여가 됐다. 내가 살아남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달았다”고 말했다. 이어 “동기들이 올해 겪어야 할 어려움을 나는 미리 경험했다. 1년을 벌었다. 대학 관계자들은 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1년 더 빨리 올 걸’하는 마음이 들 정도다. 2학년을 마치고 오는 것이 동기부여나 성장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얼리 엔트리 예찬론을 폈다.
허웅은 “팀 수비, 전술에 대한 이해나 프로무대에 빨리 적응하는 데는 분명 큰 이점이 있다”며 얼리 엔트리의 이점에 동의했다. 다만 허웅은 “장단점이 있다. 프로 적응을 빨리 할 수는 있지만, 대학에선 내가 중심이 되는 농구를 할 수 있다. 그런 기회는 많지 않다. 또 대학생활도 누리지 못한다. 아직 대학생활을 하고 있는 동생(허훈·연세대 2학년)이 가끔 부러울 때가 있다”며 웃었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Copyright © 스포츠동아.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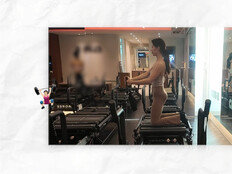







![안선영, 사기·횡령 피해 고백 “母 암수술 중인데도 방송해” [종합]](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1/28/133253626.1.jpg)


![제이제이, 영하 13도에 옷 다 벗고 비키니만…안 춥나?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1/28/133246348.3.jpg)

![원진아 맞아? 숏커트+안경…못 알아볼 뻔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1/28/133253052.1.jpg)



![박세리, ‘김승수와 결혼’ 가짜뉴스에 “황당, 씁쓸” [DA:이슈]](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6/01/28/133245608.1.jpg)
























![장예원 주식 대박 터졌다, 수익률 무려 323.53% [DA★]](https://dimg.donga.com/a/110/73/95/1/wps/SPORTS/IMAGE/2023/12/01/122442320.1.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