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아무리 실력파 외야수라도 라이트에 공이 들어가면 속수무책이다. 특히 사직구장은 조명의 범위가 넓어 1·3루 내야 땅볼 때도 힘들 때가 있다. [스포츠동아 DB]](https://dimg.donga.com/wps/SPORTS/IMAGE/2010/05/28/28686912.2.jpg)
제 아무리 실력파 외야수라도 라이트에 공이 들어가면 속수무책이다. 특히 사직구장은 조명의 범위가 넓어 1·3루 내야 땅볼 때도 힘들 때가 있다. [스포츠동아 DB]
라이트 심술…외야 황당 사고 어떻게 봐야할까
빛에 가려 수비 미스…선수 탓할수 없어
베테랑 외야수는 타구 안보고 위치 판단
사직구장 조명 범위 넓어 내야도 요주의
투수가 던진 공이 타자 배트 중심에 맞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빨랫줄처럼 뻗어나간다. 그런데 하필 외야수 정면 방향. 어, 그러나 달려들던 외야수는 돌연 날아오는 공을 피하듯 몸을 움츠려 버린다. 타구는 외야수 주변에 떨어져 순식간에 2루타 이상 장타로 둔갑한다. 이럴 때 흔히 TV에서 나오는 말. “아, 타구가 라이트(조명)에 들어갔네요. 저건 어쩔 수 없어요.”
승부의 여신은 짓궂어서 툭하면 결정적 고비에서 이런 난감한 상황을 연출한다. 그러면 정말 조명에 들어가 버린 타구는 불가항력일까. 인간이 대처 가능한 영역은 어디까지일까. 인재일까, 천재일까? 외야수비의 대가였던 SK 전준호 코치에게 들어봤다.
○투수가 그런 타구 안 나오도록 던질 수밖에 없다?
일단 기본적으로 타구가 라이트에 들어가면 못 잡는다 해서 외야수를 탓할 수 없다. 특정시간대에 특정각도로 타구가 뻗어나가면 필연적으로 조명에 들어간다. 그 범위의 편차는 있겠지만 이는 세상 야구장 어디서나 공통된 현상이란다. 이렇게 되면 인간의 눈은 빛을 견디지 못한다. 공이 그 안에 들어가면 사라지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낮경기의 강한 햇살도 비슷한 효과를 유발한다. 단 낮경기는 선글라스나 눈밑에 칠하는 아이패치로 일정 부분 대응할 수 있다.
베테랑 외야수는 타구가 조명에 들어가면 계속 공을 보는 걸 빨리 포기하고 낙하지점을 추측한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공을 봐서 캐치를 시도한다. 경험 없는 선수나 평소처럼 끝까지 공을 보려다 눈이 견디지 못해 주저앉는 것이다. 라이트에 들어가는 타구는 좌·우익수에만 해당한다. 중견수는 각도상 있을 수 없다. 27일 두산전에서 롯데 중견수 전준우의 수비는 두산 주자들을 속이려는 페인트로 봐야 된다.
다만 석양이나 흰옷을 입은 관중들로 인해 공이 숨어버릴 땐 다르다. 이땐 오히려 공을 끝까지 봐서 낙하지점을 포착해야 된다.
○사직구장은 특히 요주의
특히 롯데의 홈구장 사직은 조명의 범위가 넓어서 타구가 거기 들어갈 확률이 그만큼 높다. 심지어 1·3루 내야 땅볼 때에도 그런 현상이 벌어진단다. 얼핏 롯데 3루수 이대호의 어이없는 실수로 보여도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얘기다. 1루수가 평범한 송구를 못 잡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심지어 눈치 빠른 우타자는 홈 플레이트의 그림자를 보고 포수의 앉은 위치를 파악하기도 한다.
결론. 빛에 들어간 타구는 누구도 탓할 수 없는 ‘자연재해’다. 단 대처하기에 따라 피해를 최소화할 순 있다. 유일한 솔루션은 경험이다.
문학 | 김영준 기자 gatzby@donga.com
Copyright © 스포츠동아.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하기

![이주승 역시나 탈탈 털렸다…카니에 휘둘리다 ‘텅 빈 동공’ [DA클립]](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3/04/133466151.1.jpg)


![이영애, 인파 뚫고 손미나 응원 갔다…“의리의 여왕” [SD셀픽]](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3/05/133471339.1.png)
![4년 조용하던 이휘재…갑자기 다시 뜬 이유 [굳이 왜?]](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3/05/133471330.1.jpg)
![산다라박 “마약 안 했다”…박봄 글 파장 [굳이 왜?]](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3/05/133471444.1.jpg)

![기안84, ‘기안장2’ 스태프 150명 사비 선물…미담 터졌다 [SD톡톡]](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3/05/133471769.1.png)
![장원영, 블랙 민소매 입고 ‘심쿵’ 셀카…인형이 따로 없네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3/05/133469980.1.jpg)


![이지혜, SNS 규정 위반 경고 받았다…39만 팔로워 어쩌나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2/11/133344737.1.png)
![[단독] 히말라야 편성 갈등? jtbc “우리와 무관한 행사”](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3/05/133472616.1.jpg)



![트와이스 지효, ‘속옷 노출’ 파격 시스루…뒤태 더 아찔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3/05/133471107.1.jpg)
![“애둘맘 맞아?” 홍영기, 아슬아슬 끈 비키니 입고 뽐낸 몸매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3/05/133467346.1.jpg)


![캐나다 行 ‘이휘재♥’ 문정원, 4년 만 근황…“어느새 3월” [DA이슈]](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6/03/04/133459538.1.jpg)
![문가영, 어깨라인 드러낸 오프숄더…청초 비주얼 [DA★]](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6/03/03/133452786.1.jpg)

![샤라포바, 이탈리아서 뽐낸 수영복 자태…몸매 여전해 [DA★]](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6/03/03/133452477.1.jpg)
![“콧구멍 변해” 백지영, 성형 10억설 고백…정석원 ‘연골 약속♥’ [DA클립]](https://dimg.donga.com/a/140/140/95/1/wps/SPORTS/IMAGE/2026/03/05/133472619.1.jpg)
![이시안 수위 조절 실패…코 성형 구축설+김고은 겹지인 고백 [DA클립]](https://dimg.donga.com/a/140/140/95/1/wps/SPORTS/IMAGE/2026/03/05/133471521.1.jpg)
![‘구독자 100만 임박’ 김선태, 영향력 어디까지…사칭 계정 등장 [DA이슈]](https://dimg.donga.com/a/140/140/95/1/wps/SPORTS/IMAGE/2026/03/05/133471314.3.jpg)
![‘1세대 톱모델’ 홍진경·이소라, 파리서 ‘본업 모먼트’ 포착 [DA★]](https://dimg.donga.com/a/140/140/95/1/wps/SPORTS/IMAGE/2026/03/05/133471351.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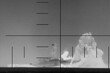







![장예원 주식 대박 터졌다, 수익률 무려 323.53% [DA★]](https://dimg.donga.com/a/110/73/95/1/wps/SPORTS/IMAGE/2023/12/01/122442320.1.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