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림픽축구대표팀 김학범 감독과 선수들. 사진제공 | 대한축구협회
김학범 감독이 이끄는 올림픽축구대표팀이 가나와 2차례 평가전을 모두 마쳤다. 이제는 선택의 시간이다. 누구를 데리고 도쿄로 갈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이번 서귀포 소집훈련 및 평가전에 함께한 선수들은 기도하는 심정으로 김 감독의 결정을 기다릴 뿐이다.
연령제한(23세 이하)이 있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주관의 올림픽 남자축구 엔트리는 18명이다. 국제축구연맹(FIFA) 주관의 월드컵 엔트리(23명)보다 5명이나 적다. 또 아시아축구연맹(AFC) 주관의 아시안컵 엔트리도 23명이다. 2019년 한국이 사상 첫 준우승을 달성한 20세 이하(U-20) 월드컵은 21명,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주관의 아시안게임은 20명이다. 이렇게 비교해보면 올림픽 축구의 엔트리가 얼마나 적은지 확연해진다.
3일에 한 번꼴로 경기를 치르는 빡빡한 일정에다가 부상위험이 높은 종목의 특성을 고려하면 엔트리를 늘리는 게 마땅하다. 올림픽 예선을 겸하는 AFC U-23 챔피언십 엔트리는 23명인데, 정작 본선에선 5명이나 줄어든다. 한국을 비롯해 올림픽에 관심이 많은 국가들에선 엔트리 확대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하지만 FIFA와 IOC는 애써 외면하고 있다. 월드컵에 ‘올인’하는 FIFA 입장에선 올림픽 축구의 규모 확대가 달갑지 않다. IOC도 다른 종목들과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올림픽 축구에는 ‘와일드카드’ 제도가 있다. 1996년 애틀랜타올림픽부터 적용된 이 제도는 2016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까지는 24세 이상 3명의 선수를 선택할 수 있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1년 연기된 이번 도쿄올림픽에는 24세 이하의 연령제한에 25세 이상 와일드카드 3명의 출전이 가능해졌다. 최근 이름이 거론된 황의조(29·보르도), 권창훈(27·수원 삼성), 김민재(25·베이징 궈안)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와일드카드 3장을 빼면 실제로 해당 연령에서 뽑을 수 있는 인원은 겨우 15명뿐이다. 또 골키퍼를 제외한 필드 플레이어로 범위를 좁히면 더욱 살벌해진다. 2명의 골키퍼가 포함되기에 필드 플레이어 숫자는 불과 13명이다.
김 감독의 고민의 깊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본선 경쟁력이 약할 것 같은 포지션에 와일드카드를 염두에 둬야 하고, 재능 있는 선수들이 상당수 포진한 중원을 추리는 작업 또한 쉽지 않다. 또 포지션별 균형도 고려해야 한다. 이런 까닭에 올림픽 본선에선 체력과 멀티 능력을 갖춘 선수들이 우선순위에 들 수밖에 없다.
올림픽 엔트리에 포함된다는 것은 그야말로 바늘구멍 통과하기만큼이나 어렵다. 출전 자체가 가문의 영광이다. 그동안 소집훈련을 통해 다양한 선수들을 테스트해온 김 감독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하다.
서귀포 | 최현길 기자 choihg2@donga.com
Copyright © 스포츠동아.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하기





![[단독] 장수원 아내 누구? “같은 아파트에…”](https://dimg.donga.com/a/158/89/95/1/wps/SPORTS/IMAGE/2021/06/13/107411229.2.jpg)









![‘두쫀쿠’는 좋겠다, 장원영이 이렇게 사랑해줘서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1/02/133080468.3.jpg)



![변요한, ♥티파니와 새해 맞이? 숟가락에 비친 ‘커플 실루엣’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1/02/133080789.3.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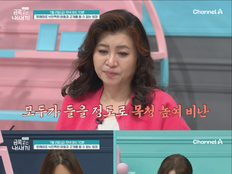




![“깜짝이야” 효민, 상의 벗은 줄…착시 의상에 시선 집중 [DA★]](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5/12/30/133061528.3.jpg)
![몸집 키운 바이포엠, 김우빈♥신민아 소속사 인수 [공식]](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5/12/31/133070547.1.png)
![대체 왜 이래? SBS 연예대상, 지석진 향한 기만의 역사 (종합)[DA:이슈]](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5/12/31/133070320.3.jpg)




![이민정, 딸과 첫 해외여행서 응급 상황…“♥이병헌이 밤새 간호” [DA★]](https://dimg.donga.com/a/140/140/95/1/wps/SPORTS/IMAGE/2026/01/02/133081053.3.jpg)
![변요한, ♥티파니와 새해 맞이? 숟가락에 비친 ‘커플 실루엣’ [DA★]](https://dimg.donga.com/a/140/140/95/1/wps/SPORTS/IMAGE/2026/01/02/133080789.3.jpg)























![김남주 초호화 대저택 민낯 “쥐·바퀴벌레와 함께 살아” [종합]](https://dimg.donga.com/a/110/73/95/1/wps/SPORTS/IMAGE/2025/05/27/131690415.1.jpg)
![이정진 “사기 등 10억↑ 날려…건대 근처 전세 살아” (신랑수업)[TV종합]](https://dimg.donga.com/a/110/73/95/1/wps/SPORTS/IMAGE/2025/05/22/131661618.1.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