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동행. 광저우아시안게임 야구대표팀을 함께 이끌고 있는 조범현 감독과 김시진 투수코치의 헌신을 표현하는데 이보다 잘 어울리는 말이 있을까.
조 감독은 올시즌 도중 고심 끝에 자신보다 두 살 많고 1년 선배인 김시진 감독에게 투수코치를 부탁했다. 김 코치의 고민도 컸다. 그러나 ‘투수코치를 맡아달라고 하기까지 조 감독이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까’ 하는 생각에 ‘함께 광저우에 가자’고 결심했다.
부탁한 쪽이나 승낙한 쪽 모두 어려운 결정이었다. 2006년 제1회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은 첫 대회라는 상징성 때문에 각팀 감독들이 모두 코치로 참여했다. 그러나 2008베이징올림픽 예선을 끝으로 대표팀 코치 중 현역 감독은 없었다. 특히 선배 감독이 후배 감독이 사령탑을 맡은 대표팀의 코치로 함께하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조 감독과 김 코치는 야구를 시작한 이후로 학생시절과 프로 모두 같은 팀에서 뛴 적이 없다. 같은 대구에서 태어난 것밖에는 인연을 찾기 힘들다. 그러나 고향 선후배로 두 사람은 항상 서로를 반겼다. 사석에서 조 감독은 김 코치에게 “시진이 형”이라고 부른다. 김 코치는 조 감독이 1년 후배지만 같은 프로팀 감독으로 예우하며 “조 감독”이라고 한다. 그만큼 두 사람은 깊은 정을 나누는 사이다.
평소 절친한 동기라 해도 같은 팀에서 감독, 코치로 만나면 사이가 틀어지기 쉬운 게 사람 관계다. 그러나 대표팀에서 조 감독과 김 코치는 완벽한 호흡을 보여주고 있다. 김 코치는 “난 조 감독 도우미”라고 말하며 자신을 낮춘다. 조 감독도 깍듯하게 김 코치를 예우하고 있다. 29일 김 코치는 투수들의 훈련을 돕기 위해 배트를 들고 스윙연습을 했다. 지켜보던 조 감독은 “우리 김 감독님 고등학교 때 타격도 정말 잘하셨다. 배트를 길게 잡고 얼마나 잘 치시던지”라며 미소를 지었다.
김 코치는 “내년 시즌이 감독 계약 마지막 해다. 왜 고민이 없었겠냐. 그러나 조 감독을 진심으로 돕고 싶었다. 우리가 선수는 아니지만 코치도 영광스러운 국가대표다”라고 말하며 밝게 웃었다.
사직 |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조 감독은 올시즌 도중 고심 끝에 자신보다 두 살 많고 1년 선배인 김시진 감독에게 투수코치를 부탁했다. 김 코치의 고민도 컸다. 그러나 ‘투수코치를 맡아달라고 하기까지 조 감독이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까’ 하는 생각에 ‘함께 광저우에 가자’고 결심했다.
부탁한 쪽이나 승낙한 쪽 모두 어려운 결정이었다. 2006년 제1회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은 첫 대회라는 상징성 때문에 각팀 감독들이 모두 코치로 참여했다. 그러나 2008베이징올림픽 예선을 끝으로 대표팀 코치 중 현역 감독은 없었다. 특히 선배 감독이 후배 감독이 사령탑을 맡은 대표팀의 코치로 함께하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조 감독과 김 코치는 야구를 시작한 이후로 학생시절과 프로 모두 같은 팀에서 뛴 적이 없다. 같은 대구에서 태어난 것밖에는 인연을 찾기 힘들다. 그러나 고향 선후배로 두 사람은 항상 서로를 반겼다. 사석에서 조 감독은 김 코치에게 “시진이 형”이라고 부른다. 김 코치는 조 감독이 1년 후배지만 같은 프로팀 감독으로 예우하며 “조 감독”이라고 한다. 그만큼 두 사람은 깊은 정을 나누는 사이다.
평소 절친한 동기라 해도 같은 팀에서 감독, 코치로 만나면 사이가 틀어지기 쉬운 게 사람 관계다. 그러나 대표팀에서 조 감독과 김 코치는 완벽한 호흡을 보여주고 있다. 김 코치는 “난 조 감독 도우미”라고 말하며 자신을 낮춘다. 조 감독도 깍듯하게 김 코치를 예우하고 있다. 29일 김 코치는 투수들의 훈련을 돕기 위해 배트를 들고 스윙연습을 했다. 지켜보던 조 감독은 “우리 김 감독님 고등학교 때 타격도 정말 잘하셨다. 배트를 길게 잡고 얼마나 잘 치시던지”라며 미소를 지었다.
김 코치는 “내년 시즌이 감독 계약 마지막 해다. 왜 고민이 없었겠냐. 그러나 조 감독을 진심으로 돕고 싶었다. 우리가 선수는 아니지만 코치도 영광스러운 국가대표다”라고 말하며 밝게 웃었다.
사직 |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Copyright © 스포츠동아.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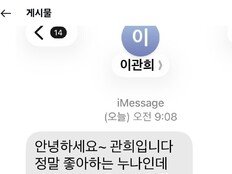


![보아 ‘25년 동행’ SM 떠난 근황…“잘 지내고 있어요”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1/30/133265326.1.jpg)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손으로 겨우 가린 파격 노출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1/30/133264572.3.jpg)


![‘문원♥’ 신지, 5월 결혼 앞두고 더 예뻐졌네…청순미 물씬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1/30/133263695.3.jpg)

![한국연예제작자협회 “드림콘 2026 홍콩, 中 주관사 일방적 연기” [전문]](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1/31/133270638.1.jpg)


![이정현, ♥ 의사 남편 이벤트에 ‘뽀뽀 백만번’ (편스토랑)[TV종합]](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1/31/133270675.1.jpg)


![김혜수 근황 터졌다, ‘케데헌’ 더피 품은 여배우 [DA★]](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6/01/29/133262013.1.jpg)
![트와이스 지효, 역대급 여신 비주얼 속옷 화보 [화보]](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6/01/30/133263239.1.jpg)
![나나, 창문에 비친 속옷 실루엣…과감한 노출 [DA★]](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6/01/30/133266036.1.jpg)



![김건모, 복귀 앞두고 초췌한 근황 [DA★]](https://dimg.donga.com/a/140/140/95/1/wps/SPORTS/IMAGE/2026/01/30/133266509.3.jpg)
![나나, 창문에 비친 속옷 실루엣…과감한 노출 [DA★]](https://dimg.donga.com/a/140/140/95/1/wps/SPORTS/IMAGE/2026/01/30/133266036.1.jpg)

















![장예원 주식 대박 터졌다, 수익률 무려 323.53% [DA★]](https://dimg.donga.com/a/110/73/95/1/wps/SPORTS/IMAGE/2023/12/01/122442320.1.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