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핸드볼 윤경신
쿠웨이트전 편파 판정으로 억울한 패배
AG 6번 출전 중 유일하게 金 못딴 대회
“예능프로라도 나가 핸드볼 알리고 싶다”
두산 윤경신 감독(41)은 한 방송사의 2014인천아시안게임 해설위원으로서 매일 선학핸드볼경기장을 찾는다. 윤 감독이 잠깐 볼일이라도 보려고 복도로 나가면 사진촬영을 부탁하는 사람들 덕분에 곧장 가기가 힘들다. 딸들을 데려온 한 아버지는 이렇게 말한다. “너희들은 모르지? 윤경신 감독이 어떤 선수였는지.” 대만대표팀 선수도 윤 감독을 알아보고 인증샷을 요청한다. 오히려 윤 감독의 명성은 외국선수들이 더 알아주는 것 같았다.
언젠가부터 ‘레전드’란 수식어에도 인플레가 붙고 있는 세태다. 그러면서 정작 진짜 레전드는 잘 몰라보는 게 세상인심이다. ‘축구에 차범근이 있었다면 핸드볼에 윤경신이 있었다’라고 정리해도 절대 과언이 아닌 것이 윤 감독의 현역 인생이었다.
● 아시안게임 6번 출전해 5번 금메달
윤 감독은 고교 2학년 때 첫 국가대표로 뛴 1990베이징아시안게임부터 2010광저우아시안게임까지 6회 연속 출전했다. 윤 감독은 “첫 금메달 때는 후보로 뛰며 선배들이 어떻게 금메달을 따는지를 지켜봤다. 나에게 있어 가장 기억나는 아시안게임은 1994년 히로시마대회다”라고 회고했다. 경희대 3학년인 1994년 대회부터 명실상부한 한국 핸드볼의 에이스로서 국제무대 활약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후 1998년 방콕아시안게임,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까지 거칠 것이 없었다. 이미 1996년 독일 분데스리가에 진출해 무려 8차례나 득점왕에 오른 윤 감독을 아시아 레벨에서 막기란 불가능했다. 윤 감독은 독일에서 통산 2751골을 넣었는데 분데스리가 최다 득점 기록이다. 1995년과 1997년 세계선수권 득점왕이자 2004년 아테네올림픽 득점왕이었다. 2001년에는 국제핸드볼협회(IHF) 올해의 선수로 뽑혔다.
이런 윤 감독이 유일하게 금메달을 못 땄던 곳이 2006도하아시안게임이었다. 아시아핸드볼연맹을 장악한 쿠웨이트가 압력을 넣은 심판의 편파판정 탓에 한국은 억울하게 금메달을 빼앗겼다. 당시 윤 감독의 “핸드볼 신(神)이 와도 이길 수 없는 경기”라는 말은 두고두고 회자됐다. 윤 감독은 4년 후 광저우에서 37세 나이에 다시 대표팀으로 돌아와 기어코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광저우아시안게임 개·폐막식 기수로 선정돼 더욱 기억에 남는다.
● 국가를 위해, 핸드볼을 위해
그러나 정작 그의 조국에서 핸드볼은 비인기종목이었다. 독일에서 고독하게 이뤄낸 영웅적 활약상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젊은 혈기에 모국에 서운함을 가졌던 적도 있었다. 마침 독일에서 귀화 제의까지 들어왔다. 그러나 윤 감독은 자기를 몰라주는 조국을 버리지 않았다. “네가 독일에서 핸드볼을 잘할 수 있도록 키워준 곳인 한국의 고마움을 알아야 된다”는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굳혔다.
문제의 2006도하아시안게임도 원래 윤 감독이 뛸 수 없는 대회였다. 독일 소속팀이 강력하게 차출을 반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시안게임 때 소속팀의 경기 스케줄이 없는 사실을 확인한 윤 감독은 팀에 알리지 않고, 홀로 자비를 들여 대표팀을 찾아갔다. 소속팀은 돌아온 윤경신을 질책하는 대신 “판정이 왜 그 모양이냐?”고 동정을 해줬다.
2012런던올림픽을 끝으로 대표팀에서 은퇴한 뒤 2013년부터 두산 감독을 맡았다. 윤 감독의 생각은 한국 핸드볼의 미래에 쏠려있다. “핸드볼의 위기를 논하는데 어떻게 하면 핸드볼을 국민들께 알릴 수 있는지를 나부터 생각하고 있다. 필요하다면 예능프로라도 나가 핸드볼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깨우고 싶다”고 말했다.<끝>
인천|김영준 기자 gatzby@donga.com 트위터 @matsri21
쿠웨이트전 편파 판정으로 억울한 패배
AG 6번 출전 중 유일하게 金 못딴 대회
“예능프로라도 나가 핸드볼 알리고 싶다”
두산 윤경신 감독(41)은 한 방송사의 2014인천아시안게임 해설위원으로서 매일 선학핸드볼경기장을 찾는다. 윤 감독이 잠깐 볼일이라도 보려고 복도로 나가면 사진촬영을 부탁하는 사람들 덕분에 곧장 가기가 힘들다. 딸들을 데려온 한 아버지는 이렇게 말한다. “너희들은 모르지? 윤경신 감독이 어떤 선수였는지.” 대만대표팀 선수도 윤 감독을 알아보고 인증샷을 요청한다. 오히려 윤 감독의 명성은 외국선수들이 더 알아주는 것 같았다.
언젠가부터 ‘레전드’란 수식어에도 인플레가 붙고 있는 세태다. 그러면서 정작 진짜 레전드는 잘 몰라보는 게 세상인심이다. ‘축구에 차범근이 있었다면 핸드볼에 윤경신이 있었다’라고 정리해도 절대 과언이 아닌 것이 윤 감독의 현역 인생이었다.
● 아시안게임 6번 출전해 5번 금메달
윤 감독은 고교 2학년 때 첫 국가대표로 뛴 1990베이징아시안게임부터 2010광저우아시안게임까지 6회 연속 출전했다. 윤 감독은 “첫 금메달 때는 후보로 뛰며 선배들이 어떻게 금메달을 따는지를 지켜봤다. 나에게 있어 가장 기억나는 아시안게임은 1994년 히로시마대회다”라고 회고했다. 경희대 3학년인 1994년 대회부터 명실상부한 한국 핸드볼의 에이스로서 국제무대 활약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후 1998년 방콕아시안게임,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까지 거칠 것이 없었다. 이미 1996년 독일 분데스리가에 진출해 무려 8차례나 득점왕에 오른 윤 감독을 아시아 레벨에서 막기란 불가능했다. 윤 감독은 독일에서 통산 2751골을 넣었는데 분데스리가 최다 득점 기록이다. 1995년과 1997년 세계선수권 득점왕이자 2004년 아테네올림픽 득점왕이었다. 2001년에는 국제핸드볼협회(IHF) 올해의 선수로 뽑혔다.
이런 윤 감독이 유일하게 금메달을 못 땄던 곳이 2006도하아시안게임이었다. 아시아핸드볼연맹을 장악한 쿠웨이트가 압력을 넣은 심판의 편파판정 탓에 한국은 억울하게 금메달을 빼앗겼다. 당시 윤 감독의 “핸드볼 신(神)이 와도 이길 수 없는 경기”라는 말은 두고두고 회자됐다. 윤 감독은 4년 후 광저우에서 37세 나이에 다시 대표팀으로 돌아와 기어코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광저우아시안게임 개·폐막식 기수로 선정돼 더욱 기억에 남는다.
● 국가를 위해, 핸드볼을 위해
그러나 정작 그의 조국에서 핸드볼은 비인기종목이었다. 독일에서 고독하게 이뤄낸 영웅적 활약상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젊은 혈기에 모국에 서운함을 가졌던 적도 있었다. 마침 독일에서 귀화 제의까지 들어왔다. 그러나 윤 감독은 자기를 몰라주는 조국을 버리지 않았다. “네가 독일에서 핸드볼을 잘할 수 있도록 키워준 곳인 한국의 고마움을 알아야 된다”는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굳혔다.
문제의 2006도하아시안게임도 원래 윤 감독이 뛸 수 없는 대회였다. 독일 소속팀이 강력하게 차출을 반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시안게임 때 소속팀의 경기 스케줄이 없는 사실을 확인한 윤 감독은 팀에 알리지 않고, 홀로 자비를 들여 대표팀을 찾아갔다. 소속팀은 돌아온 윤경신을 질책하는 대신 “판정이 왜 그 모양이냐?”고 동정을 해줬다.
2012런던올림픽을 끝으로 대표팀에서 은퇴한 뒤 2013년부터 두산 감독을 맡았다. 윤 감독의 생각은 한국 핸드볼의 미래에 쏠려있다. “핸드볼의 위기를 논하는데 어떻게 하면 핸드볼을 국민들께 알릴 수 있는지를 나부터 생각하고 있다. 필요하다면 예능프로라도 나가 핸드볼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깨우고 싶다”고 말했다.<끝>
인천|김영준 기자 gatzby@donga.com 트위터 @matsri21
Copyright © 스포츠동아.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하기

![‘1세대 톱모델’ 홍진경·이소라, 파리서 ‘본업 모먼트’ 포착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3/05/133471351.1.jpg)
![“콧구멍 변해” 백지영, 성형 10억설 고백…정석원 ‘연골 약속♥’ [DA클립]](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3/05/133472619.1.jpg)

![[단독] 히말라야 편성 갈등? jtbc “우리와 무관한 행사”](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3/05/133472616.1.jpg)


![이시안 수위 조절 실패…코 성형 구축설+김고은 겹지인 고백 [DA클립]](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3/05/133471521.1.jpg)



![이주연, 9년 전 안 믿겨…누드톤 각선미+무결점 바디라인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3/05/133473742.1.jpg)


![기안84, ‘기안장2’ 스태프 150명 사비 선물…미담 터졌다 [SD톡톡]](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3/05/133471769.1.png)
![‘구독자 100만 임박’ 김선태, 영향력 어디까지…사칭 계정 등장 [DA이슈]](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3/05/133471314.3.jpg)





![캐나다 行 ‘이휘재♥’ 문정원, 4년 만 근황…“어느새 3월” [DA이슈]](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6/03/04/133459538.1.jpg)
![문가영, 어깨라인 드러낸 오프숄더…청초 비주얼 [DA★]](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6/03/03/133452786.1.jpg)

![샤라포바, 이탈리아서 뽐낸 수영복 자태…몸매 여전해 [DA★]](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6/03/03/133452477.1.jpg)
![장희진, 청순 미모에 그렇지 못한 몸매…애플힙까지 ‘완벽’ [DA★]](https://dimg.donga.com/a/140/140/95/1/wps/SPORTS/IMAGE/2026/03/05/133474200.1.jpg)
![‘환승연애4’ 박현지 민낯도 완벽한데 “얼굴 보고 ‘현타’” [DA클립]](https://dimg.donga.com/a/140/140/95/1/wps/SPORTS/IMAGE/2026/03/05/133474117.1.jpg)
![김연경 “이상형=일편단심 조인성♥, 몇 번 만나” 어머 세상에 [DA클립]](https://dimg.donga.com/a/140/140/95/1/wps/SPORTS/IMAGE/2026/03/05/133474072.1.jpg)



![[사커피플] 전북 ‘더블’ 주연에서 안양 수호신으로 변신…출전에 늘 목말랐던 ‘전북 출신’ GK 김정훈, “더 차분하게 더 당당하게”](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6/03/05/133470443.1.jpg)

![[SD 수원 인터뷰] 현대건설전서 살아난 레베카, 반등 원동력은 경기장 찾은 가족의 힘](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6/03/05/133474843.1.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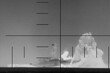






![장예원 주식 대박 터졌다, 수익률 무려 323.53% [DA★]](https://dimg.donga.com/a/110/73/95/1/wps/SPORTS/IMAGE/2023/12/01/122442320.1.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