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이 화려하다고 한국에서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로또’라 불리는 용병 스카우트 경쟁이지만 용병들도 사람인 이상 한국야구에 느끼는 것도, 할 말도 많다. [스포츠동아 DB]](https://dimg.donga.com/wps/SPORTS/IMAGE/2011/05/27/37569123.2.jpg)
경력이 화려하다고 한국에서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로또’라 불리는 용병 스카우트 경쟁이지만 용병들도 사람인 이상 한국야구에 느끼는 것도, 할 말도 많다. [스포츠동아 DB]
한국야구, 이래서 반했어!
ML+日야구 묘한 매력…가족적 분위기 감동
타자들 배트컨트롤·투수들 제구력 매우 좋아
한국문화, 이것은 불편해!
덕아웃 등 사적공간에 많은 사람들 들락날락
선후배 위계질서 낯설어…언어장벽도 걸림돌
삼성 오치아이 투수코치는 한국야구에 대해 “화끈한 공격력을 앞세운 메이저리그, 현미경과 같은 세밀한 야구를 하는 일본리그가 뒤섞여 묘한 매력을 뿜어내고 있다”고 표현했다. 야구의 변방, 그러나 2008 베이징올림픽 금메달과 2009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준우승이라는 쾌거를 거둔 한국야구를 바라보는 8개 구단 용병들의 시선을 살펴봤다.
○한국야구 수준에 놀라다
한국땅을 밟는 용병은 한국, 그리고 한국야구에 대한 기초지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두산 니퍼트는 “LG라는 팀에 에드가 곤잘레스가 뛰었다는 것만 알았을 뿐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솔직히 전혀 알지 못했다”고 고백했다. 다른 용병들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한국야구를 접한 후 용병들의 반응은 한결 같다. “놀랍다(Surprise)!”다.
올해로 3년째 KIA에 몸담고 있는 로페즈는 “현재 한국프로야구의 수준은 트리플A와 메이저리그 중간쯤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는 상대적으로 선수층이 얇기 때문이지 A급 선수들은 빅리그에서도 충분히 통할 수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번 시즌 한국무대를 처음 경험한 두산 페르난도는 “스트라이크존이 메이저리그보다 좁고 정확(평등)하다(메이저리그에는 그렉 매덕스존, 알버트 푸홀스존과 같이 스타플레이어에게만 적용되는 암묵적인 스트라이크존이 있을 정도로 심판이 유연한 판정을 내린다고 알려져 있다)”며 “빅리그에서는 파워히터들이 힘으로 승부하는 반면 한국 타자들은 컨택트능력이 좋고 볼을 커트해내는 배트컨트롤이 매우 뛰어나다”고 했다. 한국 타자들의 커트능력에는 SK 매그레인과 니퍼트도 “어떤 볼을 던져도 커트해내 투수를 괴롭힌다. 한국 투수들의 제구력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며 혀를 내둘렀다.
○한국의 정에 반하다
흔히 용병은 ‘용병이기 때문에 용병다워야 한다’고 말한다. 많은 돈을 투자해 영입하는 만큼 제 역할을 해내지 못하면 하루아침에 내쳐지는 게 현실이다. 그러나 한국은 정(情)이 많이 나라다. 용병을 단순히 외국인선수가 아닌 팀의 동료로 가슴에 품는다. 실제 KIA 양현종은 지난해 6월 2일 프로 데뷔 이후 첫 완봉승을 거둔 후 예전 한솥밥을 먹었던 고(故) 호세 리마를 떠올리며 눈시울을 붉힌 바 있다.
SK를 거쳐 삼성에 몸담고 있는 카도쿠라는 이런 한국 선수들의 따뜻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한국 3년차이기도 하고 선수들이 나를 더 이상 일본인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는 농담을 건넬 정도로 깊은 교감을 나누고 있다. LG 리즈도 “어떤 곳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가족 같은 선수단 분위기가 좋다. 메이저리그와 마이너리그에서 뛰어봤지만 이런 느낌을 받은 적이 없다”고 기뻐했다. SK 글로버는 “선수들이 나를 ‘(글)로버 형’이라고 부르며 90도로 인사한다. 처음에는 생소했는데 지금은 그 관계가 팀워크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며 “친화력도 대단하다. 영어에 능통하지 않음에도 상황에 맞는 위트 있는 단어를 구사하며 적극적으로 다가온다”고 귀띔했다.
이 뿐만 아니다. 용병들의 눈에는 한국 선수들의 위계질서와 유대관계가 마냥 신기한 모양이었다. 한화 데폴라는 “류현진과 같은 대스타도 선배들의 지시에 복종하고 심부름을 하는 모습에 놀랐다”고 했고, KIA 트레비스, LG 주키치도 소속 팀뿐 아니라 다른 팀과의 선후배간 엄격한 위계질서에 유난히 호기심을 드러냈다.
○한국문화 이런 건 불편하다
그러나 ‘끈끈한’ 한국정서가 마냥 좋을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특히 미국이나 일본무대를 오랫동안 경험한 선수들은 생경한 분위기에 연신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다.
롯데 코리는 “선수단 분위기가 가족적이고 편하지만 그게 큰 장점이자 때론 나쁜 점이 되는 것 같다”고 했고, 넥센 알드리지도 “미국에서는 상대팀 선수들이 원정팀 클럽하우스에 들어오는 일이 없을 뿐더러 함께 밥을 먹지도 않는다. 그게 룰이다. 상대팀이라도 친한 선수들은 인사 정도만 하는데 한국은 다르더라. 좋고 나쁨을 떠나서 차이점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지만 클럽하우스에 드나드는 것은 아쉬운 모습”이라고 말했다.
롯데 사도스키 역시 “미국에서 뛴 경험 밖에 없어서인지 ‘미국 스타일’로 봤을 때 덕아웃과 트레이너실 등 선수들의 사적인 공간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는 게 불편하다”며 “때론 내가 어딜 가서 숨어야할지 고심할 정도”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트레비스는 “선수들이 심판들을 야구선배로 대하는 모습이 놀라웠다”며 선수와 심판의 관계에 대한 궁금증을 드러냈다. “가끔 마운드에서 혼잣말로 심판판정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내면 심판들이 불쾌해하는데 원래 한국고유의 정서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넥센 나이트는 “대타가 호명되면 그때 보호대를 착용하고 배트를 돌려보는 경우가 있는데 미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투수들도 인터벌이 미국에 비해 길고 주자가 있을 때 수비 측이든, 공격 측이든 사인을 내는 시간이 길다”며 “하지만 이닝이 바뀔 때는 심판들이 빨리 공수 교대하라는 제스처(손짓)를 취한다. 언젠가 심판이 뭐라고 해서 내가 빨리 마운드에 나갔더니 포수가 아예 들어와 있지도 않더라(웃음). 어차피 공수교대 시간은 2분으로 정해져 있고 2분 안에 정확히 플레이할 준비만 마치면 된다. 1분을 쉬고, 1분 만에 나가는 것도 그 선수의 자유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언어 장벽이 한국무대 적응에 가장 걸림돌
하지만 무엇보다 용병들을 가장 괴롭히는 것은 언어장벽이다. 삼성 가코는 “그나마 구장에는 통역사가 있지만 구장을 벗어나면 식당과 같은 곳에서 말이 통하지 않는다”며 불편함을 호소했다. 가코뿐 아니다. 니퍼트, 페르난도도 “언어적인 부분이 가장 힘들다”고 입을 모았다. 소통의 어려움은 리그 적응을 저해하고 나아가 경기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카도쿠라는 “나는 다행히 몸담은 팀마다 일본인 코치가 있어 외톨이가 되지 않을 수 있었다”며 “다른 용병들은 말이 안 통하는 경우가 많아 답답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져도 끝까지 응원하는 팬들에 감동
용병들은 이밖에도 한국 야구팬들의 열정, 한국의 치안상태, 선수들의 특징에 대한 많은 얘기를 털어놨다. 오넬리, 리즈, 주키치, 페르난도, 가코 등은 한국 야구팬들의 응원열기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오넬리는 “미국은 양키스 같은 인기구단도 치어리더가 없다. 내 기억으로는 플로리다와 애틀랜타 딱 2개 팀에 치어리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8개 팀 모두 치어리더가 있고 열정적인 응원 팀이 있다는 사실에 매우 놀랐다”고 했다. 리즈도 “잘 던질 때 뿐만 아니라, 내가 잘 못 던져도 한결같이 응원해주는 팬들 문화가 처음엔 생소할 정도로 놀라웠다. 부진하면 홈 팬들도 야유를 하게 마련인데 한국은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고마움을 드러냈다.
주키치와 니퍼트는 서울의 규모, 치안상태 등에 대해 만족감을 나타냈다. 주키치는 “아시아무대에서 뛰는 게 처음이라 걱정됐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 한국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인지, 서울이 이렇게 큰 도시인지도 몰랐다”며 “임신 중인 아내와 함께 휴일에 경복궁에 간 적이 있는데 도심 한 가운데 그런 역사적인 고궁이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음식이나, 치안 같은 것도 걱정했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다. 니퍼트도 “서울시의 규모와 수많은 사람들에 놀랐고 전시상황이라고 들었는데 치안에도 전혀 문제가 없다”며 웃었다.
매그레인은 “미국에서는 선수들이 대부분 건강보조제 정도만 섭취하는데 한국 선수들은 눈에 좋아 먹는 약, 무릎에 좋아 먹는 약, 한약 등 상당히 많은 종류의 약을 먹더라”며 이색대답을 냈다.
홍재현 기자 (트위터 @hong927) hong927@donga.com
Copyright © 스포츠동아.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하기

![헬스하는 장원영, 하의가 반전…사랑스러워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2/20/133390001.1.jpg)

![유소영, 샤워타월 흘러내릴라…아찔한 호텔 셀카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2/20/133389454.1.jpg)

![서효림, 은은한 속옷 시스루…두바이 여신 등장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2/20/133390128.1.jpg)

![송혜교, 파격 숏컷도 청순하게…독보적 미모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2/21/133393690.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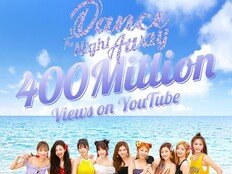
![한효주, 군인 출신 父 반전 실력…“엄마만 잘하는 줄” [SD셀픽]](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2/20/133389362.1.jpg)







![에스파 카리나, 수영복 자태…청초한 얼굴에 반전 건강美 [DA★]](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6/02/19/133381758.1.jpg)

![BTS 뷔, 사적 대화 털렸다…민희진 맞장구쳤다가 당황 [종합]](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6/02/20/133388567.1.jpg)
![김동완, 성매매 합법화 주장 파문 “인정하고 관리해야” [DA:이슈]](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6/02/20/133386867.1.jpg)
![‘85세’ 최불암, 건강 이상설…“몸 안 좋아” (특종세상)[종합]](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6/02/20/133386071.1.jpg)

![채정안, 48세 안 믿겨…하와이 해변 홀린 탄탄 각선미 [DA★]](https://dimg.donga.com/a/140/140/95/1/wps/SPORTS/IMAGE/2026/02/21/133393738.1.jpg)
![송혜교, 파격 숏컷도 청순하게…독보적 미모 [DA★]](https://dimg.donga.com/a/140/140/95/1/wps/SPORTS/IMAGE/2026/02/21/133393690.1.jpg)




![‘쇼트 아쉬움 만회’ 신지아, 안정된 프리 ‘개인 최고점 경신’ [올림픽]](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6/02/20/133385765.1.jpg)












![장예원 주식 대박 터졌다, 수익률 무려 323.53% [DA★]](https://dimg.donga.com/a/110/73/95/1/wps/SPORTS/IMAGE/2023/12/01/122442320.1.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