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 박용택. 스포츠동아DB
결과론이지만 자꾸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 LG는 25일 잠실 삼성전에서 9회말 1사 1·3루의 황금 찬스를 잡았다. 1-2로 뒤지고 있는 가운데 삼성 철벽 마무리 오승환을 무너뜨릴 절호의 찬스였다.
여기서 LG 정주현이 투수 옆으로 흘러가는 힘없는 땅볼을 쳤다. 그런데 코스가 절묘해 오승환의 맨손 캐치를 피해 유격수 앞 내야안타가 됐다. 행운이 따랐지만 문제는 3루주자 박용택(사진)이 홈으로 뛰지 않은 것. 1사 만루가 됐지만 마음을 다잡은 오승환은 최영진∼이대형을 연속 삼진 처리하고 그대로 경기를 끝냈다.
26일 잠실구장에서는 박용택이 안 뛴 것이 옳았는지를 놓고 의견이 갈렸다. LG 사람들은 “오승환이 설마 못 잡을 줄 알았겠느냐”는 말로 박용택이 신중하게 한 것이 적절했다고 두둔했다. 다만 LG 김기태 감독은 물음에 “개인적으로 얘기하자”고 말했다. 아쉬움이 남는다는 우회적 표현이었다.
반면 삼성 류중일 감독은 “안 뛰어줘서 땡큐였다”고 말했다. 이론적으로도 1사 1·3루에선 투수 앞 땅볼이면 더블플레이로 이닝이 종료될 가능성이 있어 3루주자가 일단 홈으로 뛰는 게 정석이라는 뜻이었다. 투수가 홈으로 던지면 최소 2사 1·2루 득점권에서 다시 공격기회가 이어지고, 만약 투수가 2루∼1루로 이어지는 더블플레이를 시도했는데 성공하지 못하면 동점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당사자 박용택의 심정은 어떨까? 박용택은 “안 뛰었다고 잘못했다고 보면 결과론 아니냐?”고 반문했다. 다만 자신도 미련이 못내 남는지 “후속타자를 생각했으면 내가 뛰는 게 맞았을지도 모르겠다. 나이가 드니까 자꾸 소심해진다”며 농담을 섞어 아쉬움을 표시했다.
잠실|김영준 기자 gatzby@donga.com 트위터@matsri21
Copyright © 스포츠동아.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하기


![아이브 장원영, ‘인간 복숭아’ 아닐 리가…러블리+핑크빛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1/06/133105567.1.jpg)





![이특, 새해부터 통 크게 질렀다…1억 포르쉐 플렉스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1/06/133102929.3.jpg)


![랄랄, 핫핑크 수영복 입고 한마디…“삼계탕 아님”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1/07/133106959.3.jpg)


![김빈우, 역대급 비키니 몸매…43세 안 믿겨 ‘부럽다’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1/06/133105504.1.jpg)








![‘40억 건물주’ 이해인 새해에도 파격미 여전 [DA★]](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6/01/06/133102559.1.jpg)

![하하, 母 융드옥정 근황 공개…3대가 함께한 새해 가족사진 [DA★]](https://dimg.donga.com/a/140/140/95/1/wps/SPORTS/IMAGE/2026/01/07/133107466.3.jpg)

![랄랄, 핫핑크 수영복 입고 한마디…“삼계탕 아님” [DA★]](https://dimg.donga.com/a/140/140/95/1/wps/SPORTS/IMAGE/2026/01/07/133106959.3.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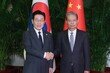












![김남주 초호화 대저택 민낯 “쥐·바퀴벌레와 함께 살아” [종합]](https://dimg.donga.com/a/110/73/95/1/wps/SPORTS/IMAGE/2025/05/27/131690415.1.jpg)
![이정진 “사기 등 10억↑ 날려…건대 근처 전세 살아” (신랑수업)[TV종합]](https://dimg.donga.com/a/110/73/95/1/wps/SPORTS/IMAGE/2025/05/22/131661618.1.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