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과의 플레이오프가 한창이던 어느 날, 한국시리즈(KS) 복귀에 맞춰 몸만들기에 열중하던 SK 김광현은 감독실로 호출됐다.
김성근 감독은 짤막하게 말했다. “KS에서도 안 쓸 테니 그리 알고 있어라.” 플레이오프 기간 줄곧 “KS는 생각하지도 않고 있다”고 누누이 밝혀온 김 감독이지만 김광현에 대해서만큼은 미리 생각을 정리해놓고 있었던 것이다.
예전 김 감독은 “요즘 선수들은 약해빠졌다”라고 못마땅하게 여겼다. “이광길(현 SK 주루코치)은 현역 때 발가락뼈가 부러져도 뛰었다”고도 말했다. 실제 그런 필사의 전력투구 마인드로 2007∼2008년 2년 연속 KS 챔피언을 쟁취했다.
그러나 2009시즌부터 말과 행동이 점진적으로 바뀌고 있다. 특히 16일 KIA와의 KS 1차전을 앞두곤 “우승과 투수 부상 방지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란 뜻밖의(?) 발언을 꺼내기도. 그럴 수 있게 된 근거로 김 감독은 과거 2년의 우승을 들었다.
“베스트 전력이 아닌 멤버로 여기까지 온 것만도 대단하다”고 KS를 앞두고도 가진 자의 여유를 뽐냈다.
광주|김도헌기자 dohoney@donga.com
김성근 감독은 짤막하게 말했다. “KS에서도 안 쓸 테니 그리 알고 있어라.” 플레이오프 기간 줄곧 “KS는 생각하지도 않고 있다”고 누누이 밝혀온 김 감독이지만 김광현에 대해서만큼은 미리 생각을 정리해놓고 있었던 것이다.
예전 김 감독은 “요즘 선수들은 약해빠졌다”라고 못마땅하게 여겼다. “이광길(현 SK 주루코치)은 현역 때 발가락뼈가 부러져도 뛰었다”고도 말했다. 실제 그런 필사의 전력투구 마인드로 2007∼2008년 2년 연속 KS 챔피언을 쟁취했다.
그러나 2009시즌부터 말과 행동이 점진적으로 바뀌고 있다. 특히 16일 KIA와의 KS 1차전을 앞두곤 “우승과 투수 부상 방지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란 뜻밖의(?) 발언을 꺼내기도. 그럴 수 있게 된 근거로 김 감독은 과거 2년의 우승을 들었다.
“베스트 전력이 아닌 멤버로 여기까지 온 것만도 대단하다”고 KS를 앞두고도 가진 자의 여유를 뽐냈다.
광주|김도헌기자 dohoney@donga.com
Copyright © 스포츠동아.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하기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손으로 겨우 가린 파격 노출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1/30/133264572.3.jpg)

![몬스타엑스 체조 찢었다…근본의 셋리로 새 월투 시작 ft.아이엠 삭발 (종합)[DA:리뷰]](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2/01/133275581.1.jpg)
![르세라핌 시그니처…‘양적 팽창→질적 성장’[현장]](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2/01/133272880.1.jpg)


![보아 ‘25년 동행’ SM 떠난 근황…“잘 지내고 있어요”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1/30/133265326.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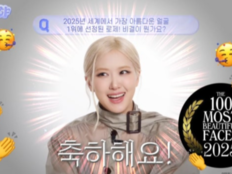

![나나, 창문에 비친 속옷 실루엣…과감한 노출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1/30/133266036.1.jpg)




![김건모, 복귀 앞두고 초췌한 근황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1/30/133266509.3.jpg)

![나나, 창문에 비친 속옷 실루엣…과감한 노출 [DA★]](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6/01/30/133266036.1.jpg)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손으로 겨우 가린 파격 노출 [DA★]](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6/01/30/133264572.3.jpg)




![‘하시4’ 김지민, 김지영 신부 입장에 끝내 오열…“너무 예쁘고 기뻐서” [SD셀픽]](https://dimg.donga.com/a/140/140/95/1/wps/SPORTS/IMAGE/2026/02/01/133276390.1.png)

![김건모, 복귀 앞두고 초췌한 근황 [DA★]](https://dimg.donga.com/a/140/140/95/1/wps/SPORTS/IMAGE/2026/01/30/133266509.3.jpg)
















![장예원 주식 대박 터졌다, 수익률 무려 323.53% [DA★]](https://dimg.donga.com/a/110/73/95/1/wps/SPORTS/IMAGE/2023/12/01/122442320.1.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