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 로맥, 롯데 번즈, 넥센 초이스(왼쪽부터)는 과거 외국인 타자에게 적용됐던 기준과 다른 저비용 고효율을 노린 KBO리그 맞춤전략으로 영입됐다. 스포츠동아DB
KBO리그 외국인타자 영입에는 트렌드가 있다. 냉정히 말하면 모든 것이 완벽하다면 메이저리그에 있을 것이다. ‘결국 어떤 강점을 취할 것인가’가 KBO리그 외국인선수 선택을 가른다.
외국인선수는 투수 2명, 타자 1명을 뽑을 수 있다. 그러나 ‘이 3명이 전력의 50%’라는 것이 정설처럼 통한다. 외국인농사를 망치고, 좋은 성적을 내기란 하늘의 별 따기다.
결국 구단들은 어려운 미션과 마주한다. ‘적정 비용을 들여서 선수의 결함을 감수하고, 최적의 외국인선수를 뽑는 것’이 그것이다. 돈 싸움으로 가면, 메이저리그는 말할 것도 없을뿐더러 일본야구와도 경쟁이 어렵다. 미국 마이너리그에 소속된 선수를 데려올 때에도 이적료가 발생하는데 이것이 갈수록 치솟는다.
결국 구단들은 컨셉을 잡아야 하는데, 이것이 일치될 때, KBO리그의 트렌드가 된다. 언젠가부터 KBO리그는 타고투저 현상이 잠들 줄 모른다. 이런 현실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겠지만 역설적으로 기회가 될 수 있다.
그 대표적 현상이 선구안이 떨어지는 중장거리 타자를 뽑는 경향이다. 과거에는 마이너리그의 볼넷:삼진 비율에 문제가 있으면 기피대상이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오히려 이런 타자가 우대를 받는다. 비교적 합리적 가격에 영입이 가능하고, 타고투저 트렌드에서 소위 ‘터질’ 확률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SK 외국인 스카우트 파트의 최홍성 매니저는 “대표적 사례가 SK의 로맥, 롯데의 번즈, 넥센의 초이스 등이다. 기본적으로 정교한 타자라 할 수 없다. 그러나 걸리면 넘어가는 타자들이다. 처음에는 삼진이 많을 수 있어도 KBO리그에 적응이 되기 시작하면 위협감이 강력해진다.”

삼성 러프-KIA 버나디나(오른쪽). 사진|스포츠동아DB·스포츠코리아
실제 최근 KBO리그에 새로 온 타자 중 시작부터 승승장구한 선수는 거의 없다. 삼성의 러프, KIA의 버나디나, kt의 로하스 등도 적응기를 거친 뒤에야 위력을 발했다. 두산 전 용병타자 에반스도 그랬다. 이런 학습효과 덕분인지 이제 ‘외국인타자는 기다려줘야 한다’는 것이 KBO리그 구단들의 상식이 됐다. 2018시즌을 앞두고 LG 가르시아, 한화 호잉 등이 벌써부터 우려를 낳고 있다. 그럼에도 구단이 장기적 안목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다.
‘실속형’으로 외국인타자를 선택하는 추세도 늘어나고 있다. KIA 버나디나, kt 로하스, 한화의 호잉은 장타자보다는 호타준족형에 가깝다. 두산의 파레디스, 롯데의 번즈는 수비에 방점이 찍힌 선수다. 수비에서 팀의 약점을 보완해주되, 공격력으로 조력하는 팀 플레이어 스타일이다. 비싸다고 잘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운에 의존하는 ‘로또’도 아니다. 외국인선수 영입에는 구단의 철학이 스며들어있다.
김영준 기자 gatzby@donga.com
Copyright © 스포츠동아.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하기

![[단독] 정준호, 드라마 자진 하차…급작스런 선택 충격](https://dimg.donga.com/a/158/89/95/1/wps/SPORTS/IMAGE/2018/03/14/89105103.2.jpg)

![[속보] 한채아♥차세찌, 결국…예상했던 행보](https://dimg.donga.com/a/158/89/95/1/wps/SPORTS/IMAGE/2017/03/02/83133138.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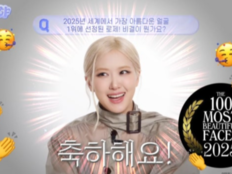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손으로 겨우 가린 파격 노출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1/30/133264572.3.jpg)
![보아 ‘25년 동행’ SM 떠난 근황…“잘 지내고 있어요”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1/30/133265326.1.jpg)
![나나, 창문에 비친 속옷 실루엣…과감한 노출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1/30/133266036.1.jpg)
![김건모, 복귀 앞두고 초췌한 근황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1/30/133266509.3.jpg)

![몬스타엑스 체조 찢었다…근본의 셋리로 새 월투 시작 ft.아이엠 삭발 (종합)[DA:리뷰]](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2/01/133275581.1.jpg)

![나나, 창문에 비친 속옷 실루엣…과감한 노출 [DA★]](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6/01/30/133266036.1.jpg)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손으로 겨우 가린 파격 노출 [DA★]](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6/01/30/133264572.3.jpg)




![‘하시4’ 김지민, 김지영 신부 입장에 끝내 오열…“너무 예쁘고 기뻐서” [SD셀픽]](https://dimg.donga.com/a/140/140/95/1/wps/SPORTS/IMAGE/2026/02/01/133276390.1.png)

![김건모, 복귀 앞두고 초췌한 근황 [DA★]](https://dimg.donga.com/a/140/140/95/1/wps/SPORTS/IMAGE/2026/01/30/133266509.3.jpg)
















![장예원 주식 대박 터졌다, 수익률 무려 323.53% [DA★]](https://dimg.donga.com/a/110/73/95/1/wps/SPORTS/IMAGE/2023/12/01/122442320.1.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