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 김태완. 스포츠동아DB
프로농구 KT 전창진 감독은 “내가 최고가 아니라면 최고를 내편으로 만들라”고 말했습니다. 삼성 김태완은 프로 데뷔 10년 만에 처음 가을야구를 경험합니다. 그것도 곧바로 한국시리즈 1차전 주전 2루수로 나설 것이 유력합니다. 삼성이라는 최강팀으로 옮겨온 덕분입니다. 정규시즌 1위를 확정지었을 때도 모자 한 번 던지고 세리머니를 끝냈습니다. 회식조차 안 하더군요. 속으로 울컥한 마음이 들긴 했는데, 아무도 울지 않으니 눈물을 보일 수 없었습니다.
눈물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부산 영도초등학교에서 야구를 시작한 이후로 기뻐서 운 적은 없는 것 같네요. 경남고 시절 우승 4번, 준우승 2번을 했는데 패하고 나서 운 기억만 남습니다. 한국시리즈를 앞두고 사람들이 하도 “떨리지 않느냐”고 물어와서 “난 고교 다닐 때 결승전만 6번을 치렀다”고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과 한국시리즈는 차원이 다르다”며 웃더군요. 정말로 그런지는 24일 1차전에 들어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중앙대를 거쳐 2004년 LG에 입단했는데 시범경기를 해보니 왜 이리 투수들의 공이 쉽게 느껴지던지…. 개막전부터 주전 3루수가 됐습니다. 하지만 막상 정규시즌에 들어가니 변화구가 달라지더군요. 첫 3경기에서 8타수 무안타에 삼진을 5개나 당하고 2군으로 쫓겨났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해 37타수 3안타로 시즌을 마쳤고, 그 다음해에는 40타수 4안타가 전부였습니다. 너무 창피하고 실망스러워서 경찰청에 일찍 입대한 것도 그 때문입니다.
제대하니 이제 야구를 못 하면 갈 곳이 집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될 듯 될 듯 안 풀리는 것이 야구더군요. 2008시즌 후 LG가 프리에이전트(FA)로 정성훈을 영입한 날, 또 남 몰래 울었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끝났다는, 한없는 절망감이 엄습했습니다. ‘백업이니까 주전보다 잘 해야 기회가 올 수 있다’는 마음으로 스스로를 다잡았지만, 2012년 후반기 50타수에서 3안타밖에 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2012년 12월 삼성-LG의 사상 첫 트레이드가 터졌습니다. ‘LG가 나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구나’라는 아픔이 없었다면 거짓이겠죠. 삼성에선 기껏 잘 해봤자 백업이고, 2군에 안 떨어지면 다행이라는 위기감이 덮쳤습니다. 그런데 후반기 주전 자리가 돌아오고 한국시리즈 선발 출장이라니…. 인생 모르는 것 같네요.
한국시리즈 생각은 딱 하나입니다. ‘수비만 잘 하자.’ 유격수를 맡을 정병곤은 LG에서 같이 넘어온 후배죠. 누가 누구한테 충고할 처지는 아니겠지만 병곤이한테 “우리 둘 사이에 플라이 볼이 뜨면 네가 잡아라”라고 말은 해뒀습니다. 책임회피가 아니라 수비는 병곤이가 더 잘 한다는 자신감을 심어주고 싶어서였습니다. 한국시리즈 우승이 확정되면 삼성 선수들도 울겠죠? 야구인생에서 최초가 될 기쁨의 눈물을 간절히 바랍니다.
김영준 기자 gatzby@donga.com 트위터 @matsri21
Copyright © 스포츠동아.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하기






![‘유튜브 1위’ 미스터비스트도 당황…뉴진스 팬 요청의 끝은 어디 [SD이슈]](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1/07/133106575.1.jpg)


![‘40억 건물주’ 이해인 새해에도 파격미 여전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1/06/133102559.1.jpg)


![이특, 새해부터 통 크게 질렀다…1억 포르쉐 플렉스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1/06/133102929.3.jpg)
![제시, 논란 뒤 근황 포착…새해에도 애플힙 ‘눈길’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1/06/133102502.3.jpg)




![신지, ♥문원과 떠났나…휴양지서 더 어려진 미모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1/06/133101914.3.jpg)




![‘40억 건물주’ 이해인 새해에도 파격미 여전 [DA★]](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6/01/06/133102559.1.jpg)

![아이브 장원영, ‘인간 복숭아’ 아닐 리가…러블리+핑크빛 [DA★]](https://dimg.donga.com/a/140/140/95/1/wps/SPORTS/IMAGE/2026/01/06/133105567.1.jpg)
![김빈우, 역대급 비키니 몸매…43세 안 믿겨 ‘부럽다’ [DA★]](https://dimg.donga.com/a/140/140/95/1/wps/SPORTS/IMAGE/2026/01/06/133105504.1.jpg)
![이특, 새해부터 통 크게 질렀다…1억 포르쉐 플렉스 [DA★]](https://dimg.donga.com/a/140/140/95/1/wps/SPORTS/IMAGE/2026/01/06/133102929.3.jpg)
![신지, ♥문원과 떠났나…휴양지서 더 어려진 미모 [DA★]](https://dimg.donga.com/a/140/140/95/1/wps/SPORTS/IMAGE/2026/01/06/133101914.3.jpg)

![김재환 떠나니 또 경쟁…‘14년차 두산맨’ 김인태는 또 이를 악물었다 “내가 못하면 경쟁도 없다, 두산은 무조건 올라갈 것” [SD 베이스볼 피플]](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6/01/07/133106490.1.jpe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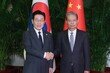













![김남주 초호화 대저택 민낯 “쥐·바퀴벌레와 함께 살아” [종합]](https://dimg.donga.com/a/110/73/95/1/wps/SPORTS/IMAGE/2025/05/27/131690415.1.jpg)
![이정진 “사기 등 10억↑ 날려…건대 근처 전세 살아” (신랑수업)[TV종합]](https://dimg.donga.com/a/110/73/95/1/wps/SPORTS/IMAGE/2025/05/22/131661618.1.jpg)

댓글 0